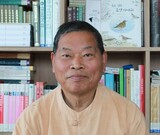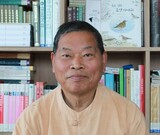윤구병 ㅣ 농부철학자·보리출판사 전 대표이사
1945년 8월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다. 그 직전에 미국 국방성에 근무하던 중령 두 명이 한반도 지도에 38선을 그었다. 본스틸과 러스크였다. 미 대통령 트루먼의 이름으로 38선은 소련 총리 스탈린에게 통보되었고, 스탈린은 이 ‘군사분계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천년이 넘게 한 나라였던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나고, 1948년에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밀어붙인 남쪽만의 단독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녘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곧이어 6·25 전란이 발생하고, 남녘의 ‘국방군’과 북녘의 ‘인민군’은 총부리를 맞댔다. 그 결과로 ‘조선’과 ‘인민’은 남녘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북녘에서 ‘동무’라는 말이 자주 쓰이자 낯선 ‘친구’라는 말이 동무를 대신했던 것도 잊지 말자.) ‘조선’이라는 낱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고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방씨 일가만 드러내놓고 쓸 수 있는 ‘신문 이름’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박정희 일가의 어린이 월간잡지에서만 쓸 수 있는 낱말이 되어버렸다.
‘인민’(people)이라는 낱말은 금기어 가운데 금기어로 바뀌어 심지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조차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번역하는 엉터리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술 더 떠서 ‘인민의 권리’의 줄임말인 ‘인권’조차도 개돼지의 권리가 아니고 사람의 권리라는 억지 해석이 나돌게 되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민’이라는 이름은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 일본에서는 극우단체의 슬로건(국민의힘)이 되었고 이 나라에서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 이름으로 쓰이다가, 드디어 ‘한나라’ ‘새누리’에서 ‘미래통합’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거듭났다.
이에 따라 ‘국민’이라는 말은 한 국가의 인민 전체를 포괄하는 낱말에서 벗어나 수구우파 패거리를 지칭하는 정당 이름으로까지 전락했다. 이러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쫄아들 대로 쫄아든 ‘국민’이라는 말에 제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일찍이 공자는 이름이 발라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뜻에서, 자기가 어느 나라에 크게 쓰이면 이름부터 바로잡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이게 바로 정명(正名)사상이다.) ‘민’은 사람(人)의 집단명칭이다. ‘민중’이라는 말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시민’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자는 이들도 있으나 ‘민중’은 ‘민’이 앞에 있고, ‘중’이 ‘무리’를 뜻하는 말이어서 어색하고, ‘시민’이라는 말은 ‘도시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쓰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나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도 ‘시민’인가?)
그러므로 ‘인민’이라는 말에 덧칠해진 이념의 때를 벗겨내고, 남북 분단이 있기 전에는 아무나 자연스럽게 쓰던 이 말을 하루빨리 되살려 써야 한다. (<독립신문>에서 일반 일간지에 이르기까지 1950년까지는 이 말이 흔히 쓰던 일상 언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힘이 소수 패거리의 이름으로 둔갑한 ‘국민의 힘’을 대신할 때가 되었다.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