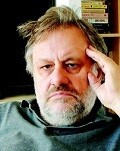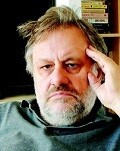[세계의 창] 슬라보이 지제크ㅣ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경희대 ES 교수
백신을 맞든, 백신을 거부하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통제받고 착취되고 있다.
2021년 10월 어느 그리스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에서 시민 10만명과 의사 수백명이 연루된 다음과 같은 코로나 백신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의사들에게 400유로의 뇌물을 주고 백신 대신 물을 주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부패한 동시에 윤리적이기도 한)이 의사들은 돈만 챙기고 이들에게 진짜 백신을 주사했다. 백신을 맞은 이들은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의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심하게 비난하지는 못하겠다. 의사들이 뇌물을 준 이들에게 백신 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때, 그들은 누구도 속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짜 백신을 맞은 이들에게 진짜 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다. 여기서 속은 이들은 속이고자 한 이들뿐이다. 그들은 백신을 접종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지만, 자신이 실제로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챙긴 것은 잘못 아닌가? 의사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뇌물을 준 이들은 아마도 의사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윤리적인 문제는 그보다는 의사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백신을 주사한 일이 옳은 일인가 여부다. 나는 의사들이 한 일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였다고 생각한다. 백신을 거부하고 백신 증명서를 얻고자 속임수를 써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들에 비하면 말이다.
백신 의무 접종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적 행위가 개인의 신체에 폭력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의 신체가 진정으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최근 슬로베니아에서는 한 고령의 노인이 백신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지 못해 매일 여러번의 주입을 통해 삶을 이어가고 있던 터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닐까. 백신을 맞든, 백신을 거부하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통제받고 착취되고 있다.
위 보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통제되고 착취되는 방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 공적 권위를 속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고안해낸 그 속임수마저도 공적 권위가 자기를 재생산하는 사이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도살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양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 우리는 자신을 도살하는 이들에게 뇌물을 주는 존재들이다. 라캉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속지 않는 자가 실은 가장 잘 속는 법이다. 마치 미국 하층 계급이 자유주의 지배계급에게는 속지 않았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말이다.
어떤 이들은 백신에 대한 반대가 반드시 반과학적인 비이성의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백신 반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잃어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만족이 응축된 표현이므로 이들을 단순히 경멸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삶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좌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주장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의 행동들이 ‘잉여 향락’(surplus-enjoyment)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반유대주의도, 백신을 반대하는 음모이론도 모두 고유한 잉여 향락을 생산한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우리는 라캉이 말한 ‘죄의식을 느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정신분석학적 윤리의 정식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쾌락에 죄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한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쾌락에 대해조차도’로 보충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힘을 지닌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권력을 받아들이거나, 권력에 대한 복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는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우리를 속인다. 이데올로기는 공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아닌) 불신을 이용해 이렇게 속삭인다. “권력에 있는 이들을 믿지 말아라. 너는 착취되고 있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 법이 바로 여기 있다.” 때로는 나이브함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데 필요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번역 김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