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 의학과 서사(49)
‘이야기의 탄생’과 서사의학
‘이야기의 탄생’과 서사의학

우리는 왜 그렇게 이야기에 빨려들까? 픽사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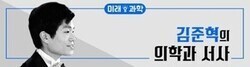
뇌는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까 ‘이야기의 탄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뇌는 눈, 코, 입, 피부 등 감각기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자극(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지한다. 이 상황에서 뇌가 아는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뇌는 나머지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려 한다. 이 상상의 작용은 시각(눈이 높은 해상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중심부터 20~30도 정도까지뿐이라, 뇌는 보지 못한 부분을 상상으로 그려 채운다)부터 다른 모든 감각 작용에 미친다. 그 결과, 뇌는 불완전하게 인식한 세계에 대한 모형을 구축한다. 이 뇌의 작용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스토는 이를 ‘스토리텔러 뇌’의 모형 구축 작용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매력적이라서 끌리는 게 아니라, 뇌는 애초부터 이야기의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뇌는 실제로 경험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자극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공이 들판을 달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뇌에서 다리의 근육과 바람의 촉감, 들판의 향기를 경험할 때와 같은 부위에 불이 켜진다는 말이다. 즉, 이야기는 경험 없이 경험을 겪게 하고, 이를 통해 듣는 사람을 움직여 감동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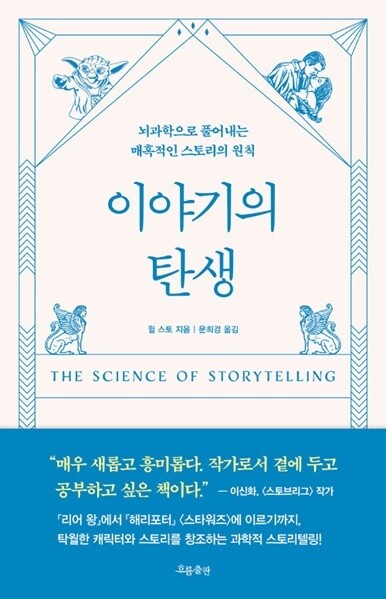
윌 스토가 쓴 ‘이야기의 탄생’ 표지. 출처: 알라딘
현대 의학이 질병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 당연히 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인을 만나서 질병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유로 내가 아프게 되었고(기), 그 증상과 영향은 무엇이며(승),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시행하고(전), 아픔에서 해방된다(결)는 4막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꼭 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고, 특히 결말은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자). 현대 의학에서 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의료인, 특히 의사이다. 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을 듣고 여러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한다. 이것뿐이라면 모두가 행복하리라. 하지만,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자체다. 현대 의학에서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쳐내 핵심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핵심(질병의 원인이라고 가정되는 것)은 현대 의과학이 미리 세워 놓은 흐름에 배치된다. 쉽게 말해, 환자가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면 촉진 등의 검사와 엑스선 영상 촬영을 통해 문제가 되는 장기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치료된다는 이야기의 흐름이 이미 짜여 있고, 새로 오는 환자는 이 틀에 적절히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스토가 말한 ‘스토리텔러 뇌’의 불완전한 세계 모형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세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뇌는 빠르게 빈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나간다. 의사의 경우에, 환자에 대한 불완전한 파악을 채워 나가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의과학 지식이다. 이렇게 의사의 뇌 속에 만들어진 환자는 실제 환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흔히 현대 의학이 ‘차갑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인이 환자를 돕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해 줘도, 환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 ‘조커’(2019)의 한 장면. ‘조커’는 환자 쪽에서 본 질병 이야기의 좋은 예다.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낀다. 제대로 도움을 얻지 못하는 누군가는 자신과 세계의 결함을 가리기 위해 환상을 만든다. 출처: 아이엠디비
서사의학, 이야기 주인공은 의사 아닌 환자 이런 질병 이야기는 이상하지 않은가? 질병을 앓는 것, 즉 질환 경험의 주인공은 애초에 환자다. 환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환자의 경험과 감정, 바램(이것은 의료인의 감정과 바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은 그 이야기에서 적당한 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질병 이야기는 의과학이 기계적으로 짜 놓은 삼인칭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 질환 경험에는 환자의 역사와 사회가, 그가 만난 의료인의 삶과 경험이, 환자와 의료인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역동이, 그 섬세하고 복잡한 무늬가 켜켜이 쌓인다. 이 모두를 무시하고 단순화하는 현대 의학의 ‘스토리텔러 뇌’와 ‘영웅 만들기 뇌’가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서사의학이다. 서사의학은 현대 의학의 단순하고 빠르며 무차별적인, 환자와 의료인의 모든 복잡성을 무시해버리는 이야기를 벗어나기 위해 의료인에게(물론, 환자에게도, 의학과 의료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가르친다. 소설의 깊이와 등장인물의 다양함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의료인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의료의 이야기, 질병 이야기에서 자신과 환자에게 닥친 이 고난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다. 그는 환자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여,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환자가 다시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인과 환자의 결핍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질병을 헤쳐 나가는 이 의료라는 과업이 서로에게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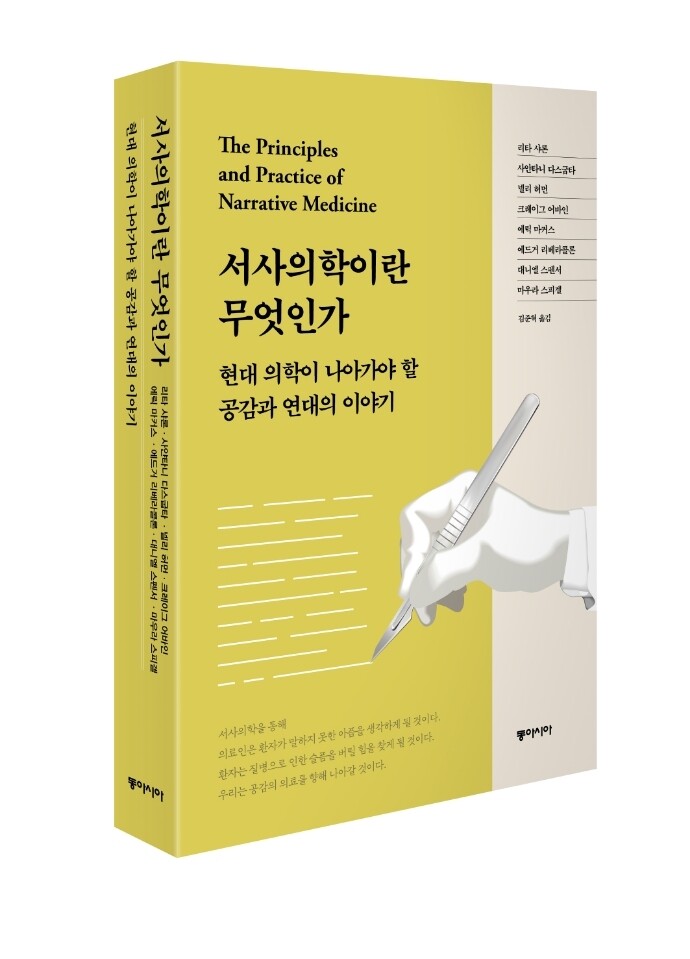
곧 출간될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표지. 동아시아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