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어떻게 보나
이번 스태프(STAP) 세포 논문의 제1저자인 오보카타 하루코는 이화학연구소(리켄)의 젊은 여성 과학자라는 점에서 논문 발표 당일부터 일본 언론의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 세포생물학의 학설을 뒤엎는 연구의 중심에 있던 연구자지만 그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에서 과학자로 비치지 못했다. 그는 연구실 벽 색깔인 핑크빛과 실험복을 대신한 앞치마에 둘러싸여 ‘리케조’(이과여자)라는 희한한 별명까지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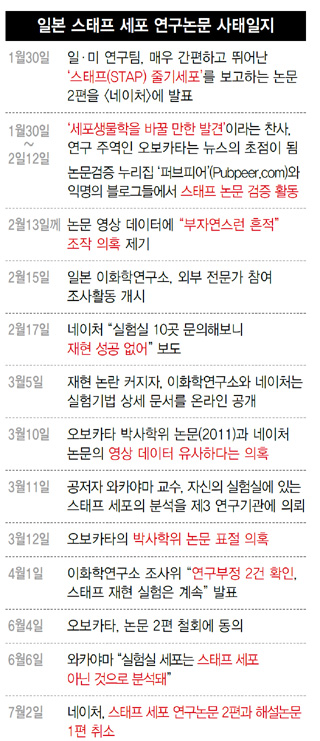 오보카타가 다시 언론 앞에 선 것은 논문 발표 2개월 뒤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논란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리켄의 조사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보카타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스태프 세포는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는데, 달아오른 관심과 맞물려 동정 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는 있습니다”라는 말투는 패러디와 희화화를 거치며, 연구자인 오보카타의 모습은 점점 더 ‘스캔들 여배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재현 실험에 나선 오보카타는 앞으로 과학자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리켄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논문 발표 뒤 드러난 문제점을 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는가?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리켄의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CDB)가 최근 발표한 ‘자기점검 검증 보고서’를 보면, 스태프 세포의 아이디어를 다른 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연구 내용을 내부에서만 공유했던 상황이 연구부정을 사전에 눈치채지 못한 하나의 배경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리켄의 연구부정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위원회는 역분화 줄기세포(iPS 세포) 연구를 능가하는 획기적 성과를 얻으려 한 리켄 센터의 강한 동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꼽으면서 재발방지책으로 시디비 센터 해체를 통한 내부 개혁을 조언했다. 센터 해체는 사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처이지만 이런 개혁 조처만으로 내부 문제를 쉬쉬하는 폐쇄성의 폐해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리켄은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왜 스태프 세포 같은 연구가 논문 발표 전까지 폐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최승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오보카타가 다시 언론 앞에 선 것은 논문 발표 2개월 뒤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논란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리켄의 조사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보카타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스태프 세포는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는데, 달아오른 관심과 맞물려 동정 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는 있습니다”라는 말투는 패러디와 희화화를 거치며, 연구자인 오보카타의 모습은 점점 더 ‘스캔들 여배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재현 실험에 나선 오보카타는 앞으로 과학자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리켄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논문 발표 뒤 드러난 문제점을 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는가?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리켄의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CDB)가 최근 발표한 ‘자기점검 검증 보고서’를 보면, 스태프 세포의 아이디어를 다른 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연구 내용을 내부에서만 공유했던 상황이 연구부정을 사전에 눈치채지 못한 하나의 배경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리켄의 연구부정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위원회는 역분화 줄기세포(iPS 세포) 연구를 능가하는 획기적 성과를 얻으려 한 리켄 센터의 강한 동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꼽으면서 재발방지책으로 시디비 센터 해체를 통한 내부 개혁을 조언했다. 센터 해체는 사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처이지만 이런 개혁 조처만으로 내부 문제를 쉬쉬하는 폐쇄성의 폐해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리켄은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왜 스태프 세포 같은 연구가 논문 발표 전까지 폐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최승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특별연구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