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 의학과 서사(39)
‘불사조, 날아오르다’로 보는 패럴림픽
‘불사조, 날아오르다’로 보는 패럴림픽

다큐멘터리 ‘불사조, 날아오르다’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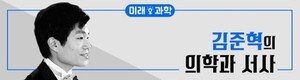
양손·양발 없이 어떻게 펜싱을 할까 다큐멘터리의 원래 제목은 ‘라이징 피닉스’입니다. 이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펜싱 선수인 베베 비오 비어트리스의 별명인데요. 비장애인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펜싱 선수가 되고자 했던 베베는 캠프에 가서 갑자기 심하게 앓고, 수막염(meningitis) 진단을 받습니다. 위독한 상황이 된 베베에게 의료진은 양발을 절단해야 한다고 말하죠. 부모님과 베베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살기 위해 절단을 승낙합니다. 그런데, 발 절단으로 베베는 낫지 않았어요. 결국 양손까지 모두 절단한 다음에야 베베는 살아남습니다. 얼굴에도 큰 흉터가 남았지요. 하지만, 베베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족, 의수를 끼고 걷고, 달리는 베베는 다시 펜싱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베베에게 사람들은 말하죠. 넌 펜싱용 검을 잡을 수 없어. 넌 빠르게 움직일 수 없으니 펜싱을 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베베는 보여줍니다. 자신이 다시 펜싱을 할 수 있음을. 베베는 일반 경기에 다시 참여하길 원하지만, 그가 참가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 펜싱 경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펜싱용 검을 휘두르는 경기가 어떻게 펜싱이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발을 재빨리 놀려 상대방과 간격을 만들고, 재빨리 내찔러 상대방을 가격해야 하는 펜싱이니까요. 하지만, 휠체어 위에 앉은 펜싱 선수는 다리를 고정하고, 강한 허릿심으로 몸을 완전히 뒤로 젖힙니다. 그들의 격렬한 움직임으로 휠체어가 흔들거리고, 선수의 몸은 휠체어를 축으로 360도 회전하지요. 그 모습은 마치, 무용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펜싱 선수 베베의 동작은 아름다운 춤을 보는 것과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고, 몸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새롭게 보여준다.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경기를 보는 것보다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유대인을 구한 구트만, 패럴림픽의 문을 열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기대하는 것이 극적인 승리를 통한 감동이라면, 패럴림픽보다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경기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럴림픽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올림픽 경기의 시초가 되었다는 그리스부터 패럴림픽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Pierre de Frédy, Baron de Coubertin, 1863~1937)은 청년의 신체 발달을 위해 올림픽을 프랑스에서 시작했고 이후 국제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올림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지만, 여성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그것이 시대의 한계라면,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은 애초에 구상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경과 의사 루드비히 구트만 박사(Sir Ludwig Guttman, 1899~1980)는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박해를 받고 일하던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뛰어난 의사라는 이유로 유대인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게 되지요. 그는 1938년 수정의 밤 사건(Kristallnacht) 때 병원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환자로 가장하고, 쫓아온 게슈타포에 거짓 병명을 말해 64명 중 60명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독일에 남아 있을 수 없던 구트만 박사는, 포르투갈을 통치하던 독재자 안토니오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 1889~1970)의 치료를 돕기 위해 나치가 포르투갈에 다녀오도록 명령하자 이 기회를 틈타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영국에 정착한 구트만 박사에게 영국 정부는 버킹엄셔에 있는 스토크맨데빌 병원의 국립 척추 손상 센터를 부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이 병원은, 당시 관리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사지마비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구트만 박사는 이 자리를 맡아 사지마비 환자들의 치료에 힘쓰게 됩니다. 지금은 환자가 한자리에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압력으로 인해 눌리는 부분에 욕창이 생기므로, 주기적으로 환자를 움직여주어야 함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처음 고안하고 적용한 것이 구트만 박사였어요. 구트만 박사는 병원에 남아 환자 한 명 한 명의 몸을 직접 돌려놓곤 했지요. 그런 그의 헌신적인 치료와 지도 아래, 사지마비 전상자들은 살아남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루드비히 구트만 박사가 1968년 텔아비브 하계 패럴림픽에서 호주 양궁 선수 토니 사우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는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패럴림픽과 한국의 남다른 인연 구트만 박사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로 딱 꼽긴 어려울 거예요. 장애인의 필요에 맞도록 생활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그들이 같은 생활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 장애를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이 장애(障碍),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함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겐 장애인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줄 통로가 필요합니다. 구트만 박사는 운동 경기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실한 방법이었음을 직관한 최초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토크맨데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경기 참여를 독려하면서, 구트만 박사는 사지마비 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1948년 7월29일, 런던에서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 있던 날 스토크맨데빌 병원의 환자는 운동 경기를 벌입니다. 이들은 척추 손상으로 휠체어에 탄 상태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4년 뒤 1952년에는 전 세계에서 130명의 장애인 선수가 스토크맨데빌 경기에 참여합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56년 구트만 박사를 치하하며 토머스 펀리 경 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과 함께 최초의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사지마비(paraplegic)와 올림픽(Olympic)이 결합했기에 패럴림픽(Paralympic)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 경기는, 처음 올림픽과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되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최초로 올림픽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대표위원(1991~1994)을 맡기도 했던 황연대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황연대 성취상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패럴림픽 최우수 선수상으로 자리잡았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황연대성취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황연대 당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맨 왼쪽). 장애인진흥연합회 제공
운동의 승패가 아닌 장애 극복 이야기를 본다 저는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 뛰어난 기량을 펼쳐 세상을 놀라게 한 선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메달을 따서 국격을 드높인 영웅들. 하지만, 그 안에 패럴림픽 선수들을 넣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을 연호하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마음 졸이며 보았던 기억은 나지만, 패럴림픽에서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은 찾아보기 전엔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경기가 열렸는지, 어떤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무관심의 소치이겠지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랐던 제 무식함의 발로겠지요. 저는 운동선수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으나,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의 몸짓에 경탄합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모든 운동선수에게 같은 목표일 텐데, 비장애인 선수의 움직임에는 감탄하고 장애인 선수의 움직임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을 덮었던 올가미는 바로 그것, 어떤 신체가 다른 신체에 비해 열등하며, 어떤 몸의 기능은 다른 몸의 기능에 비해 모자란다는 무의식적 잣대였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비장애인의 신체가 장애인의 신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데, 모두의 신체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스스로 그러한(自然)—것이며 각자에겐 각자가 넘어설 산이 있을 뿐인데 왜 하나의 자로 모든 것을 재려 했던 걸까요? 오히려, 장애인 선수는 패럴림픽 경기에 서기까지 더 많은 벽을,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7개의 메달을 안은 러시아 태생 미국 운동선수 타티아나 맥페이든(Tatyana McFadden, 1989~)은 척추갈림증(spina bifida)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무시하던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될 때까지 고아원을 기어 다녀야 했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에서 운동에 함께하고자 했으나 장애인은 낄 수 없다는 이야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2013년 승소하여 이후 타티아나법(Tatyana’s Law)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애인의 운동 참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 단거리, 장거리, 마라톤에서 신기록을 내온 맥페이든의 경기를 볼 때, 그가 넘어야 했던 문화와 제도의 벽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컨대 우사인 볼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 69로 세계 기록을 경신한 다음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 섰을 때 우리가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전의 자신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관한 거대한 승리의 서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를 바라본 것이지, 단지 시간을 1초 줄일지 여부를 따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에서 주목하는 것 또한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취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모두 해당한다면, 더 많은 벽을 넘어야 하는 장애인의 경기가, 패럴림픽이 더 많은 감동과 경이를 안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큐멘터리 ‘불사조, 날아오르다’는 장애인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감동과 경이를 직접 경험하게 해 줍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눈물과 환성의 드라마는 감염병으로 우리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함께 넘어서기 위한 작은 불씨가 될 겁니다.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junhewk.kim@gmail.com">junhewk.kim@gmail.com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