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 의학과 서사(48)
철학자와 의료인류학자, 함께 유방암을 마주하다
철학자와 의료인류학자, 함께 유방암을 마주하다

프란츠 폰 슈투크. ‘시시포스’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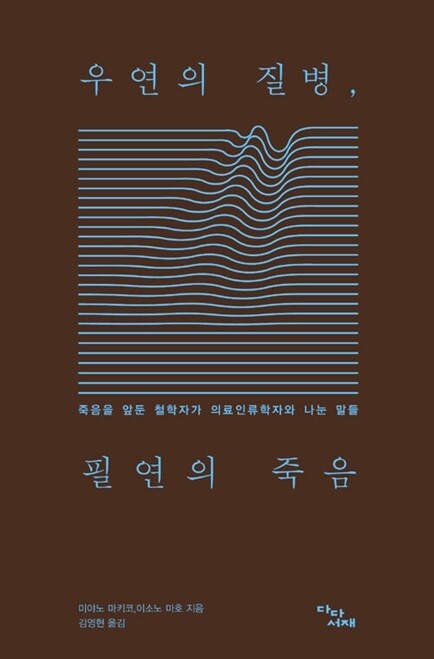
미야노 마키코와 이소노 마호의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출처: 알라딘
질환이라는 가능성의 공포 앞에 서다 두 사람의 서신 왕래는 철학자가 의사에게 들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말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말을 듣고 의료인류학자는 생각한다. 아니, 그 말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그저 둘러서 말한 것뿐 아닌가? “어느 역학자가 만든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일어날지도 모를’ 확률은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서 미래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립니다.”(21쪽) 의료인류학자의 해석을 들은 철학자는 대답한다. “환자는 ‘이 앞에 기다리는 미래가 이러하니, 이 길로 나아가겠다’ 하며 운명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43쪽)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병원에서 확률을 듣지만, 그에 따라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확률을 내놓고, 인간은 삶을 결정한다. 두 사람이 살핀 것처럼, 질환은 가능성이다. 교통사고로 다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질환은 확률로 존재한다. 아니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도 다칠 확률도 100%가 아니다. 어떻게 다칠지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확률, 즉 여러 번 해봤더니 그동안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하는 자료 정리(와 여기에 엄밀성을 부여하는 수학적 계산)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도, 이를 피하고자 맞는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걸렸을 때 상태가 위중해질 가능성이 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19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이거다, 라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_______
불확실성에서 운명의 세계로 그 안에서 인간은 분투하며, 어떻게든 더 나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 고심한다. 그렇게 내린 선택이 쌓여 인생이, 역사가 된다. 한편, 우리는 그런 불확정적인 확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적인 힘에 이름을 붙여 그 무시무시함을 감추고자 한다. 의료인류학자가 다섯번째 편지에서 설명하는 ‘요술’이 좋은 예다. 아프리카의 아잔데 족은 불운을 요술 탓으로 돌린다. “나무 그루터기에 발이 걸려 다쳐도, 항아리가 깨져도, 농사가 흉작이어도, 아이가 열이 올라도 전부 요술 때문입니다.”(114쪽) 하지만, 모든 나쁜 일을 요술이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노력 바깥에서 벌어지는 불운에만 요술이 적용된다. “게으름, 부주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인한 불운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불운은 요술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115쪽) 즉, 불운이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나쁜 일이다. 여기에 철학자는 대답한다. “불운이라는 부조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인생을 고정한 순간 불행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129쪽) 그는 자신이 암에 걸린 불운(아잔데 족은 요술이라고 말하리라)에 분노하여 어떻게든 인생을 되찾으려 애쓰다가 그저 환자로서 죽어가게 되는 길을 택하는 대신, 그 환자라는 이름표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불운 앞에서 절망하고 순응하는 대신, 그에 화내고 질문할 수 있는 삶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그런 불운에, 요술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스 홀바인. ‘대사들’ (1533). 예술 작품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해골은 감상자에게 삶의 무상함과 죽음의 확실성을 깨닫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홀바인은 그림 아래에 해골을 그리되, 그것을 왜곡된 형태로 그려 극단적으로 그림 앞에 섰을 때만 보이도록 해 놓았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홀바인이 죽음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에 저항하기 위해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죽음을 찌그러뜨리다니!
불확실성 앞에서 서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죽음을, 질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책을 덮은 의료윤리학자는 생각한다. 두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불확실성을 운명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의 일이다. 우리는 질환의 무시무시함을, 죽음의 불안을 우리 것으로 껴안아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같은 자리로 돌을 굴려 올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 일은 절대 헛되지 않다. 적어도 누군가가 그 삶을 보았고, 보며,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환과 죽음 앞에서 함께 살아간다. 질환의 불확실성 앞, 서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김준혁/연세대 교수·의료윤리학자 junhewk.kim@gmail.com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