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식공룡이 호숫가를 걸어간 흔적이 오롯이 남은 전남 여수시 화정면의 낭도 해안 모습.
초식공룡 한 무리가 얕은 호숫가를 두 발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메마른 황무지에 점점이 흩어진 호수와 골짜기를 따라 몇 달째 이동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다. 이곳엔 골짜기 강들이 간간이 범람하여 마르지 않는 물과 먹이 식물도 많았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자 공룡 무리는 고개를 들어 신경을 곤두세웠다. 거대한 목 긴 공룡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졌지만 육식공룡은 아직도 끈질기게 이들을 노린다. 안도하는 순간 하늘을 찢는 굉음이 땅을 울렸다. 화산재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발자국 화석에 풍부하게 담긴 살아있는 공룡 정보
마지막 공룡은 아마도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 안식처를 한반도 남쪽에서 구했을 것이다. 지난 28일 공룡이 멸종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에서 최후의 흔적을 남긴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의 사도·추도·낭도를 찾았다. 이들 섬에는 중생대 백악기의 마지막 시기에 쌓인 퇴적층이 해안에 드러나 있다.
파도에 깎인 낭도의 남쪽 해안 절벽은 희거나 녹색인 사암과 어두운 회색 이암이 교대로 시루떡처럼 층을 이루고 있었다.
 “여길 보십시오.” 썰물로 드러난 바닥 암반에서 파래를 걷어내면서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가 하트 모양으로 움푹움푹 패인 곳을 가리켰다. 초식공룡 한 마리가 두 발로 걸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니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곳곳에 있었다. 초식공룡의 발자국은 발가락이 두툼하고 양쪽 가장자리가 넓다면 육식공룡의 것은 새 발자국 모양이고 끝에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다. 절벽엔 퇴적물이 눌린 발자국 단면도 보인다.
이웃 섬인 추도에는 6마리의 조각류 초식공룡이 나란히 걸어간 84m 길이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이다. 얕은 호숫가 바닥이 물결 모양을 이룬 연흔 위에 찍힌 발자국도 보인다.
“여길 보십시오.” 썰물로 드러난 바닥 암반에서 파래를 걷어내면서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가 하트 모양으로 움푹움푹 패인 곳을 가리켰다. 초식공룡 한 마리가 두 발로 걸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니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곳곳에 있었다. 초식공룡의 발자국은 발가락이 두툼하고 양쪽 가장자리가 넓다면 육식공룡의 것은 새 발자국 모양이고 끝에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다. 절벽엔 퇴적물이 눌린 발자국 단면도 보인다.
이웃 섬인 추도에는 6마리의 조각류 초식공룡이 나란히 걸어간 84m 길이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이다. 얕은 호숫가 바닥이 물결 모양을 이룬 연흔 위에 찍힌 발자국도 보인다.
 “발자국이 뼈 화석 못지않은 정보를 준다”고 허 교수가 설명했다. 골격화석과 달리 발자국 화석만으론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 가려낼 수 없다. 그러나 뼈 화석이 죽은 공룡의 모습을 간직한다면, 발자국 화석은 살아있던 공룡의 자취를 전달한다.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이동습성은 무언지, 집단생활을 했는지, 기후가 어땠는지 등 생태정보가 담겨있다.
사도에서 발견될 가능성 있는 소행성 충돌 흔적
“발자국이 뼈 화석 못지않은 정보를 준다”고 허 교수가 설명했다. 골격화석과 달리 발자국 화석만으론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 가려낼 수 없다. 그러나 뼈 화석이 죽은 공룡의 모습을 간직한다면, 발자국 화석은 살아있던 공룡의 자취를 전달한다.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이동습성은 무언지, 집단생활을 했는지, 기후가 어땠는지 등 생태정보가 담겨있다.
사도에서 발견될 가능성 있는 소행성 충돌 흔적
 허 교수는 지금까지 추도 1759점, 낭도 962점, 사도 755점 등 모두 3500여 점의 발자국 화석을 여수 섬지역에서 발견했다. 82개 보행렬이 있는데, 이 가운데 65개가 두 발 초식공룡인 조각류의 것이고, 16개가 육식공룡인 수각류, 네 발 초식공룡인 용각류의 것은 1개에 그쳤다.
흥미롭게도 이곳 공룡발자국은 2개의 큰 방향성을 보였는데, 하나는 호숫가를 따라 걸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직각 방향인 호수 중심을 향한 것이다. 호숫가의 방향은 물결무늬 화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허 교수는 “발자국의 방향에서 일부 공룡이 호숫가를 이동 경로로 이용했으며 또 일부는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러 호수에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발자국의 길이와 폭, 깊이, 보폭 등에서 공룡의 크기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허 교수는 사도의 초식공룡이 엉덩이까지의 높이가 약 2m, 전체 길이 약 7m로 시속 2.8㎞의 속도로 천천히 걸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공룡은 중생대가 끝난 약 6500만년 전 멸종했다. 여수 낭도리의 섬들에는 약 7000만년 전 퇴적층에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다. 아시아 공룡화석 산지 가운데 최후기에 속한다.
사도 남쪽 해안에 가면 중생대 퇴적암 위에 화산재가 쌓인 위로 용암이 굳은 20여m 높이의 화산암 절벽이 펼쳐져 있다. 응회암 가운데는 불에 타 숯이 된 중생대 나무의 화석이 들어있다. 이곳이 중생대의 최후가 기록된 곳일까.
허 교수는 지금까지 추도 1759점, 낭도 962점, 사도 755점 등 모두 3500여 점의 발자국 화석을 여수 섬지역에서 발견했다. 82개 보행렬이 있는데, 이 가운데 65개가 두 발 초식공룡인 조각류의 것이고, 16개가 육식공룡인 수각류, 네 발 초식공룡인 용각류의 것은 1개에 그쳤다.
흥미롭게도 이곳 공룡발자국은 2개의 큰 방향성을 보였는데, 하나는 호숫가를 따라 걸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직각 방향인 호수 중심을 향한 것이다. 호숫가의 방향은 물결무늬 화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허 교수는 “발자국의 방향에서 일부 공룡이 호숫가를 이동 경로로 이용했으며 또 일부는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러 호수에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발자국의 길이와 폭, 깊이, 보폭 등에서 공룡의 크기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허 교수는 사도의 초식공룡이 엉덩이까지의 높이가 약 2m, 전체 길이 약 7m로 시속 2.8㎞의 속도로 천천히 걸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공룡은 중생대가 끝난 약 6500만년 전 멸종했다. 여수 낭도리의 섬들에는 약 7000만년 전 퇴적층에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다. 아시아 공룡화석 산지 가운데 최후기에 속한다.
사도 남쪽 해안에 가면 중생대 퇴적암 위에 화산재가 쌓인 위로 용암이 굳은 20여m 높이의 화산암 절벽이 펼쳐져 있다. 응회암 가운데는 불에 타 숯이 된 중생대 나무의 화석이 들어있다. 이곳이 중생대의 최후가 기록된 곳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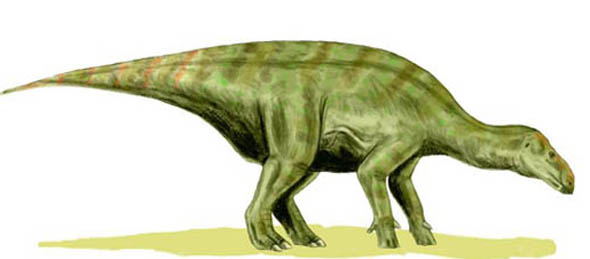
 백인성 부경대 환경지질학과 교수팀이 화산암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사도 암석의 형성연대는 6820만~6550만년 전으로 나왔다.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층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이리듐이 많은 퇴적층의 띠로 확인된다. 백 교수는 “사도에서 그런 경계층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미 침식돼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기-건기가 되풀이된 반건조지대…간헐적인 화산활동 영향
여수의 섬들은 당시 쇠퇴하던 공룡의 마지막 피난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생대 중기인 쥐라기를 풍미하던 거대한 몸집의 용각류는 중생대 말인 백악기에 들어서면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에서만 살아남고, 백악기 후기엔 거의 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기가 오랜 마산 호계리와 창녕 등지에선 용각류가 적지 않게 확인되지만 백악기 말 극히 일부가 여수에서 발견될 뿐이다.
여수의 퇴적층은 이곳이 우기와 건기가 되풀이된 반건조지대였으며 간헐적인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백인성 교수는 “지금의 캘리포니아주 내륙처럼 땅속에 소금기가 많은 건조지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호수는 불어나고 줄어들었지만 물이 마르지는 않았고, 세쿼이어 같은 식물들이 무성했다. 마지막 공룡은 이곳에서 중생대를 끝낸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 여파와 그 재앙을 뚫고 살아남은 ‘나는 공룡’인 새들의 비상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백인성 부경대 환경지질학과 교수팀이 화산암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사도 암석의 형성연대는 6820만~6550만년 전으로 나왔다.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층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이리듐이 많은 퇴적층의 띠로 확인된다. 백 교수는 “사도에서 그런 경계층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미 침식돼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기-건기가 되풀이된 반건조지대…간헐적인 화산활동 영향
여수의 섬들은 당시 쇠퇴하던 공룡의 마지막 피난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생대 중기인 쥐라기를 풍미하던 거대한 몸집의 용각류는 중생대 말인 백악기에 들어서면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에서만 살아남고, 백악기 후기엔 거의 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기가 오랜 마산 호계리와 창녕 등지에선 용각류가 적지 않게 확인되지만 백악기 말 극히 일부가 여수에서 발견될 뿐이다.
여수의 퇴적층은 이곳이 우기와 건기가 되풀이된 반건조지대였으며 간헐적인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백인성 교수는 “지금의 캘리포니아주 내륙처럼 땅속에 소금기가 많은 건조지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호수는 불어나고 줄어들었지만 물이 마르지는 않았고, 세쿼이어 같은 식물들이 무성했다. 마지막 공룡은 이곳에서 중생대를 끝낸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 여파와 그 재앙을 뚫고 살아남은 ‘나는 공룡’인 새들의 비상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여수/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여수/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조홍섭 기자의 <물바람숲> 바로가기 
추도에 있는 공룡 보행렬 화석지(원 안). 이런 발자국 화석이 84m 길이에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이다. 6마리의 조각류 초식공룡이 나란히 걸어간 모습이다.
중생대 말 퇴적암 위에 화산재가 쌓인 위로 응회암과 용암이 굳은 화산암이 높게 쌓여 있다. 사도는 공룡화석과 나로기지의 우주선 발사를 동시에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화산암 밑에 있는 퇴적암은 백악기 말 호숫가였던 여수의 섬들에 모래나 펄이 쌓여 형성됐다. 공룡들이 이곳에 남긴 흔적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아직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남해안은 호수가 많은 내륙지역이었다.
여수 해안에 주로 서식했던 초식공룡으로 추정되는 이구아노돈의 상상도. 아더 위슬리 제공
낭도에 있는 두발 초식공룡 발자국 화석(왼쪽)과 사도 해안 퇴적층에 찍혀 있는 육식공룡의 발자국 화석.
얕은 호숫가에 물결자국이 고스란히 화석으로 남아있는 추도 해안의 모습.
낭도 전경.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