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반지엠오 전북도민행동’ 한승우 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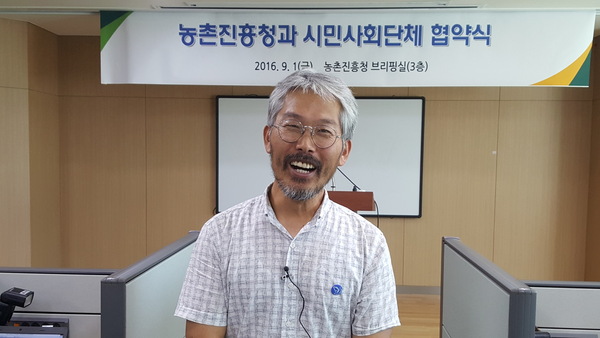 지난 1일 지엠오(GMO·유전자변형작물)와 관련해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인’ 민·관 협약을 맺었다. 양쪽은 “지엠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지엠작물 상용화 추진 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농진청 지엠작물개발사업단’을 올해 안에 해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지엠오 운동단체들의 중요한 과제가 지엠오 완전표시제, 지엠오 없는 학교급식, 지엠오 상용화 추진 중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농토에서 지엠오의 생산 추진을 중단시켰다는 데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큽니다.”
이 협약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시민단체 연대기구 ‘반지엠오 전북도민행동’의 한승우(50) 정책국장이 꼽힌다. 그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지엠오 관련 반대투쟁에서 이번 협약이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이례적’ 협약
지난 1일 지엠오(GMO·유전자변형작물)와 관련해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인’ 민·관 협약을 맺었다. 양쪽은 “지엠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지엠작물 상용화 추진 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농진청 지엠작물개발사업단’을 올해 안에 해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지엠오 운동단체들의 중요한 과제가 지엠오 완전표시제, 지엠오 없는 학교급식, 지엠오 상용화 추진 중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농토에서 지엠오의 생산 추진을 중단시켰다는 데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큽니다.”
이 협약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시민단체 연대기구 ‘반지엠오 전북도민행동’의 한승우(50) 정책국장이 꼽힌다. 그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지엠오 관련 반대투쟁에서 이번 협약이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이례적’ 협약
‘지엠작물개발사업단’ 해체 합의
“20여년 지엠오 반대운동 큰성과” 인천녹색연합 활동…10년전 귀향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 주역
“유전자변형작물 싸움 이제 시작” 그는 협약식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지엠오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보수정권의 대표적 농정적폐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한 국장은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애초 환경운동에 나섰다. 신격호 전 총괄회장 소유의 터에 지으려던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10일 동안 계양산 소나무 위에서 벌였던 시위가 그의 ‘대표 작품’이다. 그는 인천지역 51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 ‘나무 위 오두막 시위’를 통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시킴으로써 골프장 건설을 저지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롯데건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양산 골프장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으나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고 있다. 한 국장은 2007년 계양산 투쟁을 마친 뒤 전북 전주로 돌아왔다. “인간적·생태적으로 살고 싶은데다, 지역에서 환경지킴이 구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2009년 2월에는 전북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지금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농진청의 지엠오 시험재배 반대에 나선 것은 2015년 말부터다. “그해 11월 농진청 인근에 사는 주민이 우연히 ‘지엠오 사과 시험재배지’ 표지판을 발견해 시민단체에 알렸어요.” 2014년 8월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있는 전주 완산구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이듬해 시험재배장에서 지엠오를 본격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장은 “아직 세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엠오 안전성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할 국가기관이 안전성을 맹신하고, 개발에만 더 적극적이어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개 단체로 대응하기가 역부족일 것 같아서 시민단체 차원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전북도민행동이 발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엠오 연구개발과 생산이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우리 종자를 오염시키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확신했다. 지난 4월22일부터는 농진청 지엠오 시험재배장 주변에서 8월31일까지 130여일 동안 천막농성도 벌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을 예견한 그는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을 앞두고 이슈화를 위해 미리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털어놓았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의 농정도 종전의 기업농·자본 중심에서 소규모 농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농진청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견해차로 관계가 불편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농진청 지엠오 연구로부터 지역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농업용 지엠오 생산금지 법제화, 지엠오 연구·생산 제한구역 및 제한거리 규정 법제화, 지엠오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법제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엠오반대 전국행동’과 연대를 통해 지엠오 완전표시제 시행, 지엠오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전주/글·사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반지엠오 전북도민행동’의 한승우 정책국장.
‘지엠작물개발사업단’ 해체 합의
“20여년 지엠오 반대운동 큰성과” 인천녹색연합 활동…10년전 귀향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 주역
“유전자변형작물 싸움 이제 시작” 그는 협약식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지엠오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보수정권의 대표적 농정적폐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한 국장은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애초 환경운동에 나섰다. 신격호 전 총괄회장 소유의 터에 지으려던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10일 동안 계양산 소나무 위에서 벌였던 시위가 그의 ‘대표 작품’이다. 그는 인천지역 51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 ‘나무 위 오두막 시위’를 통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시킴으로써 골프장 건설을 저지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롯데건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양산 골프장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으나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고 있다. 한 국장은 2007년 계양산 투쟁을 마친 뒤 전북 전주로 돌아왔다. “인간적·생태적으로 살고 싶은데다, 지역에서 환경지킴이 구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2009년 2월에는 전북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지금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농진청의 지엠오 시험재배 반대에 나선 것은 2015년 말부터다. “그해 11월 농진청 인근에 사는 주민이 우연히 ‘지엠오 사과 시험재배지’ 표지판을 발견해 시민단체에 알렸어요.” 2014년 8월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있는 전주 완산구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이듬해 시험재배장에서 지엠오를 본격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장은 “아직 세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엠오 안전성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할 국가기관이 안전성을 맹신하고, 개발에만 더 적극적이어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개 단체로 대응하기가 역부족일 것 같아서 시민단체 차원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전북도민행동이 발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엠오 연구개발과 생산이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우리 종자를 오염시키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확신했다. 지난 4월22일부터는 농진청 지엠오 시험재배장 주변에서 8월31일까지 130여일 동안 천막농성도 벌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을 예견한 그는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을 앞두고 이슈화를 위해 미리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털어놓았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의 농정도 종전의 기업농·자본 중심에서 소규모 농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농진청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견해차로 관계가 불편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농진청 지엠오 연구로부터 지역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농업용 지엠오 생산금지 법제화, 지엠오 연구·생산 제한구역 및 제한거리 규정 법제화, 지엠오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법제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엠오반대 전국행동’과 연대를 통해 지엠오 완전표시제 시행, 지엠오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전주/글·사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연재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