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우동선·박성진 외 6명 지음, 효형출판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27.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 덕수궁, 우리 역사의 슬픈 아이콘
27.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 덕수궁, 우리 역사의 슬픈 아이콘
덕수궁의 팔자는 처음부터 사나웠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서울의 모든 대궐이 불타버렸다. 갈 곳이 없던 선조는 월산대군의 집에 짐을 풀었다. 그러곤 조금씩 주변 민가로 궁의 울타리를 넓혀갔다. 왕이 사는 곳은 궁(宮)이라 불린다. 그럼에도 월산대군 저택에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붙지 않았다. 그냥 ‘행궁’(行宮)이라 했을 뿐이다. 왕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궁전이라는 뜻이다. 덕수궁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라 형편이 피어나자 임금은 덕수궁을 서둘러 떠났다. 1611년, 광해군은 새롭게 지은 창덕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야 덕수궁에는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뒤를 이은 인조는 덕수궁의 모든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덕수궁을 짓느라 자기 땅에서 내몰린 이들에게 집터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석어당과 즉조당만은 남겨 두었다. 난리를 겪을 때 임금이 머물던 곳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그 후 덕수궁은 조선 왕조 내내 잊혀진 궁궐이었다.
1897년, 덕수궁은 또 한번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우리 역사에서 단 한번 있었던 ‘황제국가’ 대한제국의 정궁(正宮)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한 해 전, 고종 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다. 일본인들이 왕이 머무는 경복궁에 버젓이 들어와서 왕비를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이었다. 나라 군대가 왕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 당시 조선의 처지는 임진왜란 때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래도 임금이 남의 나라 대사관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일이다. 1년 만에 고종은 도피 생활을 끝냈다. 하지만 왕은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던 덕수궁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새롭게 열었다.
대한제국은 덕수궁만큼이나 불안한 운명이었다. 대한제국은 조선과는 다른 처지에 있었다. 조선에는 중국과 일본 외에는 딱히 ‘외교’를 할 만한 이웃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글로벌’해진 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처지였다. 일본,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 일본 등 힘센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대한제국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덕수궁은 이런 현실에 딱 어울리는 궁궐이었다. 주변에는 여러 나라 대사관이 즐비했다. 누구라도 함부로 대궐을 넘봤다간 다른 나라의 눈치가 보일 테다. 덕수궁은 외교의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드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이번에도 왕이 머물 만한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궁궐 근처는 온통 대사관과 외국 직원들 숙소로 가득했다. 그러니 궁궐 건물을 새로 지을 터를 얻기가 더욱 어려웠다. 대한제국은 조금씩 주변 땅을 사들여 궁궐을 넓혀갔다. ‘제국’의 처지는 이처럼 궁상맞았다.
그럼에도 고종 황제는 의욕적으로 새 나라를 열어갔다. 한양은 황제가 다스리는 ‘국제도시’로 거듭났다. 중국 사신을 맞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덕수궁 맞은편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도 세웠다. 황제가 제단에서 올리는 의식은 명(明)나라와 똑같았다. 대한제국이 진(秦), 한(漢), 당(唐), 송(宋), 명(明)으로 이어지는 황제의 나라 중국과 격이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탑골공원과 광화문 거리에 기념비전도 세웠다. 이 모든 건물 중심에는 덕수궁이 있었다. 덕수궁 안에도 중명전과 석조전 등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다. 국제화된 새 나라의 면모는 궁궐 건물들에서도 물씬 풍겼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로 정했다. ‘빛나는 무력’이라는 뜻이다. 덕수궁 정문인 대안문(지금의 대한문) 옆에는 군사 건물인 ‘원수부’(元帥部)를 지었다. 대한제국에서 황제는 군대의 대원수, 황태자는 원수로 육군과 해군을 다스렸다. 이처럼 대한제국은 힘에서도 이웃나라에 밀리지 않는 당당한 국가를 꿈꾸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무릎 꿇린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을 삼켜버렸다. 1907년 고종은 일본에 떠밀려서 황제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때부터 덕수궁은 더 이상 ‘황궁’(皇宮)이 아니었다. 물러난 황제가 머무는 궁궐일 뿐이었다. 경운궁이던 궁궐 이름도 늙은 고종을 나타내는 ‘덕수궁’(德壽宮)으로 바뀌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죽자 덕수궁은 또다시 해체의 과정을 밟았다. 이왕직(李王職)은 망한 조선왕실을 관리하던 관청이었다. 이곳의 관리들이 덕수궁을 ‘중앙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많은 건물이 헐렸고 황제가 머물던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궁궐터도 도로 확장, 학교 신축 등을 이유로 계속 잘려나갔다. 지금 남아 있는 덕수궁의 터는 원래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은 덕수궁 복원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옛 경기여고 터에 고종이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했던 ‘루트’인 돌담길이 원래 모습대로 지어지나 보다. 왕들의 초상을 모셨던 선원전 등 주요 건물들도 본래 모습을 찾을 듯싶다.
 경복궁을 다시 지은 대원군에게는 조선 개국(開國) 때처럼 왕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다. 덕수궁을 복원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포부가 있을까? 덕수궁에는 우리 역사의 신산스러웠던 순간이 오롯이 담겨 있다. 아직도 덕수궁은 ‘경운궁’이라는 황궁의 이름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러난 왕의 거처 이름이던 ‘덕수궁’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복원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 당당한 독립국가를 꿈꾸었던 대한제국의 꿈과 한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슬픈 기억이다. 역사의 망각은 나라의 몰락을 가져온다. 덕수궁이 우리를 와신상담(臥薪嘗膽)하게 하는 역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경복궁을 다시 지은 대원군에게는 조선 개국(開國) 때처럼 왕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다. 덕수궁을 복원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포부가 있을까? 덕수궁에는 우리 역사의 신산스러웠던 순간이 오롯이 담겨 있다. 아직도 덕수궁은 ‘경운궁’이라는 황궁의 이름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러난 왕의 거처 이름이던 ‘덕수궁’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복원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 당당한 독립국가를 꿈꾸었던 대한제국의 꿈과 한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슬픈 기억이다. 역사의 망각은 나라의 몰락을 가져온다. 덕수궁이 우리를 와신상담(臥薪嘗膽)하게 하는 역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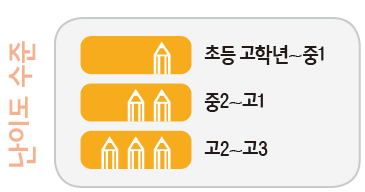
하지만 대한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무릎 꿇린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을 삼켜버렸다. 1907년 고종은 일본에 떠밀려서 황제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때부터 덕수궁은 더 이상 ‘황궁’(皇宮)이 아니었다. 물러난 황제가 머무는 궁궐일 뿐이었다. 경운궁이던 궁궐 이름도 늙은 고종을 나타내는 ‘덕수궁’(德壽宮)으로 바뀌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죽자 덕수궁은 또다시 해체의 과정을 밟았다. 이왕직(李王職)은 망한 조선왕실을 관리하던 관청이었다. 이곳의 관리들이 덕수궁을 ‘중앙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많은 건물이 헐렸고 황제가 머물던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궁궐터도 도로 확장, 학교 신축 등을 이유로 계속 잘려나갔다. 지금 남아 있는 덕수궁의 터는 원래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은 덕수궁 복원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옛 경기여고 터에 고종이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했던 ‘루트’인 돌담길이 원래 모습대로 지어지나 보다. 왕들의 초상을 모셨던 선원전 등 주요 건물들도 본래 모습을 찾을 듯싶다.
한겨레교육
한겨레교육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