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즘>
[난이도 수준: 고2~고3]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
31. 아나키즘 - 아나키즘은 테러리즘일까, 우리 사회의 대안(代案)일까?
<아나키즘>
하승우 지음 책세상 도시가 많아지고 공장이 늘면 수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 ‘발전’했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농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 살가웠던 마을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일손이 부족하고 살기 힘드니, 남은 사람들도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겠다. ‘발전’은 도시도 힘들게 한다. 살길을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자리가 주어질 리 없다. 그들 대부분은 날품을 파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처지다. 도시에서의 삶은 시골에서보다 나을 게 없다. 게다가 도시는 자급자족(自給自足)하지 못한다. 식량 문제부터 도시 안에서 해결 못한다. 상품을 만들어 팔고, 번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구해 와야 한다. 홀로 서지 못하는 처지가 마음 편할 리 없다. 그래서 도시는 늘 ‘성장’에 목을 매기 마련이다.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많은 인구는 극빈층으로 떨어져 버릴 테다. 자연환경 또한 부실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도시 스스로 먹거리를 생산하지 못하니, 필요한 식량을 농촌에서 ‘대량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너른 벌판에 하나의 작물만 크는 경우가 없다. 좁은 공간에 닭과 돼지가 우글거리며 사는 일도 없다. 도시를 먹여 살릴 커다란 농장이 늘어갈수록, 농촌에도, 자연환경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발전’이라 할 수 있을까? 아나키스트(anarchist)들은 이 물음에 강하게 고개를 흔든다.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옮겨지곤 한다. 그들은 정부 없이도 사회는 잘 돌아간다고 큰소리친다.
시골 마을을 예로 들어보자. 경찰이 눈초리를 빛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간다. 서로에 대한 정겨움과 배려가 살아있는 덕분이다. 사람들 사이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로 사람들을 옭매고는,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외쳐 댄다. 그러나 국가는 교육 같은 나의 소소한 고민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기에는 너무 크다. 반면, 환경이나 무역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작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다. 국가는 시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전쟁을 일으켜 나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경제를 키운답시고 나의 몫을 내놓으라고 재촉한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를 없애자고 힘주어 외친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는 마음이 있다. 경찰 한 명 없는 시골 마을이 평화로운 이유다. 크로폿킨은 국가 대신 ‘자치’(自治)를 앞세운다. 러시아에는 오브시치나(obshchina)라는 농촌 공동체가 널리 퍼져 있었다. 국가가 없어도, 농민들은 힘을 합쳐 잘 살아갈 테다. 이렇듯, 아나키스트들은 강제가 사라진 소규모 농촌 공동체를 꿈꿨다. 국가는 사람들 마음에 헛된 바람을 불어넣는다. 경제가 커지고 산업이 자라나면 더 행복해진다며 사람들을 닦달한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역사의 발전’을 믿지 않는다. 피터 모린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가난해지고자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잡도리할 조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사람들 위에 서야 한다. 다른 이들은 노예처럼 그 사람의 말에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 자유를 빼앗긴데다가, 목표를 이루어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몫이 돌아가지 않는 탓이다.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국가가 있는 한, 시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 아나키스트 바쿠닌의 말이다. 아나키스트는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 조직에 손사래 친다.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은 ‘직접 행동’(direct action)을 내세운다. 생활 속에서 직접 국가에 맞서라는 뜻이다. 전쟁에 반대하는가? 그러면 피켓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설 일이다. 국가가 싸우라고 명령할 때 도망쳐라. 세금도 내지 말고 버텨라. 국가에 맞서는 시민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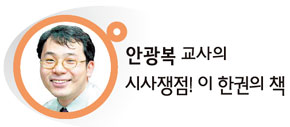 아나키스트들은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대표를 세워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제도다. 그러나 대표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줄까? 아나키스트들은 정치를 믿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사람들을 부추긴다. 심지어 그들은 테러와 폭동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한다. 조선의 아나키스트 신채호는 “양병(良兵: 잘 훈련된 병사) 10만이 폭탄 한번 던진 것만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아나키즘에 기겁하는 이유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 등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난리를 겪는 요즘이다. 중앙에 몰려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물음이 있다. 과연 지방 곳곳으로 인구를 흩어놓으면 온 나라가 살기 좋아질까?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과 같이 만들려는 노력 아닐까?
얼굴을 맞대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소규모 자치 공동체는 왜 ‘대안’이 될 수 없을까? ‘서울 같은 지방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들의 네트워크로 엮인 살가운 지역 사회’를 꿈꿀 수는 없을까? 오랫동안 아나키즘은 황당한 꿈처럼 여겨졌다. 그럼에도 왜 아나키즘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안광복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시사브리핑: LH공사 지방 이전 논란지난 25일, 김완주 전북지사와 전북도의원 등 1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집회를 열고 “LH공사 경남 일괄 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은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에 불과한 만큼, 정부 기관과 공기업 이전 등 지역 경제를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나키스트들은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대표를 세워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제도다. 그러나 대표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줄까? 아나키스트들은 정치를 믿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사람들을 부추긴다. 심지어 그들은 테러와 폭동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한다. 조선의 아나키스트 신채호는 “양병(良兵: 잘 훈련된 병사) 10만이 폭탄 한번 던진 것만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아나키즘에 기겁하는 이유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 등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난리를 겪는 요즘이다. 중앙에 몰려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물음이 있다. 과연 지방 곳곳으로 인구를 흩어놓으면 온 나라가 살기 좋아질까?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과 같이 만들려는 노력 아닐까?
얼굴을 맞대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소규모 자치 공동체는 왜 ‘대안’이 될 수 없을까? ‘서울 같은 지방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들의 네트워크로 엮인 살가운 지역 사회’를 꿈꿀 수는 없을까? 오랫동안 아나키즘은 황당한 꿈처럼 여겨졌다. 그럼에도 왜 아나키즘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안광복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시사브리핑: LH공사 지방 이전 논란지난 25일, 김완주 전북지사와 전북도의원 등 1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집회를 열고 “LH공사 경남 일괄 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은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에 불과한 만큼, 정부 기관과 공기업 이전 등 지역 경제를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승우 지음 책세상 도시가 많아지고 공장이 늘면 수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 ‘발전’했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농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 살가웠던 마을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일손이 부족하고 살기 힘드니, 남은 사람들도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겠다. ‘발전’은 도시도 힘들게 한다. 살길을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자리가 주어질 리 없다. 그들 대부분은 날품을 파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처지다. 도시에서의 삶은 시골에서보다 나을 게 없다. 게다가 도시는 자급자족(自給自足)하지 못한다. 식량 문제부터 도시 안에서 해결 못한다. 상품을 만들어 팔고, 번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구해 와야 한다. 홀로 서지 못하는 처지가 마음 편할 리 없다. 그래서 도시는 늘 ‘성장’에 목을 매기 마련이다.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많은 인구는 극빈층으로 떨어져 버릴 테다. 자연환경 또한 부실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도시 스스로 먹거리를 생산하지 못하니, 필요한 식량을 농촌에서 ‘대량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너른 벌판에 하나의 작물만 크는 경우가 없다. 좁은 공간에 닭과 돼지가 우글거리며 사는 일도 없다. 도시를 먹여 살릴 커다란 농장이 늘어갈수록, 농촌에도, 자연환경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발전’이라 할 수 있을까? 아나키스트(anarchist)들은 이 물음에 강하게 고개를 흔든다.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옮겨지곤 한다. 그들은 정부 없이도 사회는 잘 돌아간다고 큰소리친다.
시골 마을을 예로 들어보자. 경찰이 눈초리를 빛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간다. 서로에 대한 정겨움과 배려가 살아있는 덕분이다. 사람들 사이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로 사람들을 옭매고는,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외쳐 댄다. 그러나 국가는 교육 같은 나의 소소한 고민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기에는 너무 크다. 반면, 환경이나 무역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작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다. 국가는 시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전쟁을 일으켜 나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경제를 키운답시고 나의 몫을 내놓으라고 재촉한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를 없애자고 힘주어 외친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는 마음이 있다. 경찰 한 명 없는 시골 마을이 평화로운 이유다. 크로폿킨은 국가 대신 ‘자치’(自治)를 앞세운다. 러시아에는 오브시치나(obshchina)라는 농촌 공동체가 널리 퍼져 있었다. 국가가 없어도, 농민들은 힘을 합쳐 잘 살아갈 테다. 이렇듯, 아나키스트들은 강제가 사라진 소규모 농촌 공동체를 꿈꿨다. 국가는 사람들 마음에 헛된 바람을 불어넣는다. 경제가 커지고 산업이 자라나면 더 행복해진다며 사람들을 닦달한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역사의 발전’을 믿지 않는다. 피터 모린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가난해지고자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잡도리할 조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사람들 위에 서야 한다. 다른 이들은 노예처럼 그 사람의 말에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 자유를 빼앗긴데다가, 목표를 이루어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몫이 돌아가지 않는 탓이다.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국가가 있는 한, 시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 아나키스트 바쿠닌의 말이다. 아나키스트는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 조직에 손사래 친다.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은 ‘직접 행동’(direct action)을 내세운다. 생활 속에서 직접 국가에 맞서라는 뜻이다. 전쟁에 반대하는가? 그러면 피켓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설 일이다. 국가가 싸우라고 명령할 때 도망쳐라. 세금도 내지 말고 버텨라. 국가에 맞서는 시민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