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대화>
[난이도 수준: 고2~고3]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
42. 비폭력 대화 - 일본의 ‘욕구’부터 분명히 하라!
<비폭력 대화>
마셜 B. 로젠버그 지음캐서린 한 옮김/한국NVC센터 불행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면 된다.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추어 보자. 그리고 완벽한 몸매의 모델과 견주어보라. 입 꼬리가 이내 축 처질 테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해 보자. 모차르트는 열두 살 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다. 작곡도 꽤 많이 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는가? ‘꼬리표 붙이기’도 가슴을 무너지게 한다. “너는 정말 멍청해”, “너는 게을러 빠졌어” 등, ‘평가’를 들을 때 기분은 어떤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내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운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비교나 꼬리표 붙이기를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이러기란 쉽지 않다. 일상의 말에는 비교와 평가가 숱하게 묻어 있는 탓이다. 임상심리학자 마셜 B. 로젠버그가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내세우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비폭력 대화란 상처 없이 상대를 보듬고 진심을 전하는 언어습관이다. 우리는 평가와 사실을 잘 가름하지 않고 말한다. 예컨대 “너는 시간개념이 없어”는 사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은 ‘평가’다. “너는 3번 약속에서 모두 30분을 늦었어”가 ‘사실’이다. ‘시간개념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황스럽다. 그러나 ‘3번 약속에서 30분을 늦었다’는 지적은 어떨까? 평가에는 발끈하지만, ‘사실’에 대한 지적에는 고개가 숙여진다. 상대는 나를 ‘시간개념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다. ‘3번이나 약속에 늦었음’을 일깨워줄 뿐이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비폭력 대화의 첫걸음은 사실과 평가를 나누는 데 있다.
둘째는 평가와 느낌을 분리하는 단계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저는 벽 보고 선 느낌이에요.” 이 말은 상대를 탓하는 표현으로 들린다. ‘당신은 벽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묻어 있는 탓이다. 듣는 입장에서는 변명하고픈 마음이 들겠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좀더 친해지고 싶어요. 외롭거든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가? “저는 무시당하는 듯해서 괴로워요”라는 하소연도 마찬가지다. 이는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며 탓하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잘 안돼서 속상해요”라는 말은 속내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평가는 변명을 부를 뿐이다. 공감과 배려는 평가 없이 내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때 찾아든다. 다음은 나의 바람을 분명하게 하는 단계다. “넌 나를 실망시켰어. 어제 저녁에 넌 오지 않았잖아.” 이 말은 비난에 무게중심이 있다. “난 어제 실망했어. 어제 너하고 의논하고 싶었거든.” 이 말에는 ‘네 탓’이 없다. 어그러진 나의 바람이 드러날 뿐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부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무척 화가 납니다.” 이 말을 비폭력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번 주말에 동생을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무척 화가 나요.” 이처럼 내가 바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나를 사로잡는 감정에서 풀려날 방법도 뚜렷해진다. 마지막은 상대에게 부탁하는 단계다. 요구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상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알도록 말이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자 남자는 주말 골프 클럽에 등록했단다. 부인이 바랐던 바는 이것이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가족들과 집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 오해는 사라진다. “머리를 자르지 그러니?”라는 권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비난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나의 소망을 분명히 할 때,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진다. “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앞이 안 보일까 봐 걱정돼. 특히 자전거 탈 때 위험하잖아. 그래서 머리를 좀 자르면 어떻겠니?” 비폭력 대화는 말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듣기’에서도 비폭력 대화 기술은 무척 중요하다. 상대의 하소연에 이렇게 대꾸했다 해보자. “지금 뭘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느껴?”, “내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뜸 짜증이 밀려들지도 모르겠다. 따지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지난주에 내가 집에 없었던 일을 말하는 거니?”, “네 노력을 좀더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니?”, “내가 말한 이유를 좀더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니?” 이처럼 무엇보다 상대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다음, 상대편의 느낌과 바람을 분명하게 짚어내도록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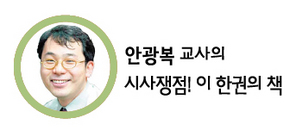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입국거부로 수시간 만에 되돌아갔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유는 ‘비폭력 대화’로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나라 안이 불만으로 가득할 때, 권력자들은 영토 갈등을 터뜨리곤 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다. 울릉도로 가려 했던 그들의 소망도 별다를 것 같지 않다. 일본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나라다. 사람들은 늙어가고 기술력도 날로 떨어진다. 지진에 방사능 재앙까지 겹친 상황, 표를 가진 이들의 관심을 무엇으로 사로잡겠는가?
독도 문제를 풀려면 독도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 울릉도에 가려 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어떻게 해야 일본의 미래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못 찾는 한 일본은 다시 침략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현실과 느낌, 욕구와 요청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입국거부로 수시간 만에 되돌아갔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유는 ‘비폭력 대화’로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나라 안이 불만으로 가득할 때, 권력자들은 영토 갈등을 터뜨리곤 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다. 울릉도로 가려 했던 그들의 소망도 별다를 것 같지 않다. 일본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나라다. 사람들은 늙어가고 기술력도 날로 떨어진다. 지진에 방사능 재앙까지 겹친 상황, 표를 가진 이들의 관심을 무엇으로 사로잡겠는가?
독도 문제를 풀려면 독도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 울릉도에 가려 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어떻게 해야 일본의 미래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못 찾는 한 일본은 다시 침략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현실과 느낌, 욕구와 요청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마셜 B. 로젠버그 지음캐서린 한 옮김/한국NVC센터 불행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면 된다.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추어 보자. 그리고 완벽한 몸매의 모델과 견주어보라. 입 꼬리가 이내 축 처질 테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해 보자. 모차르트는 열두 살 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다. 작곡도 꽤 많이 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는가? ‘꼬리표 붙이기’도 가슴을 무너지게 한다. “너는 정말 멍청해”, “너는 게을러 빠졌어” 등, ‘평가’를 들을 때 기분은 어떤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내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운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비교나 꼬리표 붙이기를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이러기란 쉽지 않다. 일상의 말에는 비교와 평가가 숱하게 묻어 있는 탓이다. 임상심리학자 마셜 B. 로젠버그가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내세우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비폭력 대화란 상처 없이 상대를 보듬고 진심을 전하는 언어습관이다. 우리는 평가와 사실을 잘 가름하지 않고 말한다. 예컨대 “너는 시간개념이 없어”는 사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은 ‘평가’다. “너는 3번 약속에서 모두 30분을 늦었어”가 ‘사실’이다. ‘시간개념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황스럽다. 그러나 ‘3번 약속에서 30분을 늦었다’는 지적은 어떨까? 평가에는 발끈하지만, ‘사실’에 대한 지적에는 고개가 숙여진다. 상대는 나를 ‘시간개념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다. ‘3번이나 약속에 늦었음’을 일깨워줄 뿐이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비폭력 대화의 첫걸음은 사실과 평가를 나누는 데 있다.
둘째는 평가와 느낌을 분리하는 단계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저는 벽 보고 선 느낌이에요.” 이 말은 상대를 탓하는 표현으로 들린다. ‘당신은 벽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묻어 있는 탓이다. 듣는 입장에서는 변명하고픈 마음이 들겠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좀더 친해지고 싶어요. 외롭거든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가? “저는 무시당하는 듯해서 괴로워요”라는 하소연도 마찬가지다. 이는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며 탓하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잘 안돼서 속상해요”라는 말은 속내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평가는 변명을 부를 뿐이다. 공감과 배려는 평가 없이 내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때 찾아든다. 다음은 나의 바람을 분명하게 하는 단계다. “넌 나를 실망시켰어. 어제 저녁에 넌 오지 않았잖아.” 이 말은 비난에 무게중심이 있다. “난 어제 실망했어. 어제 너하고 의논하고 싶었거든.” 이 말에는 ‘네 탓’이 없다. 어그러진 나의 바람이 드러날 뿐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부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무척 화가 납니다.” 이 말을 비폭력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번 주말에 동생을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무척 화가 나요.” 이처럼 내가 바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나를 사로잡는 감정에서 풀려날 방법도 뚜렷해진다. 마지막은 상대에게 부탁하는 단계다. 요구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상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알도록 말이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자 남자는 주말 골프 클럽에 등록했단다. 부인이 바랐던 바는 이것이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가족들과 집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 오해는 사라진다. “머리를 자르지 그러니?”라는 권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비난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나의 소망을 분명히 할 때,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진다. “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앞이 안 보일까 봐 걱정돼. 특히 자전거 탈 때 위험하잖아. 그래서 머리를 좀 자르면 어떻겠니?” 비폭력 대화는 말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듣기’에서도 비폭력 대화 기술은 무척 중요하다. 상대의 하소연에 이렇게 대꾸했다 해보자. “지금 뭘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느껴?”, “내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뜸 짜증이 밀려들지도 모르겠다. 따지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지난주에 내가 집에 없었던 일을 말하는 거니?”, “네 노력을 좀더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니?”, “내가 말한 이유를 좀더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니?” 이처럼 무엇보다 상대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다음, 상대편의 느낌과 바람을 분명하게 짚어내도록 힘써야 한다.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