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vs 6시간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이 한권의 책] 난이도 수준 고2~고3
56. 8시간 vs 6시간 - 근로시간 단축 실패한 이유
56. 8시간 vs 6시간 - 근로시간 단축 실패한 이유
<8시간 vs 6시간>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 지음김승진 옮김, 이후 “20세기 말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이다. 80여년 전 학자들은 대부분 하루 2~3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세상이 오리라 믿었다. 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했다. 물자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오히려 남아도는 생산물을 어디다 팔까 하는 고민만 늘어났다. 쓰고 남을 만큼 상품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세기 초의 해결법은 간단했다. 덜 일하면 된다!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 공장은 멈춰 설 테다. 그러면 일자리도 같이 사라진다. 실업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남은 일거리를 나누면 된다. 일자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이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여가도 늘어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미국 후버 대통령이 폈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운동의 기본 논리다. 이때 켈로그 회사는 눈길을 끌었다. 1930년 켈로그는 앞장서서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이전까지는 하루 8시간씩 3개 조(組)가 번갈아 공장을 돌렸다. 그러다가 하루 6시간씩 4번 교대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교대 조가 하나 더 늘어나자, 직원 수도 많아졌다. 그만큼 봉급은 줄어들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큰 불만이 없었나 보다. ‘추가된 2시간의 여가’는 삶의 질을 한껏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할 때,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쉰다.’ 반면, 6시간을 노동할 때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일터에서보다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삶의 중심도 더 이상 직장이 아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쏟는 여유시간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올 테다. 6시간 근무제가 자리를 잡자, 켈로그 안에는 스포츠와 학습 동아리가 크게 살아났다. 도서관과 텃밭도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사이도 훨씬 살가워졌다. 공장 쪽 입장은 어땠을까? 일을 적게 시키면서 직원은 늘렸으니, 손해가 컸을 듯싶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보다. 생산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율이 크게 떨어졌단다. 덜 피곤하니 그만큼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었던 덕분이겠다. 1930년대 6시간 근무제는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는 듯싶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까닭을 역사학자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찾는다. 루스벨트는 후버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다. ‘일자리 나누기’를 펼쳤던 후버와 달리, 루스벨트는 ‘일자리 창출’을 앞세웠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면 된다. 먼저, 국가가 돈을 풀어 사업을 벌인다. 공장이 돌아가도록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머니도 덩달아 두둑해진다. 물론, 이렇게 번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광고 시장을 틔워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부풀리라는 뜻이다. ‘소비’야말로 경제를 살릴 ‘복음’(福音)이다! 대세(大勢)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6시간 근무를 마뜩잖아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8시간 일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왜 손을 놓고 쉬어야 한단 말인가? 늘어난 여가가 막막하기만 한 이들도 불평을 터뜨렸다. 공장 밖에서는 할 일도 없다. 텔레비전이나 보며 빈둥거릴 뿐이다. 차라리 일을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앞 다퉈서 ‘일자리 창출’을 외쳐댄다. 더 많은 여가, 나눔과 상생을 이루겠다는 약속보다, 취업과 수입을 내세우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더 솔깃해한다. 과연 이런 분위기는 바람직할까?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경제가 끝없이 자라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경제의 ‘정상(頂上) 상태’(stationary state)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다. 정상 상태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진 모습을 뜻한다. 생필품이 넘쳐나는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상 상태라 보아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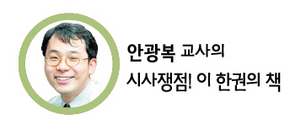 이 정도를 넘어서까지 경제를 돌리려 하면 자연만 망가뜨릴 뿐이다. 별 필요 없는 상품을 만드느라 자원을 낭비하는 탓이다. 시장은 ‘과시 목적밖에 없는 상품’들로 채워진다. 이를 팔기 위해 광고도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국가도 덩달아 돈줄을 푼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말이다. 일자리와 수입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경제를 굴리는 모양새다. 갖고 싶은 물건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밀의 주장이 옳음을 깨닫게 될 테다.
1984년 2월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는 막을 내렸다. 회사는 더 많이 일하라며 노동자들을 부추겼다. 노동자들도 여가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했다. 우리의 현실도 별다르지 않을 듯싶다. 드라마나 광고에서는 숨 가쁘게 일하는 직장인을 멋있게 그린다. 여유와 시간이 넘쳐나는 이들은 한심한 무능력자처럼 비치곤 한다. 그래서 너도나도 일에 매달린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일에 매달릴수록 행복해질까?
“(일하지 않는) 자유시간이 오긴 온다. 이것이 실업이 될지, 여가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1930년대 미국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그린의 말이다. 켈로그의 6시간 근무제는 실패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일자리 창출’에 밀려 사라졌다. 이는 여가와 돈의 겨루기에서 돈이 이겼음을 뜻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간 2교대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새벽 근무를 없애고 2개 조가 하루 8시간씩, 16시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게 된단다. 줄어들 생산량은 설비를 늘려서 메운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기계에게 더 일을 시키는 모양새다. ‘주간 2교대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이 정도를 넘어서까지 경제를 돌리려 하면 자연만 망가뜨릴 뿐이다. 별 필요 없는 상품을 만드느라 자원을 낭비하는 탓이다. 시장은 ‘과시 목적밖에 없는 상품’들로 채워진다. 이를 팔기 위해 광고도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국가도 덩달아 돈줄을 푼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말이다. 일자리와 수입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경제를 굴리는 모양새다. 갖고 싶은 물건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밀의 주장이 옳음을 깨닫게 될 테다.
1984년 2월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는 막을 내렸다. 회사는 더 많이 일하라며 노동자들을 부추겼다. 노동자들도 여가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했다. 우리의 현실도 별다르지 않을 듯싶다. 드라마나 광고에서는 숨 가쁘게 일하는 직장인을 멋있게 그린다. 여유와 시간이 넘쳐나는 이들은 한심한 무능력자처럼 비치곤 한다. 그래서 너도나도 일에 매달린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일에 매달릴수록 행복해질까?
“(일하지 않는) 자유시간이 오긴 온다. 이것이 실업이 될지, 여가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1930년대 미국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그린의 말이다. 켈로그의 6시간 근무제는 실패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일자리 창출’에 밀려 사라졌다. 이는 여가와 돈의 겨루기에서 돈이 이겼음을 뜻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간 2교대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새벽 근무를 없애고 2개 조가 하루 8시간씩, 16시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게 된단다. 줄어들 생산량은 설비를 늘려서 메운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기계에게 더 일을 시키는 모양새다. ‘주간 2교대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안광복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 지음김승진 옮김, 이후 “20세기 말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이다. 80여년 전 학자들은 대부분 하루 2~3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세상이 오리라 믿었다. 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했다. 물자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오히려 남아도는 생산물을 어디다 팔까 하는 고민만 늘어났다. 쓰고 남을 만큼 상품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세기 초의 해결법은 간단했다. 덜 일하면 된다!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 공장은 멈춰 설 테다. 그러면 일자리도 같이 사라진다. 실업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남은 일거리를 나누면 된다. 일자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이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여가도 늘어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미국 후버 대통령이 폈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운동의 기본 논리다. 이때 켈로그 회사는 눈길을 끌었다. 1930년 켈로그는 앞장서서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이전까지는 하루 8시간씩 3개 조(組)가 번갈아 공장을 돌렸다. 그러다가 하루 6시간씩 4번 교대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교대 조가 하나 더 늘어나자, 직원 수도 많아졌다. 그만큼 봉급은 줄어들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큰 불만이 없었나 보다. ‘추가된 2시간의 여가’는 삶의 질을 한껏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할 때,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쉰다.’ 반면, 6시간을 노동할 때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일터에서보다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삶의 중심도 더 이상 직장이 아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쏟는 여유시간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올 테다. 6시간 근무제가 자리를 잡자, 켈로그 안에는 스포츠와 학습 동아리가 크게 살아났다. 도서관과 텃밭도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사이도 훨씬 살가워졌다. 공장 쪽 입장은 어땠을까? 일을 적게 시키면서 직원은 늘렸으니, 손해가 컸을 듯싶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보다. 생산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율이 크게 떨어졌단다. 덜 피곤하니 그만큼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었던 덕분이겠다. 1930년대 6시간 근무제는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는 듯싶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까닭을 역사학자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찾는다. 루스벨트는 후버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다. ‘일자리 나누기’를 펼쳤던 후버와 달리, 루스벨트는 ‘일자리 창출’을 앞세웠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면 된다. 먼저, 국가가 돈을 풀어 사업을 벌인다. 공장이 돌아가도록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머니도 덩달아 두둑해진다. 물론, 이렇게 번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광고 시장을 틔워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부풀리라는 뜻이다. ‘소비’야말로 경제를 살릴 ‘복음’(福音)이다! 대세(大勢)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6시간 근무를 마뜩잖아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8시간 일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왜 손을 놓고 쉬어야 한단 말인가? 늘어난 여가가 막막하기만 한 이들도 불평을 터뜨렸다. 공장 밖에서는 할 일도 없다. 텔레비전이나 보며 빈둥거릴 뿐이다. 차라리 일을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앞 다퉈서 ‘일자리 창출’을 외쳐댄다. 더 많은 여가, 나눔과 상생을 이루겠다는 약속보다, 취업과 수입을 내세우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더 솔깃해한다. 과연 이런 분위기는 바람직할까?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경제가 끝없이 자라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경제의 ‘정상(頂上) 상태’(stationary state)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다. 정상 상태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진 모습을 뜻한다. 생필품이 넘쳐나는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상 상태라 보아도 좋겠다.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이 한권의 책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