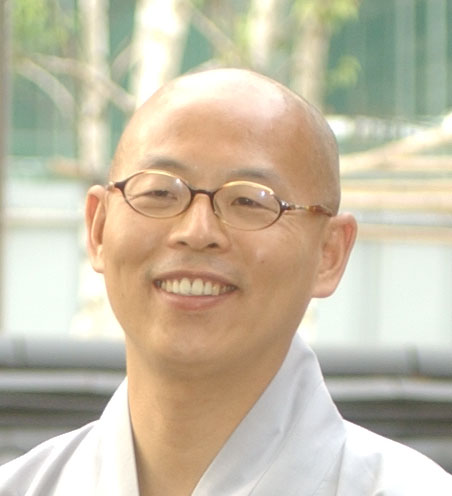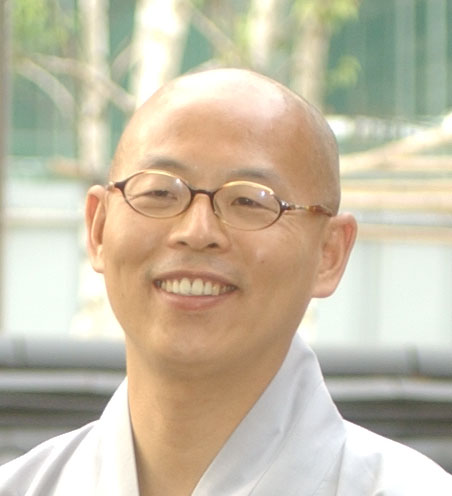주름진 어머니의 손. 사진 <한겨레> 자료
합장하는 노보살. 사진 <한겨레> 자료
터미널에서 만난 그 어머니
1978년 새벽녘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이었던가. 손이 시려울 정도로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역사 안에서, 18살 사미승은 출가 이후 큰 도시로 떠나는 첫 나들이가 두렵고 낮설기만 했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 애잔한 눈길로 사미승을 보는 것이었고, 그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사미승은 단아하고 의연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이 세상 우리 모두의 어머니 얼굴을 가진 한 여인이 내게로 왔다. 그 여인은 시골마을 장독 위에 한 사발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리하며 공들이는 그런 합장을 하며 내게 말을 건넸다. “스님, 어디에 계시는 스님이신가요.” “네, 향림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님의 심부름으로 부산을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사미승은 시린 손을 모아 무심하게 응답했다. “스님, 여기 떠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간이 매점에 들른 그 여인은 내게 무엇인가를 쥐여 주었다. “스님, 가실 때 차 안에서 드세요.” 아! ‘손에서 손으로’ 내게 온 것은 귤 세개, 카스텔라 빵 한개, 박카스 한병, 그리고 꼬깃꼬깃한 백원짜리 지폐 두장. 나는 순간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고, 비로소 마음을 열어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설움에 진 눈동자, 애잔한 여승의 염불 곡조 같은 음색으로 고랑진 얼굴, 가뭄에 갈라진 금 간 논배미와 같은 손등이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님, 제 아들도 스님입니다.” 나는 그만 눈앞이 아득하고 먹먹해졌다. “부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죄 많은 중생을 건져주세요. 도 많이 닦아 큰스님 되셔요.” 나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속울음을 삼켰다.
그 뒤로 나는 그때의 그 어머니를 세상 속에서 매일 만났으며, 내 마음이 헛것에 사로잡히거나 자칫 산중귀족이 되려 할 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며 내 심장에 죽비를 친다.
법인 스님(일지암 암주)
필자 법인 스님
출가승의 첫단계인 사미계를 받는 모습. 사진 조계종 제공.
합장한 손. 사진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