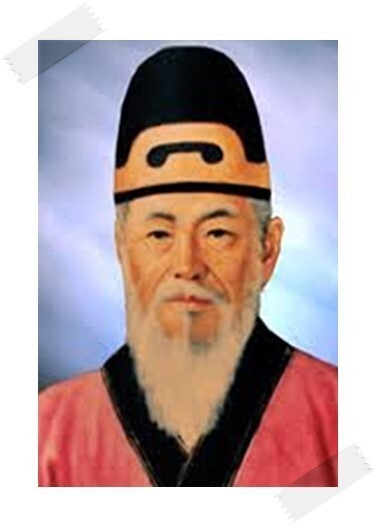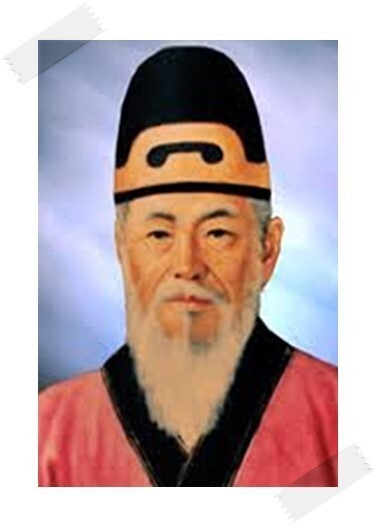코로나19는 한가위 풍속도까지 바꾸었다. 민족대이동이라고 불리는 혈연 지연의 견고한 문화마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천년 동안 추석이라는 이름아래 미풍양속으로 당연히 감수했던 명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경험한 까닭이다. 신라 때 경주 낭산(狼山)에서 활동했던 가난한 음악가 백결(百結 한 벌 옷을 백번 기워 입었다는 뜻)선생도 명절이 엄청 괴로웠을 것이다. 끼니를 해결할 쌀 조차도 제대로 없는 살림살이인데 명절이라고 따로 떡을 만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가장으로써 상심한 부인을 위해 거문고(琴)로 방아 찧는 소리를 연주하며 정성껏 위로 했다. 별다른 경제적 출혈없이 생색을 낼 수 있었다. 부인이 그 소리만으로 만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아타령’이라는 명곡은 영원히 남게 되었다. 명절가난이라는 위기가 또다른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고향친구들과 모여 왁자지끌하게 회포도 풀 수 없는 역병이 창궐하는 추석에는 혼자 방에서 갖가지 음원을 통해 거문고 연주소리를 들으면서 ‘지음(知音)’으로 우정을 대치하는 방법도 있겠다. 제자백가서〈열자列子〉에 나오는 두 친구가 그랬다. 백아(伯牙)가 생각을 높은 산에 두고서 거문고를 연주하면 종자기(鍾子期)는 듣고서 “태산과 같음이여!”라는 추임새를 넣었고 물을 염두에 두고 거문고를 타면 “황하와 양자강 같을시고!”라고 하며 무릎장단을 보탰다. 이처럼 백아가 생각하는 바를 종자기는 반드시 알아들었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 줄을 끊고(絶絃)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지음’과 ‘백아절현’은 우정을 상징하는 문자로 바뀌었다. 만약 지금 둘이 다시 만나 거문고를 연주하고 추임새를 넣고자 한다면 “종자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친절한 안내문자가 올 것이다.
엄숙한 조선의 선비들도 음악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이기도 했다. 경북 예천 남야(南野)종가집에는 자명금(自鳴琴 나라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울림)이라고 불리는 거문고가 가보로 전해왔다고 한다. 박정시(朴廷蓍 1601~1672)는 벼슬에서 물러날 때 책 한 권과 이 거문고 한 개만 챙겨서 귀향했다. 청렴결백했던 그도 거문고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찌보면 오백년 전의 부분명품족이 누린 유일한 사치였던 것이다. 서재에 거문고를 두고서 독서하다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연주를 하곤 했다. 혹사당한 눈은 쉬게 하고 대신 놀고 있던 귀를 열고서 손가락을 마디마디 움직이는 이완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는 나름의 휴식법이라 하겠다.
경북 청도 화양 탁영 종택(宗宅)에는 보물 제957호 탁영금(濯纓琴 탁영은 물을 맑을 때는 갓끈(영(纓))을 씻고(탁(濯)) 물이 흐릴 때는 발을 씻는다는 굴원의 시에서 유래)이 전해온다. 김일손(1464~1498)이 1490년 제작한 것으로 현존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거문고라고 하겠다. 당시의 원재료는 오동나무로 제작된 이미 100년 넘은 낡은 문짝이었다. 문을 새로 교체하면서 버려지는 것을 얻어와 거문고를 만들었다. 문비금(門扉琴 문짝거문고)이라 이름을 붙이고는 “거문고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걸어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긴 소리 때문만이 아니로다” 라는 의미까지 부여한 글을 남겼다. 오동나무 판대기가 문(門)의 역할을 마치니 다시 거문고의 몸체로 바뀐 것이다.
절집에도 거문고는 빠지지 않았다. 충남 예산 수덕사에 전해오는 만공(滿空1871~1946)선사가 소장했던 거문고는 고종임금의 아들인 의친왕이 준 선물이라고 한다. 바탕에 ‘공민왕 금(琴)’이라는 글씨가 새겨있긴 했으나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만족해야 했다. 추정컨대 전문가들로부터 진짜 고려금(高麗琴)으로 인정받진 못한 모양이다. 고려진품이라면 당연이 국보감이다. 하지만 현대소설가의 영감을 자극하면서 장편소설 탄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최인호(1945~2013) 작가의 ‘길없는 길’은 이 거문고의 비밀에 대한 상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문고는 가사를 짓고 소설을 만드는 마르지 않는 문학적 샘물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자년(2020)의 추석풍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가야금 이름도 바뀌었다. 우륵(于勒)의 고향인 대가야국 도읍지였던 경북 고령에서는 가야금이라고 불렀지만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 그의 주 활동무대가 된 충북 충주 탄금대로 옮겨 가면서 신라금이 된다. ‘신라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나라(奈良)에 소재한 동대사(東大寺 도다이지) 정창원(正倉院쇼쇼인)에 몇 점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가장 오래된 가야금인 셈이다.
지금 가야금과 거문고는 일목요연한 도표를 만들어 서로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분명하게 경계를 두고 나누고 있지만 한문사전의 ‘금(琴)’자(字)는 ‘거문고 금’자다. 두 악기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개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악기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크게 구별하거나 나누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강남에는 귤 강북에는 탱자’라고 한 것처럼 지역과 사람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가 뒤따랐을 뿐이다. 어쨌거나 모든 것은 바뀐다는 그 사실 하나만 바뀌지 않을 뿐 모든 것은 변해가기 마련이라는 것도 ‘금(琴)’자가 알려주고 있다.
가능한 이동금지를 권고한 추석연휴인지라 지인이 두고 간 국악시평집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덤으로 오가는 길에 탄금대와 가얏고마을을 찾았다. 이게 책 한 권이 주는 힘이다. 가얏고마을 입구의 넓은 공터에 진열된 어림짐작으로 몇 백개는 될법한 전시용 오동나무판은 또다른 볼거리다. 남한강 절벽 위의 탄금대 표지석 앞에서 유장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소리없는 소리를 들었다. 아~그렇지! 서산(西山)대사로 불리는 청허휴정(淸虛休靜1520~1604)선사도 거문고를 좋아하여 ‘청허가(淸虛歌)’를 남기셨구나.
거문고를 안고 소나무에 기댔더니(君抱琴兮倚長松)
소나무는 변치않는 마음이로다.(長松兮不改心)
노래를 부르며 푸른 물가에 앉으니(我長歌兮坐綠水)
푸른 물은 맑고 텅 빈 (청허의) 마음 이구나.(綠水兮淸虛心)
글 원철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