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기자가 읽은 책] 갈매기의 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위해 목 맬 것까지야…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높이 날며,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난다.”
1970년 미국에서 발표돼 미국 문학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대해 많은 출판사와 서점들은 이렇게 소
 개했다. 이 책의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처럼 이상을 간직하고 높이 날고 멀리 봐서 이를 실현하라고.
이 책이 인간의 한계를 딛고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소개되면서 성직자들은 “신(神)의 영역에 도전한 오만의 죄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꿈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도 날마다 꿈을 꾸니까. 밤에도 꾸고, 낮에도 꾸고….(실은 낮에 꾸는 꿈, 의식이 명료한 가운데 꾸는 꿈이 진짜 꿈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 조나단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저 하늘 끝까지 높이 날고, 초고속으로 날아야 하는 것일까.(대한민국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너무 빨리 너무 높이 날고 있다. 떨어질까 두려워 더 높이 더 멀리~~~. 그러다 쉬어보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죽기도 한다. 그러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분통 터져 죽는다.)
<갈매기의 꿈>에서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더 잘 날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 지금 처럼 날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그러나 우린 너무 지장 많다!)
그러나 조나단은 먹는 것보다 ‘나는 것’ 자체가 소중했다. 그래서 날마다 남몰래 피눈물 나는 날기 연습을 한다. 그리고 고공낙하 비행을 감행한다. 시속 220㎞로 1500미터 상공에서. 맹렬한 속도로 급강하하다가 날개를 접고 회전하지 못하면 몸이 산산조각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속도에 광적으로 몰입해 드디어 시속 340㎞로 날며 2400미터 상공에서 급강하할 수 있게 된다. 점점 ‘하늘엔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창공을 비상하는 조나단의 모습에서 많은 독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목을 맨다.
개했다. 이 책의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처럼 이상을 간직하고 높이 날고 멀리 봐서 이를 실현하라고.
이 책이 인간의 한계를 딛고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소개되면서 성직자들은 “신(神)의 영역에 도전한 오만의 죄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꿈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도 날마다 꿈을 꾸니까. 밤에도 꾸고, 낮에도 꾸고….(실은 낮에 꾸는 꿈, 의식이 명료한 가운데 꾸는 꿈이 진짜 꿈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 조나단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저 하늘 끝까지 높이 날고, 초고속으로 날아야 하는 것일까.(대한민국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너무 빨리 너무 높이 날고 있다. 떨어질까 두려워 더 높이 더 멀리~~~. 그러다 쉬어보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죽기도 한다. 그러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분통 터져 죽는다.)
<갈매기의 꿈>에서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더 잘 날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 지금 처럼 날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그러나 우린 너무 지장 많다!)
그러나 조나단은 먹는 것보다 ‘나는 것’ 자체가 소중했다. 그래서 날마다 남몰래 피눈물 나는 날기 연습을 한다. 그리고 고공낙하 비행을 감행한다. 시속 220㎞로 1500미터 상공에서. 맹렬한 속도로 급강하하다가 날개를 접고 회전하지 못하면 몸이 산산조각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속도에 광적으로 몰입해 드디어 시속 340㎞로 날며 2400미터 상공에서 급강하할 수 있게 된다. 점점 ‘하늘엔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창공을 비상하는 조나단의 모습에서 많은 독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목을 맨다.
 <갈매기의 꿈>에서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동료 갈매기들의 질시와 조소에 아랑곳 없이 그렇게 높이 멀리 비상하는 조나단은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편에서 “뭐 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높이까지 힘들게 나느냐?”는 매미와 비둘기의 조소에도 아랑곳 없이 9만 리 창천을 나르는 대붕과 유사하다. 비행사인 리처드 바크가 언제 동양의 <장자>를 봤을지 모르지만, <갈매기의 꿈>은 소요유의 서양판이다.
그런데 만약 <갈매기의꿈>이 죽도록 노력해 꿈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것이기만 하다면 이는 장자의 아류로도 볼 수 없다.
인간은 밥도 먹고 살지만,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보람을 먹고 살며, 행복과 기쁨을 먹고 산다. 그런데 꼭 높이 날고 멀리 날아야만 보람차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일까.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 꼭 하늘 끝까지 가봐야하는 것일까. 봄을 찾기 위해 꼭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봐야 하는 것일까. 우주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주를 지배해야 하는 것일까.
<갈매기의 꿈>에서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동료 갈매기들의 질시와 조소에 아랑곳 없이 그렇게 높이 멀리 비상하는 조나단은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편에서 “뭐 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높이까지 힘들게 나느냐?”는 매미와 비둘기의 조소에도 아랑곳 없이 9만 리 창천을 나르는 대붕과 유사하다. 비행사인 리처드 바크가 언제 동양의 <장자>를 봤을지 모르지만, <갈매기의 꿈>은 소요유의 서양판이다.
그런데 만약 <갈매기의꿈>이 죽도록 노력해 꿈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것이기만 하다면 이는 장자의 아류로도 볼 수 없다.
인간은 밥도 먹고 살지만,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보람을 먹고 살며, 행복과 기쁨을 먹고 산다. 그런데 꼭 높이 날고 멀리 날아야만 보람차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일까.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 꼭 하늘 끝까지 가봐야하는 것일까. 봄을 찾기 위해 꼭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봐야 하는 것일까. 우주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주를 지배해야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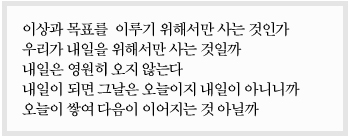 방긋 웃는 아가의 웃음에서, 책 한 페이지에서 발견한 신선한 깨달음에서, 연인의 따스한 손길에서, 밤새 싹을 틔워낸 화분의 화초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이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만 사는 것일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일이 되면 그 날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니까. 보람찬 오늘이 쌓여 보람찬 다음이 있고, 행복한 오늘이 쌓여 행복한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늘 삶의 보람을 찾고, 이를 즐겁게 하는 과정에서 성취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자도 말했다.(<논어>에서)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
즐기는 자는 밤새 자기 돈을 내고 춤을 춰도 지치지 않지만, 이를 즐기지 못하면 돈을 받고도 힘에 겨워하니까.
그러니 날자. 보람을 찾지 못하고, 기쁘지 않으면 날개를 접고 쉬자. 그리고 보람을 찾았을 때 다시 날자. 기쁘게 기쁘게~~~.
방긋 웃는 아가의 웃음에서, 책 한 페이지에서 발견한 신선한 깨달음에서, 연인의 따스한 손길에서, 밤새 싹을 틔워낸 화분의 화초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이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만 사는 것일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일이 되면 그 날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니까. 보람찬 오늘이 쌓여 보람찬 다음이 있고, 행복한 오늘이 쌓여 행복한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늘 삶의 보람을 찾고, 이를 즐겁게 하는 과정에서 성취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자도 말했다.(<논어>에서)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
즐기는 자는 밤새 자기 돈을 내고 춤을 춰도 지치지 않지만, 이를 즐기지 못하면 돈을 받고도 힘에 겨워하니까.
그러니 날자. 보람을 찾지 못하고, 기쁘지 않으면 날개를 접고 쉬자. 그리고 보람을 찾았을 때 다시 날자. 기쁘게 기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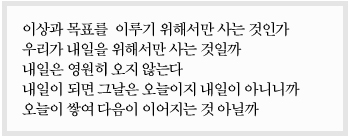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