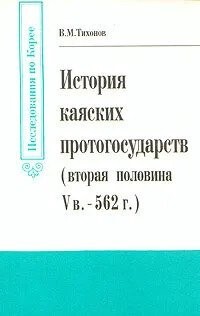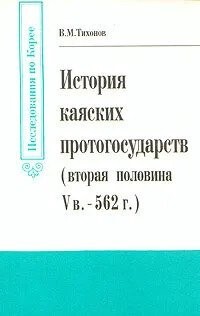출간 연도순으로 보면, 나의 첫 책은 1998년에 나왔다. 발행처는 모스크바, 언어는 러시아어, 그리고 출판처는 소련 시절부터 아시아 관련 학술 서적을 계속 냈던 ‘동양학서적출판사’(Izdatel'stvo Vostochnaya Literatura)였다. 256쪽 두께의 이 책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낸 것이었다. 제목은 <가야 준국가들의 역사(5세기 후반~562년)>이었다. 아마도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럽 언어로도 여태까지 유일하게 나온 가야사 연구 서적일 것이다. 하지만 서방이나 한국 학계에서 러시아어 능통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에 구소련 지역의 학계에서 종종 인용되지만, 그 밖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책이 됐다.
내가 가야사에 관심을 둔 것은 대학 학부 시절부터다. 한사군과도 일본열도와도 교역을 계속하고, 광개토왕의 역습도 백제의 영향도 받고 결국 신라에 흡수되어 김유신(595~673)이나 그 현손인 역술가이자 외교관인 김암(金巖, 8세기) 등을 배출한 신김씨의 본고장인 가야는, 나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구미권이나 소련에서는 가야사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일본 역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1904~1992)가 쓴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 1949)는 누가 봐도 식민주의적 역사 왜곡의 냄새가 당장 났다.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부’가 4세기 중반부터 임나, 즉 가야를 통치했는데, 그 시기에 ‘일본’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에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로만 보였다.
그러나 한때에 나의 스승인 미하일 박(1918~2009)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한 북한의 김석형(金錫亨, 1915~1996) 사회과학원 원사가 1963년에 내놓은 소위 ‘일본 열도 분국설’(日本列島分國說)도 나로서는 수긍하기가 힘들었다. 이 학설에 의하면 <일본서기>에서 종종 보이는 ‘임나일본부’는 한반도 출신들이 일본 열도 내에서 세운 ‘분국’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국들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가 불가능했으며 김석형의 주장 그 자체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한 매우 과도한 탈식민적인 민족주의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식민주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경청해야 하는 이야기이었지만, 학술적으로 성립하기가 힘든 학설이었다. 나는 그래서 식민주의와도 민족주의와도 무관한, ‘오로지 사실(史實)’과 마르크스주의적인 국가 성립론을 바탕으로 하는 가야사를 한번 써보겠다는 야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적어, 그 뒤에 그 논문을 이렇게 책으로 내놓았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된 개념어는 ‘준(準)국가'다. 고대국가란, 중앙 권력이 전(全)사회의 잉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시킬 수 있는 계급적 구조를 뜻한다. 가야의 경우에는 경남 함안의 아라가야나 경북 고령의 대가야, 경남 김해의 본가야는 ‘왕’의 칭호를 가진 최고 지배자를 갖고 있었고 전쟁 및 외교 수행 능력을 보유했지만, 자국 내 재지(在地) 귀족이나 인접 가야 소국들의 한기(旱岐, 추장)를 제압해 사회적 잉여 수취 과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위치를 확립할 수 없었다. 비교하자면 6부(部)의 우두머리들을 경북 포항 냉수리 신라비 같은 금석문에서 다 ‘왕’으로 표기했던, 즉 권력이 아직 분산돼 있었던 5세기 말~6세기 초 신라 사회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컸다. 단, 신라와 달리 국제 무역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가야 소국의 세력들은 그 독자성이 매우 강해서, 아라가야나 대가야의 군주들이 끝내 그 통합과 권력의 중앙화에 실패해 신라에 편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나는 나의 이 첫 책에서 나의 스승 미하일 박의 고대 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를 계승한 셈이었다. 미하일 박은 고구려와 신라를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나는 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가야를 다루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 고대 정치·사회사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점이 아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노자 한국학자
<한국고대불교사>(서울대출판부, 1998)
러시아 사학자 세르게이 볼코브(1955년생)의 원서를 국역했다. 볼코브는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사를 주로 ‘승가와 국가’의 관계 차원에서 다뤘다. 그에 의하면 국가가 승가를 촘촘히 관리했던 가운데 국가 권력과 승단 사이에서 일종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승단이 국가를 위해 팔관회나 백고좌법회 내지 수륙재 등을 지내는 등 초자연적 힘이 국가를 보호해준다는 사회적 의식을 성립, 유통시킴으로서 민심을 수습시키고 국왕 등의 위신을 높였다. 이와 같은 ‘의례적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사원에 대해 면세 특권을 인정하고 토지, 노비 소유를 보호해주었다. 그러나 이 ‘호혜 관계’ 속에서 국가는 늘 우월권을 가졌다.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출판, 2001)
1997~2000년,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시기에 국내 교직에 있으면서 관찰한 것들을 총정리했다. 내가 1990년대 말 한국에서 본 것은 높은 수준의 군사화와 사회 도처에 스며든 권위주의적 요소, 개발주의 시대의 노동 착취와 신자유주의적 불안의 중첩이었다. 국내 대학은, ‘힘 있는’ 교수가 ‘힘 없는’ 다른 구성원(대학원생, 조교, 비정규직 등)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노예 농장’ 같은 곳이었다. 수십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던 영세 제조업 업체들은 주로 임금 착취에 기댔으며, 국내인에게 할 수 없는 초과착취를 외국인들에게 감행했다. 거시적으로 ‘민주화’돼도 미시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와 기업의 독재로 남아 있는 이 사회에서 자의식 강하고 개성 있는 독립적 개인으로서 거의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게 나의 슬픈 결론이었다.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한겨레출판, 2002)
2000~2002년 사이에 노르웨이 사회에서 관찰한 부분들을 총정리했다. 노르웨이도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지만, 건국 초기부터 사민주의적 혁신 정당들이 탄압을 받아 주변화된 한국과 달리 사민주의자들이 1930년대부터 사회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곳이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의 이념 차원에서는 평등이 중시되고, 한국과 달리 각 개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역할이 절대적 의미를 가진 ‘신분’으로 고착되지 않는다.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되고, 30대 초반의 활동가가 의회 정당의 당수가 되고, 고졸 출신 노조 활동가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사회다. 한국이 ‘노르웨이처럼’ 될 수 없어도 적어도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 강화’ 쪽으로 가기 위해 노르웨이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배반한 역사>(인물과사상, 2003)
이 책의 주제는 한국 근대사 속에서의 ‘나’와 ‘나’, 즉 개인의 자유 문제다. ‘개인’이나 ‘자유’ 같은 개념어들은 개화기 때 번역되어 출현하지만,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은 제국주의와 그다지 다르지 않게 보통 개인을 ‘민족’ 내지 ‘국가’라는 집단 단위에 예속시키곤 했다. 제국주의자들이 도입한 사회진화론을 저항적 민족주의도 받아들여 그 담론 속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은 ‘부국강병'을 통한 국가/민족의 ‘생존’과 세계적 웅비(雄飛)를 위해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었다. ‘지식은 국력’, ‘체력은 국력’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공부나 스포츠 등은 국가 내지 민족의 문제로 환원되곤 했다. 추격(追擊)형 발전 궤도를 따르는 남북한에서 ‘개인'이 왜 이처럼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가가 이 책의 화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