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강의’ 펴낸 기세춘 선생
인터뷰 / ‘노자 강의’ 펴낸 기세춘 선생
“도교사상 순치화 앞장선 왕필이 저항성 탈색한 뒤 유교사상 덧씌워”
왜곡된 ‘노자’ 답습한 국내풍토 비판 민중적·혁명적 사상으로 복원나서 〈노자〉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니! “〈노자〉는 분명 혁명 진영의 성전이었다. 하지만 모두 왕필이 노장사상을 유교화한 ‘현학’을 떠받들고 있다. 정작 중국에선 청대 고증학 등장 이후 버린 것인데, 청나라를 오랑캐로 비하한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이 땅에선 유교의 아류로 왜곡된 〈노자〉를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답습하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토대로 한 번역서들이 오역투성이고 역자마다 달라 도무지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다.” 묵점 기세춘. 일흔셋의 ‘열혈 청년’인 그가 동양고전 재번역운동의 일환으로 또 내어 놓은 〈노자 강의〉(바이북스 펴냄)는 “그런 왜곡과 변질을 걷어내고 민중적이고 혁명적인 본래 〈노자〉”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왕필이 누군가?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가 무너진 뒤 황건적 토벌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위왕 조조가 천하를 손에 쥔다. 조조는 그때 황건적의 주축 도교 세력의 일파인 천사도(오두미교)를 포섭해 이용했는데, 대권을 잡은 뒤에는 도교 세력을 체제 내로 순치하려 했다. 조조의 양자요 사위인 실력자 하안이 그 임무를 맡아 실무 총책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왕필이다. 왕필은 〈노자주〉 등을 통해 “〈노자〉의 저항적 민중성을 탈색시켜 버리고” 지배계급에 복무하도록 왜곡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자〉는 2400년 전 본래의 〈노자〉가 아니다”라고 묵점은 단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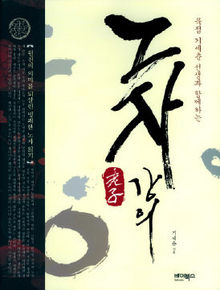 그는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국지〉(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몹시 싫어한다”고 했다. 왜? “역사는 늘 지배자의 것이고, 담론은 권력이다. 힘있는 담론만이 살아남게 된다. 따라서 시민이 승리한 근대 이전까지 농민군은 항상 질 나쁜 도둑떼요 반역자들로 매도당했다. 〈삼국지〉는 폭정에 항거한 농민군을 일말의 동정도 없이 반역자로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황건적이 바로 농민 반란군이었고, 그 중추가 도교 세력이었으며 그들의 교본이 〈노자〉였다면, 〈노자〉를 “혁명 진영의 성전”이라 본다 해서 이상할 게 없다. 그는 노자는 실재한 인물이 아니며 〈노자〉는 오랜 세월에 걸친 민중의 집단창작이라는 설을 지지한다.
그는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국지〉(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몹시 싫어한다”고 했다. 왜? “역사는 늘 지배자의 것이고, 담론은 권력이다. 힘있는 담론만이 살아남게 된다. 따라서 시민이 승리한 근대 이전까지 농민군은 항상 질 나쁜 도둑떼요 반역자들로 매도당했다. 〈삼국지〉는 폭정에 항거한 농민군을 일말의 동정도 없이 반역자로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황건적이 바로 농민 반란군이었고, 그 중추가 도교 세력이었으며 그들의 교본이 〈노자〉였다면, 〈노자〉를 “혁명 진영의 성전”이라 본다 해서 이상할 게 없다. 그는 노자는 실재한 인물이 아니며 〈노자〉는 오랜 세월에 걸친 민중의 집단창작이라는 설을 지지한다.
묵점의 〈노자〉 읽기를 보자. 53장 “使我介然有知(사아개연유지) 行於大道(행어대도) 唯施是畏(유시시외)”를 그는 “만일 나에게 조그만 지혜가 있다면 무위자연의 대도를 행해 오직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해방을 공경할 것이다”로 풀이했다. 기존 번역자들은 ‘행어대도 유시시외’를 대부분 ‘사악한 길, 사도, 샛길로 빠질까 두려울 뿐’이라거나 ‘두려워하며 베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大道甚夷(대도심이) 而民好徑(이민호경) 朝甚除(조심제) 田甚蕪(전심무) 倉甚虛(창심허)”도 그는 “무위자연의 대도는 심히 평이한 길인데도 사람들은 소도를 좋아하고 조정은 민중을 심히 닦달하니 농토는 황폐하고 창고는 비었다”고 풀이했으나, ‘조심제’ 부분을 왕필은 ‘궁실은 심히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로 해석했고 국내 번역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왕필의 견해를 따랐다. 사실 왕필식으로 읽어서는 맥락이 통하지 않고 당시의 처참한 사회현실도 사장돼 버린다. 당시는 “길가에 시체들이 서로 바라보는” 춘추전국시대, 〈좌전〉이 “지금은 말세”라고 했던 난세였다. 19장의 “絶聖棄智(절성기지) 民利百倍(민리백배)”도 묵점은 “성인(군주)을 없애고 지식을 버려라.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가 될 것이다”로 읽었으나 바로 밑에 배열한 기존 번역자들 해석은 모두 ‘학문이나 지혜, 성스러움과 슬기로움을 버려라’는 식으로 돼 있다. 묵점은 ‘성인’이나 ‘지식’을 당시 체제와 가진자들 위주의 유교적 가치로 보면서 “노장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바로 그런 체제지향적인 작위적·인위적·문명적 가치를 거부하는 저항사상, 반전과 무치(無治)와 반문명적 기계 거부운동”이었으나, 기존 번역자들 해석이 “수양이나 읊조리는 유한계급의 청담이나 자본주의적 처세훈 또는 초월적 신비사상으로 노장을 변질”시켰다며 단호하게 비판했다. “저항적 담론을 우민적 반동으로 왜곡해 버렸다”는 것이다. 의병과 항일운동을 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으로 ‘국민학교’에 가지 않고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던 묵점의 한문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수급. 그는 광범한 전적들을 동원해 꼼꼼하게 설명하는 한편, 문제되는 부분들을 10여명의 기존 번역자들 풀이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책을 편집해놨다. 글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왜곡된 ‘노자’ 답습한 국내풍토 비판 민중적·혁명적 사상으로 복원나서 〈노자〉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니! “〈노자〉는 분명 혁명 진영의 성전이었다. 하지만 모두 왕필이 노장사상을 유교화한 ‘현학’을 떠받들고 있다. 정작 중국에선 청대 고증학 등장 이후 버린 것인데, 청나라를 오랑캐로 비하한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이 땅에선 유교의 아류로 왜곡된 〈노자〉를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답습하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토대로 한 번역서들이 오역투성이고 역자마다 달라 도무지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다.” 묵점 기세춘. 일흔셋의 ‘열혈 청년’인 그가 동양고전 재번역운동의 일환으로 또 내어 놓은 〈노자 강의〉(바이북스 펴냄)는 “그런 왜곡과 변질을 걷어내고 민중적이고 혁명적인 본래 〈노자〉”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왕필이 누군가?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가 무너진 뒤 황건적 토벌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위왕 조조가 천하를 손에 쥔다. 조조는 그때 황건적의 주축 도교 세력의 일파인 천사도(오두미교)를 포섭해 이용했는데, 대권을 잡은 뒤에는 도교 세력을 체제 내로 순치하려 했다. 조조의 양자요 사위인 실력자 하안이 그 임무를 맡아 실무 총책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왕필이다. 왕필은 〈노자주〉 등을 통해 “〈노자〉의 저항적 민중성을 탈색시켜 버리고” 지배계급에 복무하도록 왜곡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자〉는 2400년 전 본래의 〈노자〉가 아니다”라고 묵점은 단언했다.
〈노자 강의〉
묵점의 〈노자〉 읽기를 보자. 53장 “使我介然有知(사아개연유지) 行於大道(행어대도) 唯施是畏(유시시외)”를 그는 “만일 나에게 조그만 지혜가 있다면 무위자연의 대도를 행해 오직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해방을 공경할 것이다”로 풀이했다. 기존 번역자들은 ‘행어대도 유시시외’를 대부분 ‘사악한 길, 사도, 샛길로 빠질까 두려울 뿐’이라거나 ‘두려워하며 베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大道甚夷(대도심이) 而民好徑(이민호경) 朝甚除(조심제) 田甚蕪(전심무) 倉甚虛(창심허)”도 그는 “무위자연의 대도는 심히 평이한 길인데도 사람들은 소도를 좋아하고 조정은 민중을 심히 닦달하니 농토는 황폐하고 창고는 비었다”고 풀이했으나, ‘조심제’ 부분을 왕필은 ‘궁실은 심히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로 해석했고 국내 번역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왕필의 견해를 따랐다. 사실 왕필식으로 읽어서는 맥락이 통하지 않고 당시의 처참한 사회현실도 사장돼 버린다. 당시는 “길가에 시체들이 서로 바라보는” 춘추전국시대, 〈좌전〉이 “지금은 말세”라고 했던 난세였다. 19장의 “絶聖棄智(절성기지) 民利百倍(민리백배)”도 묵점은 “성인(군주)을 없애고 지식을 버려라.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가 될 것이다”로 읽었으나 바로 밑에 배열한 기존 번역자들 해석은 모두 ‘학문이나 지혜, 성스러움과 슬기로움을 버려라’는 식으로 돼 있다. 묵점은 ‘성인’이나 ‘지식’을 당시 체제와 가진자들 위주의 유교적 가치로 보면서 “노장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바로 그런 체제지향적인 작위적·인위적·문명적 가치를 거부하는 저항사상, 반전과 무치(無治)와 반문명적 기계 거부운동”이었으나, 기존 번역자들 해석이 “수양이나 읊조리는 유한계급의 청담이나 자본주의적 처세훈 또는 초월적 신비사상으로 노장을 변질”시켰다며 단호하게 비판했다. “저항적 담론을 우민적 반동으로 왜곡해 버렸다”는 것이다. 의병과 항일운동을 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으로 ‘국민학교’에 가지 않고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던 묵점의 한문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수급. 그는 광범한 전적들을 동원해 꼼꼼하게 설명하는 한편, 문제되는 부분들을 10여명의 기존 번역자들 풀이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책을 편집해놨다. 글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