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경의 과학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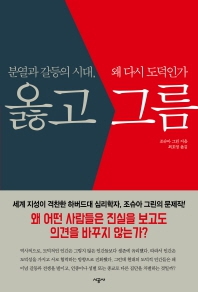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조슈아 그린 지음, 최호영 옮김/시공사(2017) 오늘도 세계 어디선가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다. 사람이 사는 지구에는 전쟁과 테러,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싸우는가? 왜 사람들마다 가치체계와 이해관계가 다른가? 누구는 A가 옳다고 하고 누구는 B가 옳다고 하는가? 이러한 인간 사회의 뿌리깊은 견해 차이는 정치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옳고 그름의 합의점을 찾고 평화로운 사회에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뇌구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간의 뇌는 진화의 산물이다. 함께 모여서 사는 생활은 인간을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인 사이에서는 이타심을 발휘하던 도덕성이 집단 사이에는 작동을 멈춘다. 그 이유는 진화가 본질적으로 생존 경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집단 사이의 협력을 방해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반응하는 도덕성은 집단 내에서 협력하고 집단 사이에서는 경쟁하도록 진화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중심으로 여러 집단 속에 살아간다. 가족, 친구, 학교, 지역, 종교, 국가, 인종 등에 소속되어, 자신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슈아 그린은 이것을 부족주의(tribalism)라고 불렀다. 뇌는 부족주의를 추구하도록 조직되었다는 것. 인간의 뇌가 도덕적이라고 하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도덕을 찾지 못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조슈아 그린은 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의 작동방식에 주목했다. 인간의 뇌는 도덕적 판단 뿐만 아닌 모든 선택에서 이중처리의 방식을 가진다. 마치 자동설정과 수동모드를 함께 지닌 듀얼모드 카메라와 같이 작동된다. 자동적인 정서반응은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에서, 통제된 인지와 추론은 배외측 전전두피질에서 주로 생성된다. 두 개의 도덕적 마음이 뇌의 다른 부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설정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뇌는 부족주의를 피할 수가 없다. 다양한 부족들은 각자의 자동설정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도덕적 렌즈로 세상을 본다. 이때 각 부족의 도덕적 관점에서 벗어나려면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예컨대 다른 인종을 보았을 때 거부감이 드는, 우리의 뇌는 인종차별이 나쁘다는 추론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우리에게 도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왜 우리가 싸우는지에 대해 인간 본성의 폭력성을 거론하는 것보다 꽤 설득력이 있는 문제제기다. 조슈아 그린은 ‘공리주의’와 ‘깊은 실용주의’를 제시하면서 뇌의 생물학적 구조를 ‘초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 뇌의 수동모드, 추론 능력을 의식적으로 작동시켜서 ‘행복을 공평하게 최대화하라’는 공리주의의 목표를 추구하자고 말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산다. 자기 행위의 확실한 도덕적 근거를 갖고 싶다는 자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옳고 그름>은 과학과 철학을 융합해서 도덕적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행복과 공평성이라는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적 가치의 씨앗을 뿌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는가! 정인경 과학저술가
조슈아 그린 지음, 최호영 옮김/시공사(2017) 오늘도 세계 어디선가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다. 사람이 사는 지구에는 전쟁과 테러,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싸우는가? 왜 사람들마다 가치체계와 이해관계가 다른가? 누구는 A가 옳다고 하고 누구는 B가 옳다고 하는가? 이러한 인간 사회의 뿌리깊은 견해 차이는 정치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옳고 그름의 합의점을 찾고 평화로운 사회에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뇌구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간의 뇌는 진화의 산물이다. 함께 모여서 사는 생활은 인간을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인 사이에서는 이타심을 발휘하던 도덕성이 집단 사이에는 작동을 멈춘다. 그 이유는 진화가 본질적으로 생존 경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집단 사이의 협력을 방해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반응하는 도덕성은 집단 내에서 협력하고 집단 사이에서는 경쟁하도록 진화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중심으로 여러 집단 속에 살아간다. 가족, 친구, 학교, 지역, 종교, 국가, 인종 등에 소속되어, 자신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슈아 그린은 이것을 부족주의(tribalism)라고 불렀다. 뇌는 부족주의를 추구하도록 조직되었다는 것. 인간의 뇌가 도덕적이라고 하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도덕을 찾지 못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조슈아 그린은 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의 작동방식에 주목했다. 인간의 뇌는 도덕적 판단 뿐만 아닌 모든 선택에서 이중처리의 방식을 가진다. 마치 자동설정과 수동모드를 함께 지닌 듀얼모드 카메라와 같이 작동된다. 자동적인 정서반응은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에서, 통제된 인지와 추론은 배외측 전전두피질에서 주로 생성된다. 두 개의 도덕적 마음이 뇌의 다른 부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설정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뇌는 부족주의를 피할 수가 없다. 다양한 부족들은 각자의 자동설정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도덕적 렌즈로 세상을 본다. 이때 각 부족의 도덕적 관점에서 벗어나려면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예컨대 다른 인종을 보았을 때 거부감이 드는, 우리의 뇌는 인종차별이 나쁘다는 추론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우리에게 도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왜 우리가 싸우는지에 대해 인간 본성의 폭력성을 거론하는 것보다 꽤 설득력이 있는 문제제기다. 조슈아 그린은 ‘공리주의’와 ‘깊은 실용주의’를 제시하면서 뇌의 생물학적 구조를 ‘초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 뇌의 수동모드, 추론 능력을 의식적으로 작동시켜서 ‘행복을 공평하게 최대화하라’는 공리주의의 목표를 추구하자고 말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산다. 자기 행위의 확실한 도덕적 근거를 갖고 싶다는 자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옳고 그름>은 과학과 철학을 융합해서 도덕적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행복과 공평성이라는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적 가치의 씨앗을 뿌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는가! 정인경 과학저술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작가는 몸으로 일한다 [책&생각] 작가는 몸으로 일한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512/53_16838518334352_202305115040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