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정인경의 과학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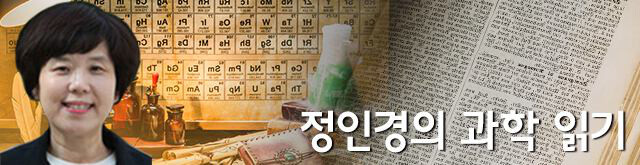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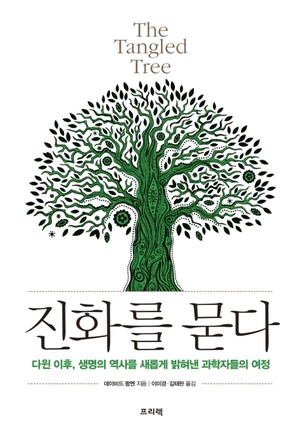
데이비드 쾀멘 지음, 이미경·김태완 옮김/프리렉(2020) 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쉽게 변이를 일으킬까? 왜 백신 개발이 어려울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항생제에 적응한 돌연변이의 출현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가피한 진화의 과정으로 알고 있을 뿐, 박테리아 변이의 유전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데이비드 쾀멘의 <진화를 묻다>는 20세기 후반 생물학의 혁명을 일으킨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실체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의 역사에서 미생물이 인간의 진화를 어떻게 추동했는지를 통찰한다. 1977년 칼 워즈는 원핵생물도, 진핵생물도 아닌 “제3의 생명체”를 발견했다. 분자서열의 분석 기술로 생물의 계통관계를 추적하다가 고세균(아르케이아)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세포핵이 없는 원핵생물과 핵이 있는 진핵생물의 이분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리고, 1990년에 ‘3영역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지구의 생물을 세균(박테리아), 고세균, 진핵생물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중에 진핵생물은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자계통학의 발전은 생명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진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칼 워즈와 린 마굴리스 등의 새로운 연구는 진화와 계통을 표현하는 다윈의 “생명의 나무”를 바꾸었다. 생명의 역사는 나무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미생물의 세계에서 유전자는 아래 세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종의 경계를 가로질러 수평적으로 이동하였다. 바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이렇게 진화했다. 수평유전은 형질전환, 접합, 형질도입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그중에서 형질도입은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박테리아의 접촉 없이도 유전자를 교환했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들은 자신이 감염시킨 세포에 외부 유전자를 나르며, 순식간에 강력한 슈퍼 버그를 탄생시켰다. 수평 유전을 통해 다른 종의 박테리아로부터 모든 약물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감염 유전”은 다윈의 느린 진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선택은 한 개체와 다른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 변이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 다중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진화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돌연변이가 출현해야 한다. A, C, G, T의 염기서열이 어쩌다 한번 틀려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로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감염유전이 일반적인 느린 진화를 앞선 것은 유전자의 수평 이동 과정에서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박테리아 유전자는 유전자 한 조각이 아니라 내성에 관계된 유전자 뭉치가 통째로 오고 갔다. 또 그 유전자 뭉치는 생물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평 유전의 현상은 진핵생물 종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해서 더 강한 내성을 갖고, 인간 숙주들 사이에서 옮겨 다니고 있다.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인간 유전체의 8%를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의 정체성의 12분의 1은 바이러스인 셈이다. 이렇게 이 책은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과학저술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작가는 몸으로 일한다 [책&생각] 작가는 몸으로 일한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512/53_16838518334352_202305115040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