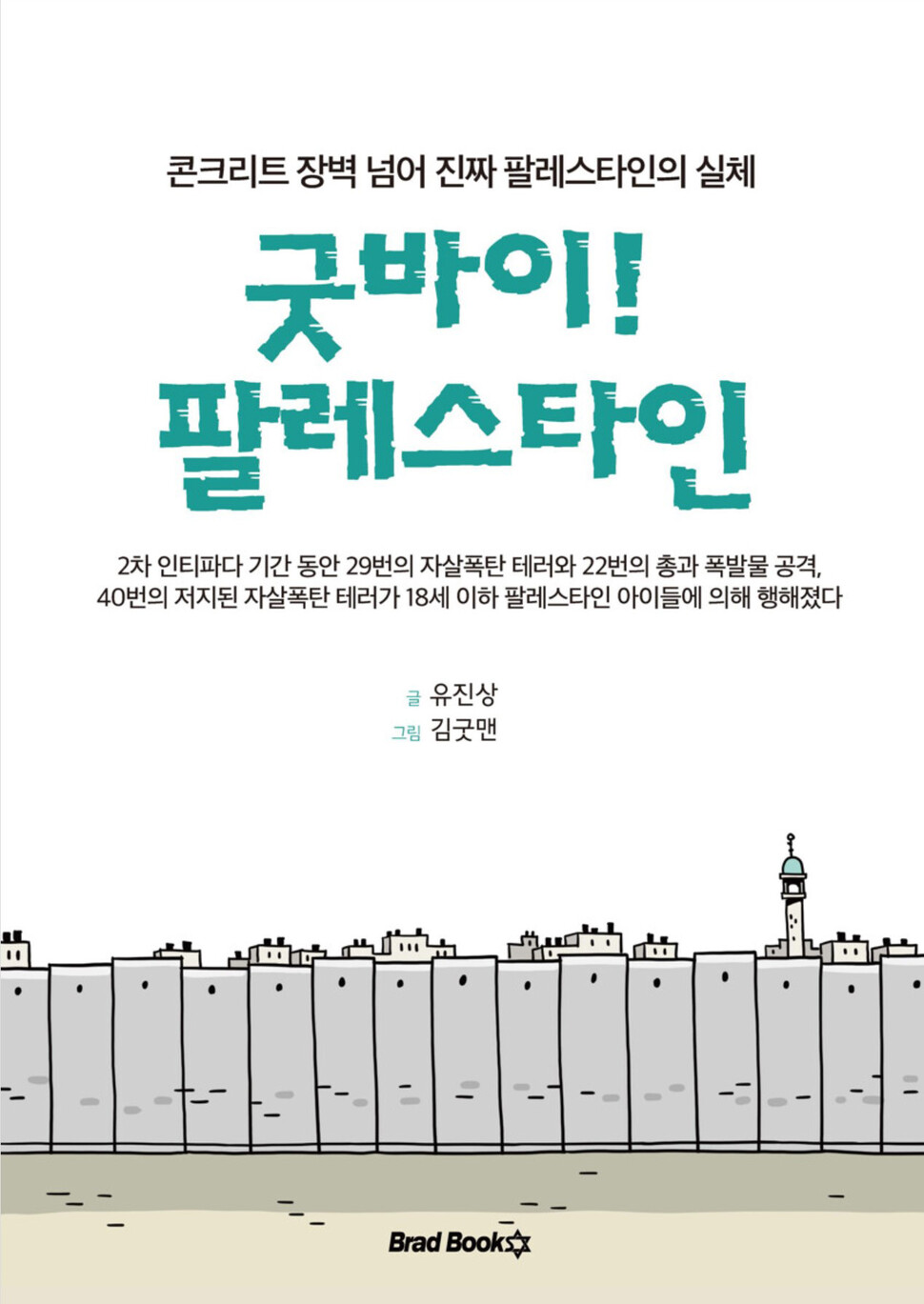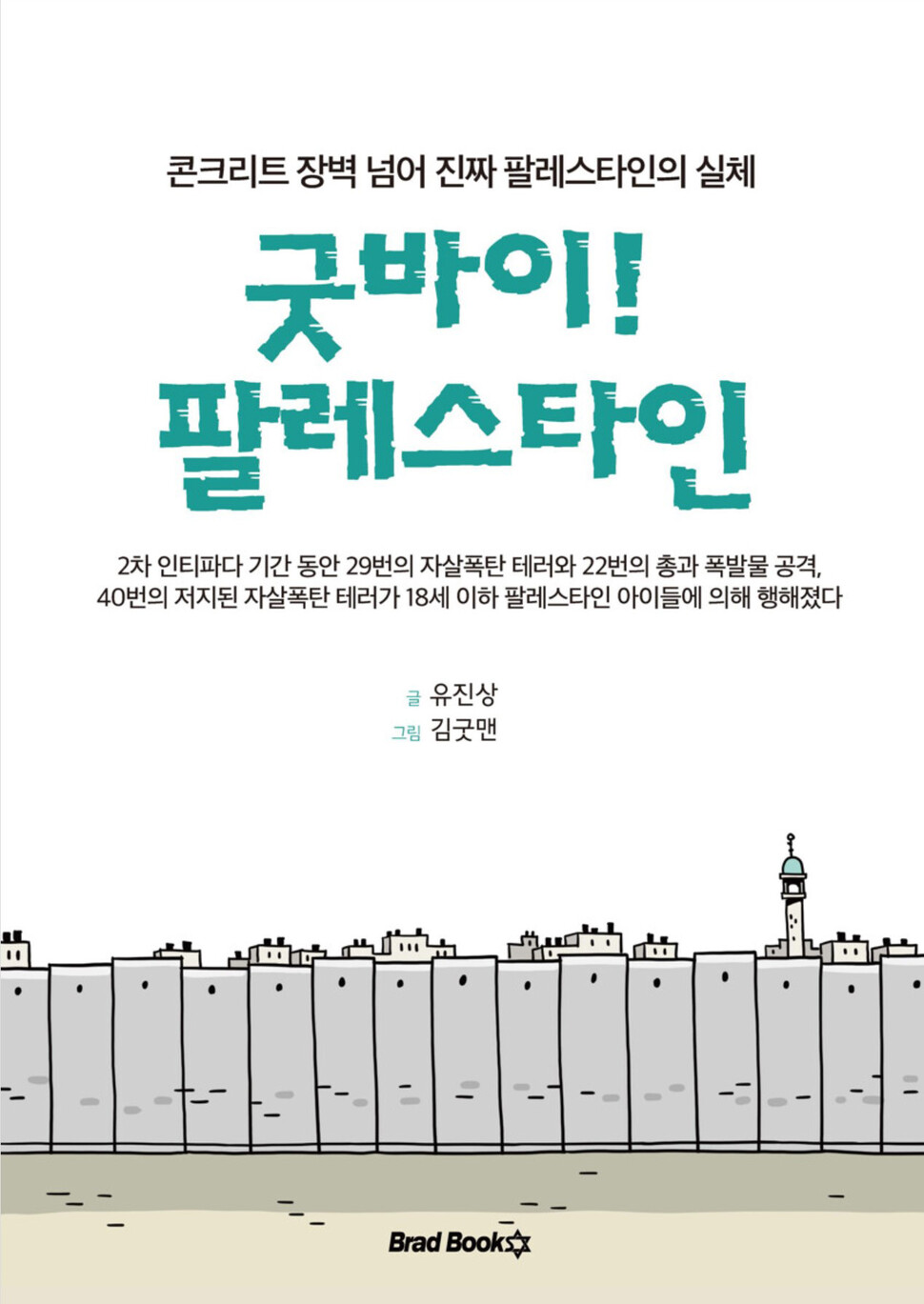☞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1989년 가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해 여름에 베를린 장벽에 갈 기회가 있었다. 베를린과 포츠담을 나누는 하펠(하벨)강 위에 놓인 글리니케 다리. 총을 멘 군인들의 경계가 삼엄했다. 하노버에서 기차를 타고 동독 지역을 가로질러 베를린으로 들어갔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거칠게 카메라를 검사하고 필름도 빼앗은 터라 상황을 더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때는, 두어달 뒤에 이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이듬해 무너진 장벽의 잔해들을 보면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베를린에 오래 살았던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낮에 지나친 군인들의 서슬 퍼런 위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분단에 대한 감상을 섞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밤엔 장벽을 오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정확하게 칼로 베어낼 수 없는 ‘경계’가 있다. 이 회색의 영역을 무어라 불러야 좋을지는 모르지만 살기 위한, 혹은 숨통을 틔우기 위한 모호한 영역이 있다. 이 모호한 영역이 커지면서 판세가 뒤집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베를린 장벽도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닐까?
같은 분단국가를 살아도, 한국엔 상대방을 가로질러 이동할 방법도 없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회색 지역도 없다. 오히려 의문이 든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분리가 70년이 넘게 흐트러짐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 <굿바이! 팔레스타인>을 봐도, 역사의 해석도, 그것의 결과인 현재도 모두 흐릿한 부분이 있다. 적과 우리 편이 분명하고 서로가 섞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
팔레스타인이 포함된 중동 지역은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을 거쳐 칼리프, 십자군, 이슬람, 오스만 튀르크, 대영제국을 거치며 수천년간 독립국가가 없던 곳이었다. 현존하는 국가들은 1920~70년대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과 아랍인들도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섞여 살던 지역이라 한 나라 안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학에는 아랍인 학생들이 다닌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대학을 함께 다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법관·장관·장군·국회의원 중에도 무슬림이 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슬라엘 국경으로 확정된 지역 안에 있던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 시민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아랍 인구 비율은 20%에 이른다. 내부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깥과의 불화를 정리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이 만화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나 주변에 의해서 억울한 이스라엘의 사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만화를 보면서, 어느 한편을 들게 되지는 않는다. 사실은 복잡하고 현실은 흐릿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해본다.
만화애호가
종이나 디지털로 출판되어 지금도 볼 수 있는 국내외 만화를 소개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