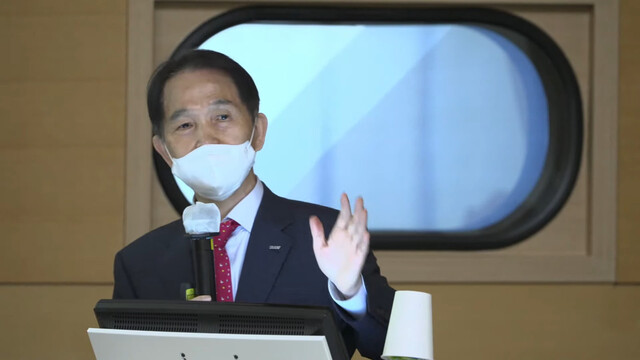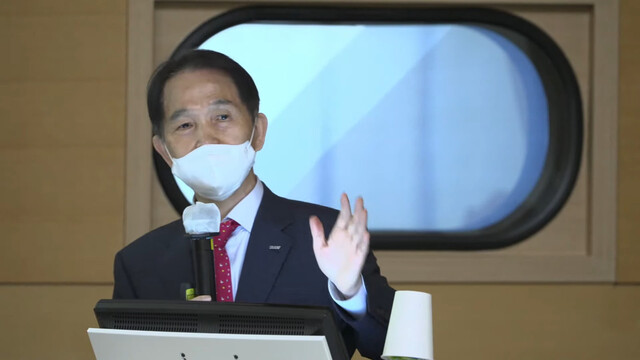“지금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품이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죠.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잡는 기업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할 겁니다.”(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산업 ‘1타 강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가들을 잇따라 초빙해 내부 강연을 열고 있다. 경쟁법 집행의 무게중심이 점차 신산업으로 옮겨가는 데 따른 대처로 풀이된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21일 공정위를 찾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던 이 총장은 지난해 총장 임기를 시작한 뒤 카이스트가 ‘포스트 인공지능’(Post 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제자로 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강연에서 이 총장은 특히 의약품과 메타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산업 모두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다른 맥락의 기술과 산업 구조에 빨리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 총장은 “2045년에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의 공정위 특강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간부회의 시간에 전문가 초빙 특강을 열고 있다. 지난달에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공정위를 찾아 각각 플랫폼 기업과 자율주행 등을 다뤘다. 신산업 따라잡기에 부쩍 열중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해 미디어콘텐츠와 플랫폼 모빌리티 등 5개 분야에 대한 집중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경쟁법 이슈의 주무대가 신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쇼핑·동영상 사업을 우대한 사건이 한 예다.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담합을 꾀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신기술에 대한 경쟁당국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의 광고 사업에 과징금 2억2000만유로(약 3000억원)를 부과하면서 “(경쟁당국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것은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