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1일 카르멘 랄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브리핑센터 디지털전환 고문이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시범해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2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쌍의 아이디(ID)·비밀번호만으로 정부 행정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면 일상이 무척 편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이미 봤듯, 초연결 사회에는 불확실한 위험도 따른다. <한겨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효율성은 높이는 디지털 전환의 전제 조건을 찾아 에스토니아·덴마크·영국·싱가포르 등 앞서 이 길을 간 나라들을 현장 취재했다.
지난 1월 말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트램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어딘가에 찍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탈린시는 2013년부터 탈린에 주소지를 두고 세금을 내는 시민 모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납세자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에스토니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자신분증을 갖고 있으니 무료 탑승 자격 인증도 간단하죠.”
지난 1~2월 <한겨레>가 둘러본 디지털정부 선진국들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정부’를 넘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월31일 탈린 외곽 국제공항에서 차로 5분 떨어진 울레미스테 지구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만난 카르멘 랄 ‘이에스토니아’(e-Estonia·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브리핑센터 디지털전환 고문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신분증(e-Identification Card)이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 플랫폼의 근간”이라고 소개했다.
■ 전자신분증 하나로 세금 환급부터 마트 적립까지
랄 고문이 에스토니아 정부 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 창에 자신의 시민번호를 입력하자 휴대전화로 네자리 숫자가 전송됐다. 이 숫자를 다시 포털에 입력하니 로그인 상태가 됐다. 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이나 핀테크 회사들의 2중 인증 로그인 시스템과 유사했다. 랄 고문은 “전자신분증 하나로 정부 서비스뿐 아니라 은행 앱과 같은 민간 서비스들에도 모두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랄 고문은 인터뷰를 하다 말고 기자 손을 이끌고 브리핑 센터 안 매점으로 향했다. “이 곳 적립·할인을 위한 회원 자격 인증도 전자신분증으로 할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매점인데도요. 브리핑센터 맞은 편에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이 있는데, 그 곳 누리집 로그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월31일 카르멘 랄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브리핑센터 디지털전환 고문이 실물 카드 형태의 전자신분증을 이용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의 할인·적립을 위한 회원 자격을 인증해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 포털에 로그인하면, ‘시민’과 ‘기업가’ 메뉴가 뜬다. 하위 메뉴는 세금 신고와 거주지 등록 등 필요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이혼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 곳에서 다 이용하고 처리할 수 있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로 못 하는 게 결혼과 이혼 두 가지였는데, 지난해 12월 비로소 결혼까지 디지털로 할 수 있게 됐죠.”
에스토니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원칙을 만들어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최대한 간소하게 설계했다. 되도록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을 뿐 아니라, 한 이용자에게 같은 정보를 여러 번 묻지 않는다는 ‘원스 온리’(한 번만) 원칙에 따라 한 부처 서비스를 이용하며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등은 다른 부처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덕분에 손떨림이 있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도 최소한의 동작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가 활발한 대신, 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들여다 보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수많은 정부 부처가 통일된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큰 원칙을 제시하고, 실행을 돕는 전담 조직도 뒀다. 덕분에 시민들은 디지털 서비스 학습에 드는 수고를 여러 번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요엘 코츠바 에스토니아 경제소통청 최고정보화책임실 서비스디자인 고문은 “공무원 입장에선 자신이 속한 부처와 다른 부처가 완전히 분리돼 있을 지 몰라도, 이용자 입장에선 수많은 정부 부처가 그냥 하나의 큰 기관일 뿐”이라며 “서비스 설계 또한 이런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간 데이터 장벽 때문에 한 이용자가 같은 정보를 계속해서 새로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큰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턱이 높지 않다보니 나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랄 고문은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5분이면 끝낼 수 있어,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소득 신고일을 ‘제2의 크리스마스’라고 여길 정도”라고 했다.
덴마크 디지털 셀프 서비스 통합 로그인 시스템 ‘밋아이디’ 앱 화면. 밋아이디 누리집 갈무리
■ 생애주기 여정 따라 화면도 맞춤으로
2014년 공공부문의 ‘종이 문서 종식’을 선언한 덴마크는 2023년 현재 혼인신고와 사망신고를 제외한 2천종 넘는 모든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디지털화했다. 예를 들어, 시민 포털 ‘보어닷디케이’(borger.dk)에서는 납세 정보나 사건 상태 등을 확인하는 ‘마이오버뷰’, 통합 알림 서비스 ‘디지털 포스트’, 출생·교육·결혼·이혼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덴마크 또한 에스토니아와 유사하게 통합 로그인 시스템 ‘밋아이디’(MitID) 하나로 정부 서비스와 은행 등 민간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2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중심부 크리스티안스하운 지구에 위치한 민관협력 기구 디지털허브덴마크 사무실에서 만난 미켈 프리히 대표는 ‘디지털 생애주기 여정’(digital life journey)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덴마크는 지방 분권화 국가라 중앙정부와 5개 광역자치단체, 98개 지방정부 서비스가 분야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각자의 생애주기 여정(life journey)마다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업무가 어느 기관 관할인지 개인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혼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셀프 서비스’라는 표현도 쓴다. 시민들이 셀프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려면, 정부가 반드시 복잡한 행정 언어를 시민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2일 미켈 프리히 디지털허브덴마크 대표단장이 덴마크의 디지털 셀프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싱글 사인 인’(Single sign-in)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 거버먼트’ 시스템을 2011년부터 2년여에 걸쳐 구축했다. 현재 24개 정부 부처와 공기업, 공공기관 400여곳의 누리집을 ‘거브닷유케이’(Gov.uk)라는 통합 도메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이 유려하진 않지만, 누리집을 만들 때 쓰는 기능 중 가장 간단한 편에 속하는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시민들이 각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탐색해 찾아가도록 설계했다.
지난달 7일 영국 런던 화이트채플 지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크리스틴 벨라미 지디에스(GDS·디지털정부서비스청) 디렉터는 “복잡한 정책을 다루는 시스템일수록 정확하고 부지런하게 이용자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린·코펜하겐·런던/글·사진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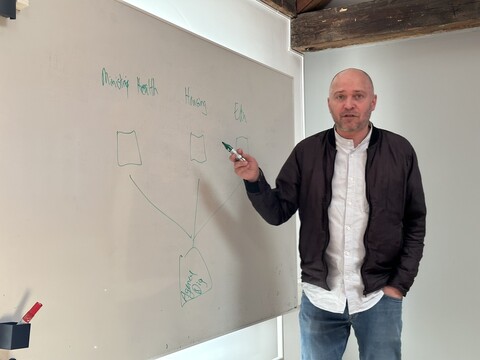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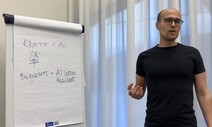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