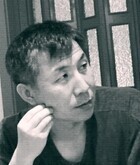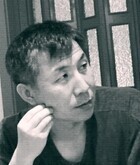최고위험관리책임자 제도를 제안한 영국 장기회복력센터(Center for Long-Term Resilience) 보고서 표지.
[뉴노멀-미래] 곽노필 ㅣ 콘텐츠기획팀 선임기자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와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번 여름 ‘최고열관리책임자’(CHO)라는 생소한 이름의 직책을 잇따라 신설했다. 이름 그대로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는 게 이들의 임무다. 예컨대 건물과 도로의 햇빛 반사율을 높이고 그늘을 확장하며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이다. 마이애미는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도시 가운데 하나다. 아테네는 유럽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통한다.
도시는 면적으론 육지의 3%에 불과하지만 세계 인구의 55%를 수용하고 있다. 30년 후엔 세계인 3명 중 2명이 도시에 살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도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2를 소비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3을 배출한다. 세계 문제의 진원지가 곧 도시다. 한여름의 열섬 현상에서 보듯, 인구 밀집은 도시의 삶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0여년 전 도시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무렵, 세계 주요 도시들 사이에 스마트도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도시의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의 효율과 친환경성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시장들은 세계도시정상회의까지 열며 아이디어들을 공유했지만, 복잡해진 도시에서 시장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벅차다. 세태를 반영한 직책들이 생겨났다. 2015년 애틀랜타는 최고자전거책임자를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이 사람의 임무는 시민들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한밤의 도시를 관리할 심야시장 자리를 만들었다. 최고데이터책임자, 최고혁신책임자, 최고시민책임자도 등장했다.
‘최고○○○책임자’라는 조직 운영 방식의 뿌리는 세태 변화에 민감한 기업이다. 최고경영자라는 단일 정점 체제로 출발한 기업은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재무, 기술, 마케팅, 전략, 고객 등 분야별 책임 체제로 분화해 갔다. 그 최신 트렌드 중 하나가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등장이다.
최초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는 1990년대 초반 나왔지만 기업들이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는 당장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방만하고 일탈적인 자산 운용 결과였다.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미국에는 10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최고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다고 한다.
사회는 기업보다 훨씬 더 복잡다양한 위험 환경에 노출돼 있다. 방만한 자산 운영이 기업의 위기를 불렀듯, 자원과 기술의 방만한 이용이 사회 공동체를 위험에 밀어넣고 있다. 스웨덴 글로벌챌린지재단이 지구적 급변 사태를 부를 위험 요인으로 꼽은 10가지 가운데 8가지가 인간이 유발하는 것이었다. 핵전쟁, 기후변화, 생태계 붕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 등 무시무시하지만 어느새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위험을 안고 사는 세상이 된 모양이다. 게다가 코로나19에서 보듯 세계화는 한 곳의 위험이 곧 전 세계의 위험인 환경을 만들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국가 운영에도 ‘최고위험관리책임자’를 둬야 할 때가 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부처마다 위험관리팀을 두고, 정부 차원의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며, 독립적으로 위험을 평가할 연구소를 두자는 게 보고서 제안의 골자다. 보고서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당면 과제로 꼽았지만 그것 말고도 시급히 다뤄야 할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세상이 됐다. 독일에서 폭우 사망자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데는 기상 경보를 신속히 공유해 대응하는 네트워크가 없었던 탓이 컸다고 한다. 문명은 이제 모든 세상사를 위험 프리즘으로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할 국면에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다.
nop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