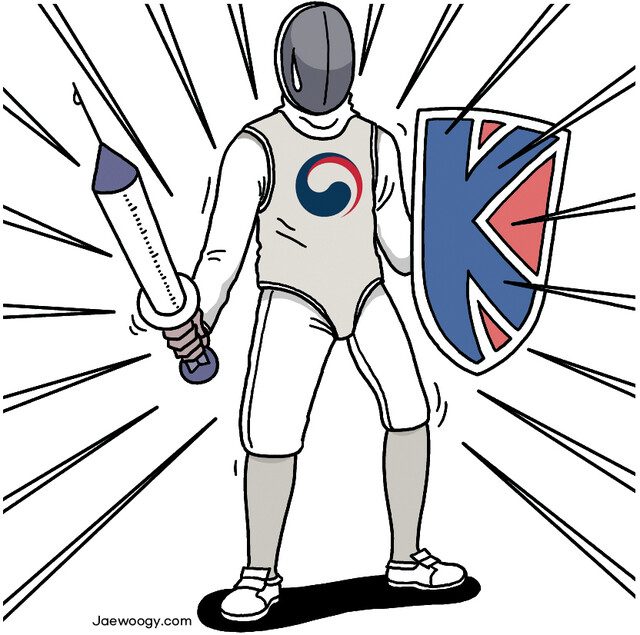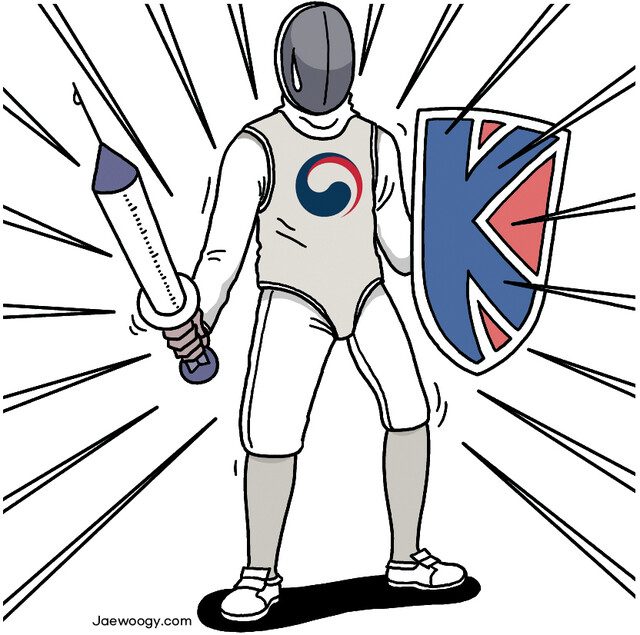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케이(K) 방역’은 ‘3T’ 전략을 근간으로 한다. 3T는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를 뜻한다. 광범위한 검사와 역학조사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치료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전략은 코로나19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기에 가능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위험도와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1~4등급으로 분류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를 비롯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17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염되면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 치료와 조사, 격리 등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이와 같은 ‘등급별 분류 체계’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국내 유행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시점이 참 공교로웠다.
‘3T’ 전략은 델타 유행 때까지는 비교적 잘 작동했다. 한국이 ‘봉쇄’ 없이 유행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로 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하루에 수십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다 보니, 역학조사(추적)와 음압병실 격리치료가 불가능해졌다. ‘3T’의 두 축이 무너진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음압병실 격리가 원칙이다 보니, 중환자 병상은 늘 간당간당했다. 응급 환자가 확진자라는 이유로 병상을 못 구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일반 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게 지침을 완화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일선 병원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등급을 하향하면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복원이 가능해지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동선 분리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의료진과 환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 끝까지 어렵다.
이종규 논설위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