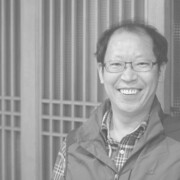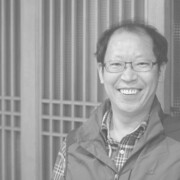[똑똑! 한국사회] 이광이 l 잡글 쓰는 작가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 뱅글뱅글 은행잎이 돌 때 나는 머리칼을 쓸어 넘기곤 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것들을 정돈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빗질을 하면 그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비단결처럼 쓸려나가던 부드러운 감촉들, 그 아스라한 촉감들.
어느 해부터인가 한올 한올, 날아가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머리가 나쁜데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니, 숲은 점점 메마르고 사막화되기 시작했다. 무등산에 오르면 서석대 못미처 민둥의 고갯마루가 나오는데 이름이 ‘중머리재’(僧頭峯)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주변머리가 절반은 남아 통상 ‘오할스님’으로 불린다. 한자로는 ‘독’(禿)을 쓴다. 독산은 민둥산이다.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 꺾인 모가지 부위에는 터럭이 없는 데서 취했다고 한다.
국내 사례로는 5공의 전아무개씨가 대표적이고, 해외 사례로 영국의 처칠과 프랑스의 드골,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가 매우 특이하다.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비대머리인 반면 혁명을 이끈 레닌은 대머리였다. 스탈린과 흐루쇼프(대)…체르넨코와 고르바초프(대), 옐친과 푸틴(대)에 이르기까지, 여야처럼 번갈아 집권하는 전통이 100년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다.
내가 가르마를 잃고 살아가던 중년의 어느 날, 어린이집에 다니던 5살 늦둥이 여식의 ‘재롱잔치’가 열렸다. 여러 가족들로 문예회관 객석은 빽빽이 들어찼고, 우리 내외는 장모님을 모시고 참석했다. 딸은 뒤쪽 군무 대열에 섞여 있던 반면에 주인공 아이의 춤사위는 감탄할 만한 것이어서, 역시 예체능은 타고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인근 식당에 사람들이 몰렸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고기가 맛있다”면서 우리 테이블에 주문을 받으러 오더니, 한마디 덧붙인다. “여기는 아빠가 안 오셨네!” 아빠 앞에서 아빠의 부재를 얘기하는 그녀의 눈빛에 일말의 의심도 없다. 관공서 복도에서 타인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심지어 ‘어르신’ 소리도 들어보았지만, 이때의 충격은 컸다.
이튿날 서울시청 근처 유명한 가발회사를 찾았다. 이덕화 사진 옆에 ‘10년 젊음 보장’이란 문구가 씌어 있다. 가발은 비 맞거나 며칠 쓰면 빨아야 하기 때문에 대개 ‘원플러스원’으로 한다. 나는 인모로, 신상으로 한쌍을 맞췄다. 그것을 쓰고 나오던 날, 햇살이 눈부시던 날, 이마를 간지럽히는 그 촉감을 잊을 수가 없다. 언젠가 술집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데 뒤에서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불그레한 얼굴의 그도 쓰고 있다. “아, 그쪽도 전혀 몰라보겠는데요” 했더니 그가 좋아한다. 우리끼리는 이렇듯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에 빗대, ‘흑모백모론’(黑毛白毛論)을 설하기도 한다. 희든 검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 날 열심히 쓰고 다녔다. 몰라보게 젊어졌다거나, 동생이 온 줄 알았다는 덕담도 받고. 그러나 잠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진짜 젊어진 것일까? 거울 앞 내 모습이 낯설고 불편하다. 가발 밖으로 덧자란 머리칼을 수시로 다듬어야 하고, 운동하고 나면 가르마가 틀어져 있기도 했다. 아무도 내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저 흐를 뿐, 여인의 눈길은 머물지 않았고, “다음 역에서 내려요” 하고 넌지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마침내 벗었다. 불교에서 머리칼을 심검(尋劍)으로 베어버리듯, 나는 본래의 나로, 오할스님으로 돌아왔다. 벗고 보니 그것은 번뇌였다.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달라거나, ‘모(毛)가 부족한데요’ 하는 말들은 초추의 양광처럼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나는 용기를 내어 ‘모(毛)밍아웃’을 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걷히는 그날까지 ‘헤어소수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밤에도 바람이 두피에 직접 스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