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시인
어쩌다 보니 올해로 12년째 활자 밥을 먹고 있다. 그사이 잡지사를 서너 군데 거쳤고 출판사로는 지금 다니는 곳이 두번째이니 진득하다는 소리는 못 듣겠으나 터진 입의 소유자인 내가 항변을 하자면 이런 것이다. 아, 일하려고 해도 폭삭 망해버린 것을 난들 어쩌라고요.
직장생활 첫날부터 시작된 아빠의 모닝콜은 지금껏 계속이다. 아침잠이 많은 나를 깨우기 위한 아빠의 전화 스타일은 스토커의 집요함과 꽤나 닮았다. 줄곧 부드럽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일정 톤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전화벨을 울릴 줄 안다. 일어나. 일어났어. 자는데 뭘. 깼다니까. 지각하면 못써. 누군 하고 싶나. 쫓겨나면 어쩌려고. 내쫓으라지. 씻어야지. 욕실이야. 물소리 안 들리는데. 변기에 앉아 있잖아. 전화기 대봐. 에이 아빠!
삼년 전 아빠는 삼십년 넘게 다닌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말이 쉬워 삼십년이지 그간 지각과 휴가와 결근 한번 안 했다는 기록 아닌 기록을 생각해보면 나 같은 직장인에게 아빠는 ‘사람’이 아닌 ‘기계’ 그 자체다. 이십대 초반부터 홀아버지를 모셨다. 외아들인데다 아래로 공부시킬 여동생을 넷이나 뒀다. 서른 넘어 간신히 결혼을 했다. 딸만 내리 넷을 둔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눈칫밥 먹는 월급쟁이 아니니 속 편하겠다는 내 말에 아빠가 말했다. 나 이제 어디 가서 뭐 하냐.
정년퇴직을 하던 그날 아빠의 귀가가 늦었다. 전화기도 내내 꺼진 채였다. 앞으로 누구든 나 무시하고 그러면 월미도 바다에 확! 으름장을 놓곤 하던 아빠는 해가 뉘엿뉘엿 저문 뒤에야 돌아왔다. 야구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야밤에 라이방 선글라스를 낀 아빠의 얼굴은 온통 반창고투성이인데다 선풍기아줌마도 아니면서 넙데데하게 퉁퉁 부어 있었다. 나 눈 밑 지방 좀 뺐어, 의사가 내친김에 점도 다 빼라는 거야, 점 세다가 자버렸더니 끝났더라, 나 앞으로 두 달은 집 밖으로 못 나가, 자외선 쬐면 안 된대, 그러니까 다들 나 지겨워하지 마, 알았지?
그로부터 두 달 동안 아빠는 회사를 다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 9시 뉴스 보다 잠들기를 반복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요모조모 얼굴을 찍어 저장하고는 그걸 꺼내보면서 점 뺀 자리에 딱지 생겼다, 딱지 떨어졌다, 이런 식의 기록을 업무일지처럼 적어나갔다. 두 달이 지나자마자 아빠는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매일같이 러닝머신 위에서 한두 시간씩 걷거나 뛰었다. 무릎이 나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이번에는 매일같이 골프채를 휘둘렀다. 어깨가 나갔다. 수술이 불가피했다.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면서 투수들이나 한다는 정교하고도 값비싼 수술 끝에 깁스한 팔로 누워 아빠가 말했다. 나 이제 어디 가서 뭐 하냐고.
심심할 때 고스톱이나 치라고 컴퓨터를 사줬더니 대견하게도 아빠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작은 딸들에게 ‘흑마늘의 놀라운 효능’, ‘여자 연예인 20인의 뽀얀 피부 비법’, ‘대중 앞에서 안 떠는 법’ ‘와인 옷에 튀어도 걱정 없다’ 등 일상의 팁 같은 것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게 은근 재밌는 거다. 그 격려에 날개를 달았는지 아빠는 틈날 때마다 슬그머니 방에 들어간다. 컴퓨터를 켠다. 한글 파일을 연다. 그리고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 라는 얘기다.
오늘 아빠가 보낸 이메일의 제목은 이러했다. 나는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나이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우는 거라면 칠순을 바라보는 아빠라도 생의 나이는 고작해야 이십대 열혈청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만국의 내 젊은 아빠들이여, 부디 단결하라!
김민정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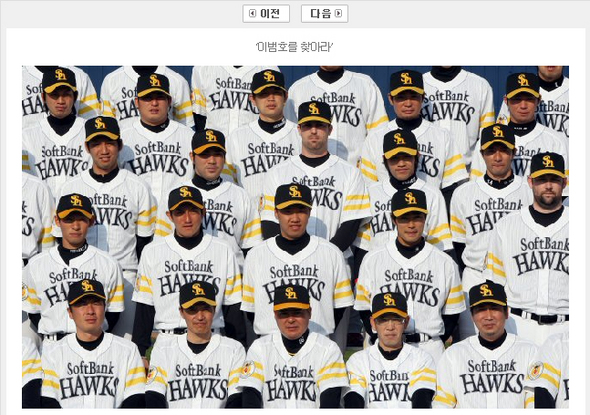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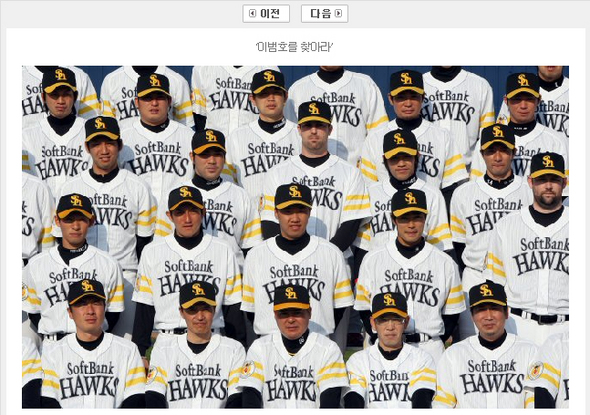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사설] ‘특검 찬성’ 의원 겁박 권성동, ‘백골단 비호’ 김민전 [사설] ‘특검 찬성’ 의원 겁박 권성동, ‘백골단 비호’ 김민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9/202501095035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