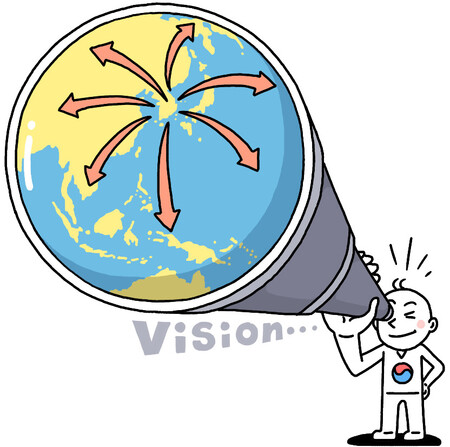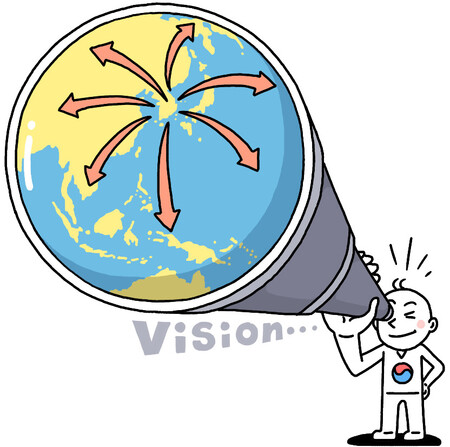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미래비전이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7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미래학회가 함께 만든 <서기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조사연구>를 그 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초점은 과학기술이었다. 중장기 미래전략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다. 1989년에 구성된 ‘21세기위원회’가 그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열린시장으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내놓았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것인데, 이때부터 비전 작업은 경제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2011년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가 있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국가 미래비전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의 연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재원까지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랍 속 보고서’로 그쳤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비전 작업은 계속됐다. 2012년과 2015년 각각 발표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방향>이다. 국가 미래비전 작업은 이처럼 역대 정부마다 필수목록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얼마 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다. 6개월 동안 166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2045년 1인당 6만불의 혁신적 포용국가 완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22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문제는 실현이다. 어렵사리 마련한 미래비전 보고서가 정권의 장밋빛 레토릭이나 한낱 장식품으로 소비된 뒤 먼지처럼 사라졌던 게 과거의 역사였다. 이런 전철을 더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미래비전도 완결판일 수 없다. 미래비전의 쓸모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이슈를 잘 담아내 공론화하는 일이다. 궁극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핵심 욕구를 풀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