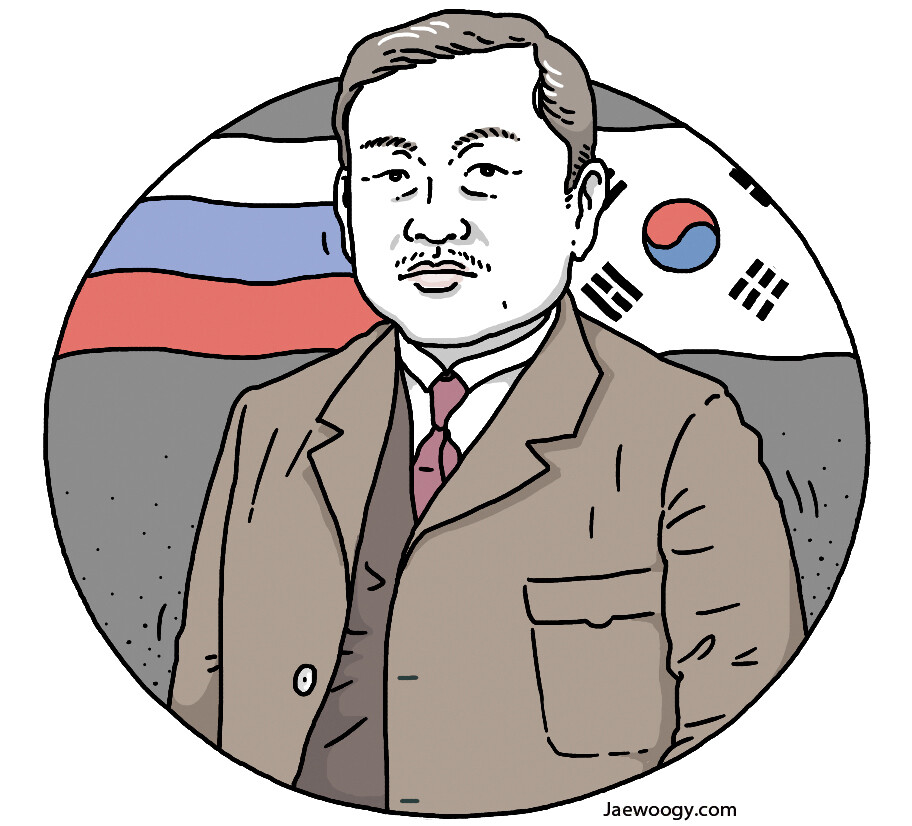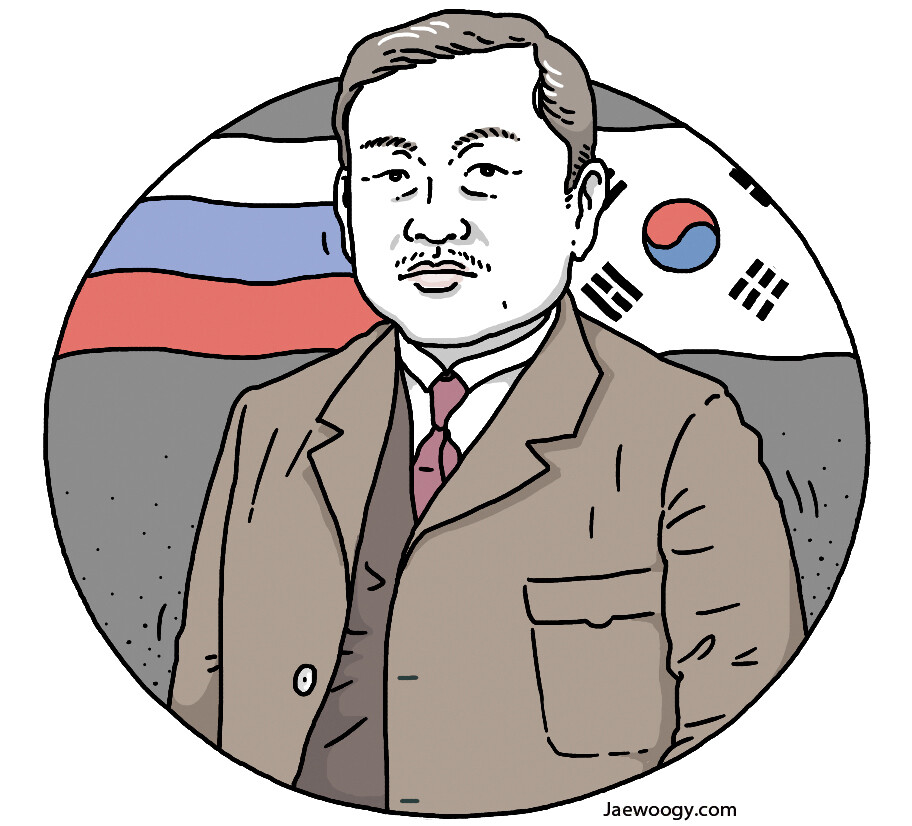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은 1860년 함경북도 최북단 경원에서 태어났다. 최 선생 아버지는 노비였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1869년 7월 홍수, 장티푸스 등으로 ‘기사흉년’이 닥치자, 최 선생 가족은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했다.
그는 10대 때 6년 동안 러시아 상선을 타고 세상을 돌며 새로운 문물을 배웠다.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등도 두루 익혔다. 연해주로 돌아온 최 선생은 러시아어 통역으로 일했다. 당시 동포들은 러시아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다. 최 선생은 억울한 동포들을 도왔다. 연해주 동포들은 집집마다 최 선생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동포에게 난로처럼 따뜻한 그를 페치카(난로)로 불렀다.
최 선생은 군납 회사를 차려 큰돈을 벌었다. 그는 러시아 한인 마을에 소학교 32개를 세워 동포 교육에 힘썼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 선생은 의병 군자금을 대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상하이임시정부 재무총장에도 발탁됐다.
그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1879~1910) 의사를 도왔다. 안 의사가 이토를 쏜 권총을 마련해줬다. 거사를 앞두고 안 의사는 최 선생 집에서 사격 연습을 했다. 연해주에서 최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왕족 출신 한 독립운동가는 최 선생을 노비의 아들이라고 무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나섰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조국이지만, 최 선생은 ‘국가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생겨날 때 두 어깨에 메고 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일본군이 1920년 4월4, 5일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등 동포들이 사는 지역을 습격했다. 당시 우수리스크에서 머물던 최 선생은 피신하라는 가족들에게 “내가 떠나서 집에 없으면 일본군들이 어머니와 너희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며 고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군에 붙잡힌 그는 4월7일 순국했다.
공산주의 본거지 소련(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한 최 선생은 남북 분단 이후 남쪽 사회에선 잊혔다가 최근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7일은 최 선생 순국 100주년이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는 6월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혁철 논설위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