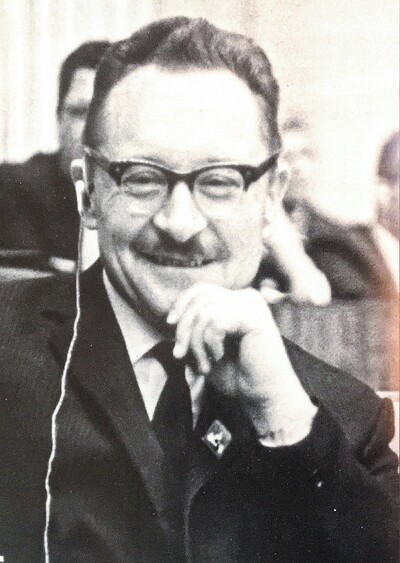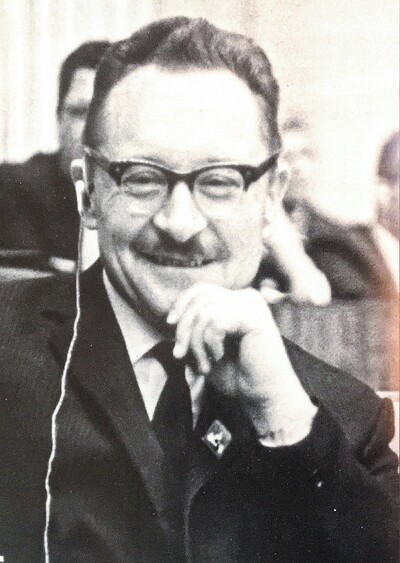빅토르 즈다노프(1914~1987). 위키미디어 코먼스
곽노필 ㅣ 콘텐츠기획팀 선임기자
빅토르 즈다노프(1914~1987).
지난해 말 ‘생명의미래연구소’라는 이름의 미국 민간단체로부터 ‘세상을 구한 이름없는 영웅’에게 주는 상을 받은 옛 소련 보건부 차관 이름이다. 선정 이유는 천연두 박멸에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다.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매캐스킬은 그를 가리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천연두 박멸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단 한 사람”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천연두는 40여년 전 인류가 유일하게 완전 퇴치에 성공한 전염병이다. 한 해에 수백만명씩 20세기에만 수억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수천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두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1960년대의 세계적인 박멸 운동이다. 그 운동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 즈다노프다. 바이러스학자 출신인 그는 1958년 소련 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했다. 미-소 냉전 와중에서 소련이 총회에 나타난 건 10년 만이었다. 그는 소련의 성공 사례를 들어 천연두를 10년 안에 뿌리 뽑을 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의한 박멸 운동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군불 자금으로 소련이 2500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으로 고개를 갸웃하는 세계 보건 책임자들을 설득했다. 불과 2표 차이로 그의 제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극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2표는 결국 천연두의 운명을 갈랐다. 소련이 만든 판에 미국이 적극 뛰어들면서 박멸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동서 두 진영의 지도부가 호응한 결과다. 천연두 박멸 운동은 2억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공포심은 천연두에 못잖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가 그래서 코로나와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다행히 인류는 1년 만에 백신이란 무기를 얻었다. 세계 과학자들의 노력과 협력 덕분이다. 과학자들은 며칠 만에 바이러스 게놈을 파악했고, 한달도 안 돼 백신 설계를 마쳤다. 지난해에만 20만편이 넘는 논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무기가 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전략, 전술을 짜는 게 정치의 임무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한테선 천연두 박멸 운동 때나 과학계가 보여준 협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지도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했고, 일부 나라는 인구의 몇배나 되는 백신을 입도선매했다. 이대로라면 2023년이나 돼야 백신 혜택이 개발도상국에 돌아갈 판이라고 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은 가짜정보를 양산하고 불신을 키웠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장 먼저 백신을 내놓을 수 있었던 덴 백신을 먼저 확보하려는 선진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 그 지도자들은 기업과 국민을 설득해 백신 개발의 수익과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 촉구하듯, 세계에 생산 기술을 나누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필요 이상으로 확보한 백신을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집단면역이 앞당겨져 세계 경제가 정상을 되찾게 되면, 사실 그 과실은 시장을 움켜쥔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가진 걸 포기한 것에 찬사가 쏟아지고, 이는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엔 이타적 행위가 곧 이기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전염병 출현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확산은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도 초기에 국제사회가 촘촘히 협력 대응했다면 지금의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연두 박멸의 경험은 과학에 기반한 협력과 담대한 목표의 힘을 보여줬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다. 그 교훈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같은 당면한 인류 공통의 위기 대응에도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nop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