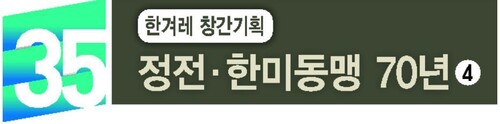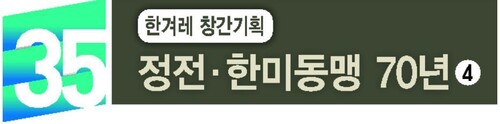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을 등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연하게, 미국과 절반 친해졌으면 중국도 눈치를 봐가면서 (외교)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60대 여성 ㄱ씨)
70년 한-미 동맹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새로운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라는 이념적 노선을 따라 한-미 관계에 더 밀착하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답은 달랐다.
<한겨레>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업체 휴먼앤데이터에 의뢰해 20∼70대 남녀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집단 심층면접(FGI)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미국에의 의존, 편중이 아닌 ‘균형감’을 이야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심층면접은 20~30대(10명), 40~50대(7명), 60~70대(6명) 세 그룹으로 분류해 5월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눠서 진행했다.
세 그룹 중 친미 정서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60∼70대 중엔 반중 감정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었지만, 이들 6명 중에서도 대부분인 5명은 “중국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는 혈맹입니다. 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라면서도 “한-미 동맹을 어느 정도 진전시키면 다음엔 중국과 잘해야지요. 싫어하는 것과 먹고사는 건 달라요. 우리 교역국인데,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70대 남성 ㄱ씨)
또 다른 70대 남성 ㄴ씨는 “중국은 우리를 만만한 소국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중국은) 자기네 잘못은 인정 안 해요. 잘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한국과 협력해야 할 국가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꼽기도 했다.
인터뷰 집단 중 가장 많은 수였던 20∼30대 10명 중엔 7명이, 40∼50대(7명)는 만장일치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말했다.
“중국 주도든, 미국 주도든 큰 물결 속 배가 양쪽 바람에서 균형을 잡고 가듯 생존을 위한 균형이 한-미 관계에서도 바람직해요.”(50대 남성 ㄱ씨)
“교수님 추천으로 얼마 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반한 정서가 많이 늘고 있대요.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해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것 말고도 일반인 시선에서도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한 나라에만 의존해선 그 나라가 끝까지 잘된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생각해요.”(20대 남성 ㄱ씨)
반면 30대 여성 ㄱ씨는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국은 폐쇄적이고,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교역도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30대 남성 ㄱ씨는 “2030의 반중 성향은 강하다. 동북공정이나 사드 문제 등… 중국과 경제적 협력은 필요하지만 견제는 되어야 한다”며 “일본도 노골적으로 미국과 결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중 사이 균형이 한국의 외교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희도 대중 관계를 좀 더 잘 풀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실리주의를 추구했고…. 백성들이 먹고살 수 있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잖아요.”(40대 여성 ㄱ씨) “연인관계도 완전히 내 사람이 되면 신경 써줄 필요가 없는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달라지잖아요.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도 꼭 필요한 나라이니 외줄타기를 하면서 두루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죠.”(40대 남성 ㄱ씨)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