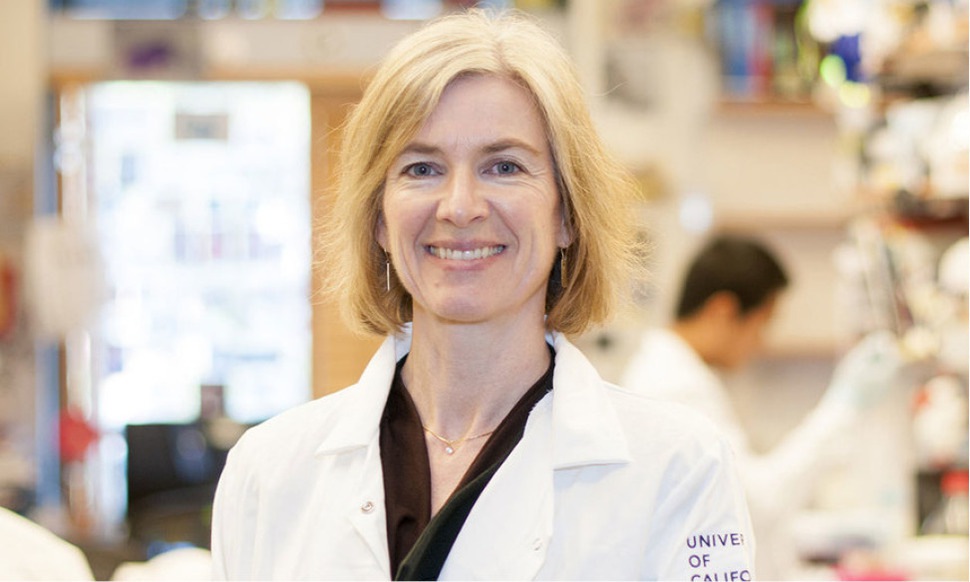【한빛 2호기에서 시작된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상의 원인을 놓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논란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건설 방식에서 야기된 문제라는 잠정 진단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근본 원인은 밝혀질까?】
영화 <판도라>는 지은 지 40년이 다 돼가는 ‘한별1호기’가 규모 6.1의 지진으로 냉각재 밸브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재 상실사고가 일어나면서 결국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 원자로 건물의 압력은 1380킬로헥토파스칼(㎪)까지 치솟는다. 101㎪이 1기압이니, 13기압이 넘는다. 현실과 먼 상황 설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별1호기는 폭발 전까지 원전의 방호벽이 완벽하게 밀폐돼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원전에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한 5중 방호벽이 설치돼 있다. 1차 방호벽은 핵연료 자체이다. 핵연료는 압축된 산화 우라늄 금속(펠릿)이어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방사성 물질은 펠릿 자체에 갇혀 있게 된다. 이 펠릿을 감싸고 있는 지르코늄 합금의 피복관 곧 연료봉이 2차 방호벽이다. 핵연료봉은 25㎝ 두께 강철로 된 원자로 용기(3차) 안에 들어 있다. 원자로 용기가 새거나 냉각재가 배관에서 빠져나와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려면 격납건물 내벽에 갑옷처럼 둘러싼 6㎜의 철판(라이너플레이트·CLP·4차)과 원통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1.2m 두께의 외벽(5차)을 뚫고 나와야 한다.
완벽한 밀폐를 보여준 영화 속 격납건물과 달리 현실에서는 4차 방호벽인 라이너플레이트 철판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벌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해 6월28일 한빛2호기 정기점검 과정에 라이너플레이트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수원 쪽은 애초 한울3호기의 핵연료 이송관 부근 라이너플레이트에서 앞쪽 도장이 벗겨져 침투한 수분 때문에 부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정기점검 기간이 돌아온 한빛2호기를 검사해보니, 핵연료 이송관 쪽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엉뚱하게도 라이너플레이트 가장 상단에서 철판이 완전히 뚫린 부위들이 발견된 것이다.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원통형 구조물 안쪽에는 높이 3m, 길이 10m, 두께 6㎜의 강판이 한 단에 12개씩 모두 13단 높이로 부착돼 있다. 원통형 위 돔에는 또다른 라이너플레이트들이 부착돼 있다.
한빛2호기 점검 결과 맨 윗단 12개 판에서 모두 135곳에 지름 2㎜짜리 관통 부위가 발견됐다. 강판은 콘크리트를 타설해 부착되면 수소이온농도(pH)가 12~14에 이를 정도로 알칼리 상태여서 부식하지 않는다. 강판에 부식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분이나 염소 등이 침투해 pH를 떨어뜨려 부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 원자로 격납건물 위쪽의 돔에 부착하려던 라이너플레이트가 낙하한 사고에 주목했다. 사고로 16개월가량 상단의 철판들이 대기에 노출돼 수분 등이 침투했다는 추정이었다.
그러나 ‘낙하사고 가설’은 지난해 11월 한빛1호기에서도 철판 부식 현상이 발견되면서 깨졌다. 한빛1호기에서는 12개 판에서 50곳의 부식이 발견됐다. 이들 부위는 철판 앞쪽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부착된 안쪽(배면)에서부터 부식이 일어나 맨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곳이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야 확인됐다. 한빛1호기에서는 한빛2호기와는 달리 관통 부위는 없었지만 일부 부위는 두께가 2.53㎜에 이를 정도로 부식이 많이 진행됐다. 이번에는 ‘해풍 가설’이 등장했다. 한빛2호기와 유사하게 바닷가 방향에 부식이 집중된 것을 근거로 해풍에 의한 염분 침투가 원인이라는 추정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도 곧 깨졌다.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됐지만 그 위치가 바닷가 방향이 아니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이 내놓은 세번째 가설은 ‘건설방식에 따른 하자’였다. 지난달 17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배변부식 관련 중간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이 상정됐다. 내용은 격납건물 원통형 구조물 맨 위쪽은 돔을 만들기 전까지 상당 기간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고 노출돼 있어 상단의 라이너플레이트에 바다 쪽에서 날아온 염분이 달라붙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현재까지 진행된 8기의 원전 가운데 부식이 발견된 4곳의 노형이 모두 미국 웨스팅하우스(WH)와 프랑스 프라마톰(FR) 것이고, 부식이 발견 안 된 4곳은 노형이 표준형(OPR)이라는 데 근거한다. 실제 표준형은 돔을 만들기 전이라도 원통형 구조물 맨 위쪽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을 써 라이너플레이트가 장기간 대기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 가설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여부는 올해 말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정기점검이 잡혀 있는 원전은 모두 7기(진행중인 원전 포함)로, 이 가운데 고리4호기는 웨스팅하우스, 한울2호기는 프라마톰 노형이고 나머지는 표준형 노형이다. 고리4호기와 한울2호기에서 부식이 발견되고 나머지 원전에서 부식이 발견되지 않으면 ‘건설방식에 따른 하자’ 가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국 부식 사례는 주로 이물질 원인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은 “원전을 건설할 때 라이너플레이트는 거푸집 구실을 한다. 염분이 스며들었다고 해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골고루 섞여 들어가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시공할 때 세척도 하기에 염분이 남아 부식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발생한 부식 사례들은 불순물 등이 원인이었다. 원전 4기에서 300여곳의 부식이 발생한 것은 단일 원인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스웨덴 등에서는 작업용 장갑이나 목재 조각, 작업도구 등이 원전 건설 때 끼어들어가 썩는 과정에 공극과 수분이 생겨 부식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실제로 한빛1호기의 경우 목재 조각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부식 부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성욱 지반정보연구소(지아이) 대표도 “처음 만들 때 소금이나 물이 들어가서는 배면 부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철판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격납건물의 기밀이 잘 유지되는지 실험하는 종합 누설률 실험(ILRT)이 이상 없이 나온 점도 수수께끼다. 종합 누설률 실험은 평소 0.9기압 정도로 유지되는 격납건물을 3.5기압까지 압력을 늘려 24시간 동안 압력에 변화가 없는지로 검사한다. 이때 격납건물은 30㎝가량 부푼다. 한병섭 소장은 “시험절차가 잘못됐거나, 라이너플레이트가 없어도 기밀이 유지된다는 얘기가 된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시험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또 있다. 고리3호기에서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라이너플레이트의 최소 요구 두께에 못 미치는 판이 10개나 됐다. 라이너플레이트는 두께가 6㎜이지만 10% 정도의 여유도를 주어 최소 요구 두께가 5.4㎜이다. 그런데 고리3호기 10개판 35곳에서 최소 두께가 5.3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 쪽은 “고리3호기 제작 당시 허용 오차가 0.85㎜로 돼 있어 다른 원전에 비해 얇은 판을 사용한 것 같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인포그래픽 최광일 기자
dido@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