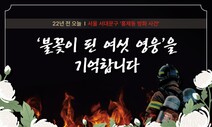1970년 11월13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외치며 분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 부족을 경제개발로 메우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8년 5월1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 소자 된 도리로써 아픈 곳을 알려 드립니다 .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십시오 .”
전태일이 당시 대통령 박정희에게 보내는 편지. 자료출처 전태일재단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써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중략 )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 (중략 )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중략 )
평화시장 등에 난립한 소규모 섬유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좁은 공간에서 일해야 했다. 사진은 1960년대 다락방의 모습. 도서출판 <이매진> 제공.
전태일이 당시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무 환경과 임금 문제 등을 조사한 뒤 정리한 메모. 자료출처 전태일재단
“1달 920시간중 372시간 휴일은 매달 첫주일과 삼주일 2일 . 국제 근로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임 .”
“평화시장 종업원 중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각종 환자임 . 특히 신경성 위장병 , 신경통 , 루마티스가 대부분임 .”
“공임은 우리나라에서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없음 . 경영주들은 서로 경쟁을 직공들의 공임에서 함 . 하루에 15시간을 작업하고도 1개월 급료가 10000원밖에 안됨 .”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진정서 형식의 편지. 자료출처 전태일재단(왼쪽)와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빈민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가 1973년 7월에 찍은 평화시장 봉제공장 모습.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메마른 인정을 합리화시키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 형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 당하고 오직 고삐에 메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
“합법적이 아닌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알지를 못합니다 .”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은 (중략 )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략 ) 이 모든 문제를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전태일이 1970년 3월 7일 쓴 일기. 자료출처 전태일재단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을 --제품 계통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
누구와 --제품 계통에 종사하는 어린 기능공들과
언제 --1970년 . 음력 6월달 이전에
어디서 -- 서울평화시장에서
이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
▲ 1969년 4월달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이 문제는 1968년 12월달에 착상한 것이다 . 나 자신이 꼭 해야 될 문제로 생각했다 .
▲그러나 1969년 서울특별시 근로감독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나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
-1970년 3월 7일 일기 -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삶을 그린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이 당시 평화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돌렸던 설문지. 자료출처 전태일재단(왼쪽)와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한겨레>자료사진
1970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
전태일의 일기장(왼쪽)과 그가 남긴 메모. 자료출처 전태일재단
참고문헌
전태일 재단 공식 누리집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 전태일
월간 ' 박정희 ' 창간특집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이병천
연재역사 속 오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포토]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포토]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7/1113/00501562_20171113.JPG)
![[나는 역사다] 노동열사 전태일에게 ‘정의’ 가르친 어머니 [나는 역사다] 노동열사 전태일에게 ‘정의’ 가르친 어머니](https://img.hani.co.kr/imgdb/resize/2017/1112/53_1510483608_00501866_201711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