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의 장계성당 주임신부 시절인 1985년 버려진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필자는 86년 4월 작은 자매의 집을 열어 2007년 은퇴할 때까지 동고동락했다.(왼쪽 사진) 87년 12월 대통령선거 유세차 장계에 내려온 김대중 후보(왼쪽)가 작은 자매의 집을 찾아 필자의 모친(장순례·오른쪽)에게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문정현-길 위의 신부 32
1980년대 중반 전북 장수의 장계성당 시절, 가톨릭농민회를 조직하기 위해 군내 공소를 많이 찾아다녔다. 한낮에 마을에 들어가면 모두 논으로 밭으로 일을 나가 고요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서면 개 짖는 소리, 닭이 꼬꼬댁 하며 모이 먹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그날도 그랬다. 낮잠 자던 개가 우리를 보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가보니 여자아이가 감나무에 묶여 있었다. 얼굴은 밥풀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릇은 마당에 뒹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치솟았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한 채 내가 무슨 사목을 하며 농민운동을 한다고 하는가 싶었다. 본당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이가 자꾸 떠오르고 마음에 걸렸다.
나는 사제관 옆에 있던 창고를 치우고 목수를 불러 방 2개, 화장실, 주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 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러 오거나 말없이 성당 문 앞에 아이를 두고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금세 13명으로 늘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박정일 주교를 찾아가 지적장애아들을 돌보는 일을 교구 차원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주교는 “평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다시 집을 고쳐 축성식을 한 것이 86년 4월16일이었다. 집의 이름은 샤를 드 푸코 신부의 영성에 영향을 받아 ‘작은 자매의 집’이라고 지었다.
정식으로 작은 자매의 집을 시작한 뒤 중앙성당의 부녀회나 단체들이 후원을 많이 해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주방은 여전히 어머니가 맡았다가 아이들이 많아지자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본당에서 자매의 집을 함께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장계 쪽에 독립할 땅을 알아보다가 서울대교구 대치동성당의 도움으로 냇가를 낀 땅 2500평을 구입했다. 그런데 김환철 총대리 신부가 익산의 해바라기농장에 빈터가 있다고 추천을 했다. 해바라기농장은 익산시내와 가까워 나도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해바라기농장에서 비워둔 사무실을 개조해 작은 자매의 집을 옮겼다. 그때부터 내가 장계에서 익산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게 되자 박 주교는 88년 나를 익산 창인동성당으로 부임하도록 배려해줬다. 이후 창인동성당에 있는 여러 신심단체들의 도움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 남녀 아이들의 집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작은 자매의 집이 장애아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닌 가정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5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는 아이들 속에서 위로와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2005년 2월 이후, 내가 평택 대추리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작은 자매의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고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다. 작은 자매의 집 수녀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교육 필요성이 커졌다. 또 사회적으로도 꽃동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 법령이 바뀌어, 작은 자매의 집도 전문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공부를 한 후배 신부들에게 작은 자매의 집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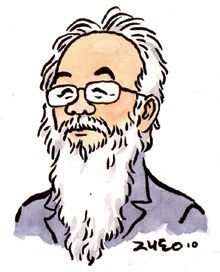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2007년 2월 대추리 주민들이 정부와 협의를 한 뒤 익산으로 돌아온 나는 이병호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작은 자매의 집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막상 은퇴 허락 전화를 받고 나니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다. 사제관 2층 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또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도 아이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그러나 새 책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없어 아이들을 보러 가지도 못한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은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작은 자매의 집 쪽으로 발길을 하지 않는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2007년 2월 대추리 주민들이 정부와 협의를 한 뒤 익산으로 돌아온 나는 이병호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작은 자매의 집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막상 은퇴 허락 전화를 받고 나니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다. 사제관 2층 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또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도 아이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그러나 새 책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없어 아이들을 보러 가지도 못한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은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작은 자매의 집 쪽으로 발길을 하지 않는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