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남미여행에 나선 필자(오른쪽)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로에서 해방신학자들의 수난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 예수회 신부를 비롯해 6명이 독재 군부에 의해 총을 맞아 죽은 자리를 기리고자 장미꽃을 심어 놓은 성지를 현지 신부가 안내하고 있다.
문정현-길 위의 신부 52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다. 1993년 봄 메리놀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무렵은, 마침 1492년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500돌 행사를 한 직후여서 그때까지 축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신대륙 발견 기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정복자의 관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벗어나 있으니, 미국이 좀더 깊이 보이고 또 한반도의 남북문제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여행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윤한봉이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동포사회에 끼친 영향을 확인한 것이었다. 93년 5월 윤한봉이 12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뉴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민주화운동이 점점 ‘정치권력’ 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떤 고통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철저한 운동가의 모습을 보았다.
윤한봉은 전남대 재학중 ‘민주청년학생연합’ 활동으로 제적당한 뒤 78년부터 이듬해까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수차례 수감되었다. 80년 5월, 광주항쟁이 터졌을 때 윤한봉은 광주에 없었다. 민청학련 조작사건 등으로 3차례 감옥생활을 했던 그는 5·18 하루 전날 밤, 계엄령으로 다시 수배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예비검속으로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자 그는 경찰을 피해 광주를 빠져나왔다. 항쟁기간 동안 봉쇄된 광주의 변두리를 맴돌아야 했던 그는 죄책감과 절망, 무력감에 몸서리를 쳤다고 했다. 5월27일 도청이 함락된 뒤, 그는 5·18의 핵심 주동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다. 잡히면 사형감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윤한봉은 1년 가까이 숨어 다니다가 81년 4월, 화물선 갑판 아래 숨어 미국으로 밀항했다. 그리고 93년 5월까지 이어진 망명생활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않는다. 조국의 가난한 동포들과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생각해서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도피생활 할 때처럼 허리띠를 풀고 자지 않는다.’ 그는 그 원칙을 지켰다. 윤한봉의 그런 모습은 동포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윤한봉은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해외연대운동 건설에 노력했다. 83년 민족학교, 84년 재미한국청년연합, 87년에는 재미한겨레동포연합을 설립해 활동했다. 특히 한국청년연합은 전국적인 풀뿌리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고,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뉴욕청년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설립에도 큰 구실을 했다. 동포들은 그를 통해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의 방북 때 많은 동포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여행길에 곳곳에서 윤한봉이 만든 한국청년연합의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욕·워싱턴·필라델피아·엘에이·시카고에 있는 조직을 방문했다. 꽤 단단한 조직이었지만 그가 귀국한 뒤 조직이 서로 갈려 안타까웠다. 그는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지금도 안타깝다. 77년 감옥에서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신부가 쓴 <해방신학>을 읽은 뒤 언젠가는 중남미 여행을 꼭 해보리라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95년 6월 남미 여행을 갔다. 메리놀회 신부님이 안내를 해주고, 친구 리수현 신부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함께 멕시코·엘살바도르·과테말라·니카라과를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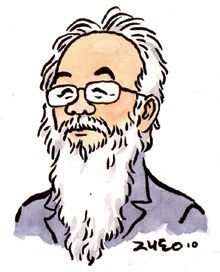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한국에서 해방신학을 접할 때는 남미의 전 교회가 민중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감옥에 갇히고 피살된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 남미의 교회도 한국 상황과 같았다. 주교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이었고 소수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가난한 이들과 정의를 위해 일하다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가톨릭 기초공동체도 교구의 제도로 인준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한국의 노동사목이나 지오세(가톨릭 노동청년회)와 비슷했다. 특히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다는 기초공동체에 가보면 사회의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려져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쓴 채 살고 있었다. 그야말로 고통 중에 복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한국에서 해방신학을 접할 때는 남미의 전 교회가 민중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감옥에 갇히고 피살된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 남미의 교회도 한국 상황과 같았다. 주교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이었고 소수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가난한 이들과 정의를 위해 일하다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가톨릭 기초공동체도 교구의 제도로 인준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한국의 노동사목이나 지오세(가톨릭 노동청년회)와 비슷했다. 특히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다는 기초공동체에 가보면 사회의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려져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쓴 채 살고 있었다. 그야말로 고통 중에 복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여행길에 곳곳에서 윤한봉이 만든 한국청년연합의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욕·워싱턴·필라델피아·엘에이·시카고에 있는 조직을 방문했다. 꽤 단단한 조직이었지만 그가 귀국한 뒤 조직이 서로 갈려 안타까웠다. 그는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지금도 안타깝다. 77년 감옥에서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신부가 쓴 <해방신학>을 읽은 뒤 언젠가는 중남미 여행을 꼭 해보리라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95년 6월 남미 여행을 갔다. 메리놀회 신부님이 안내를 해주고, 친구 리수현 신부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함께 멕시코·엘살바도르·과테말라·니카라과를 돌아다녔다.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