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장수 연화마을 폐교된 분교의 교실에서 열린 필자의 회갑연에서 흥이 난 필자가 어깨춤을 추고 있다. 하계연수를 구실로 내려온 역사문제연구소 직원 80여명을 비롯해 친지와 지인들, 동네 주민들이 어울려 한바탕 마을잔치를 즐겼다.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87
장수 연화마을에서 칩거 2년쯤 지나니 원고가 목표량을 거의 채우고 있었다.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다. 1996년 8월은 내 회갑이었다. 회갑잔치를 하지 않으려고 제자들을 피해 슬쩍 떠나시기까지 했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 뜻을 따르고 싶었던 나는 애초 회갑논문집 제안을 거절했듯 회갑잔치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래서 생일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런 내 얘기를 들은 서중석 교수가 외려 판을 더 크게 벌이고 말았다.
그는 하계연수를 구실로 역사문제연구소(역문연) 식구들을 연화마을로 다 몰고 내려와 회갑잔치를 벌여주기로 했고, 아내 역시 준비를 서둘렀다. 아들 녀석은 대학에 입학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내 평생 처음 한복까지 지어주었다. 그날 역문연 운영회의를 열어 내가 맡고 있던 소장 자리를 후배인 김정기 교수(서원대)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야말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마침내 회갑잔칫날, 역문연 식구들과 어릴 적 고학생 동기인 이강철·황승우 등 친구 서너명, 조카 두어명 등 80여명이 연화분교의 교실로 모여들었다. 어쩔 수 없이 벌인 자리였으나 산골마을이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사람 20여명까지 합해 좁은 교실에 꽉 들어찼고 매운탕 끓이는 가스불 기운까지 합해져 교실 안은 찜통처럼 더웠다. 하지만 모두들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내 평생 처음으로 호사를 했다고 할까?
이듬해 여름 또 한번 동네가 들썩이는 판이 벌어졌다. 내 회갑연 때 왔던 박원순 변호사가 이 마을 풍경에 취했던 모양이다. 참여연대의 여름연수를 이곳에서 하기로 해서 100여명이 참여했다. 그들은 ‘기소 독점권을 누리는 검찰권의 제한’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저녁에는 운동장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뒤풀이를 했는데, 이때 마을사람들의 건강상태도 점검해주는, 일종의 의료봉사도 했다. 참여연대에서 상비약 등을 듬뿍 준비하고 약사 두어분이 참석해 주민들의 지병을 살피고 알맞게 약을 나누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경상도에서 싣고 온 멧돼지를 잡아 모두 어울려 술을 마시고 여흥을 벌였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아주 고마워하고 즐거워했다.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이 찾아왔다고도 말했다.
두 차례의 잔치 덕분에 나는 동네에서 졸지에 ‘소영웅’ 대접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 선생이 평소 우리와 어울려 지내는 게 거짓이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 내가 이곳에 자리잡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또 <문화일보>에서 ‘이이화가 첩첩산골에 은거해 한국통사를 쓰고 있다’는 큼직한 특집보도까지 나갔다. 사실 그동안 신순철·서지영·신정일·문병학 등 인근 전주의 지인들과 역문연의 윤해동·이승렬 연구원, 유승원(가톨릭대)·장병인(충남대) 교수 부부 등이 가끔 찾아와 담소를 나눈 것은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주변 지역으로 역사기행을 다니는 팀도 찾아오고 언론매체에서도 종종 연락이 와서 부담스러웠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또 전주에서는 승용차로 한 시간 남짓 걸리니 저녁 먹고 바람 쐬듯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다가는 집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97년 말께 고대사(4책)를 마친 뒤에 이 마을을 뜨기로 작정했다. 승용차에 책을 가득 싣고 2년 반 동안 정들었던 마을을 떠날 때 할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주 놀러 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길로 옮겨간 두번째 집필 공간은 김제 금산사 들머리의 월명암이었다. 금산사 바로 밑에 사는 최순식 선생에게 부탁해 토방 한칸을 빌렸다. 이곳은 고시생을 상대로 하숙하는 곳이어서 밥 걱정은 덜 했다. 하지만 매미가 울어대는 소음은 연화마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절 아래 저수지 주변에는 술집과 음식점이 널려 있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편리한 점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1년쯤 지나자 모악산 기행팀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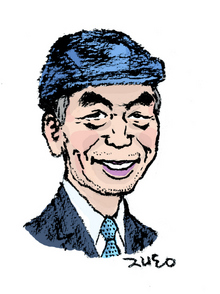 이 토방에서 고려사 정리를 끝낸 뒤 나는 구리 아치울 집으로 오기로 결정했다. 그간 3년 넘도록 불편한 산골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고대사와 고려사 집필에는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지 않아 움직임이 단출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써야 할 조선시대 이후에는 검토해야 할 사료가 몇배나 많았다. 마침 ‘외환위기’를 맞아 한길사에서도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애초 주었던 생활비의 지원 규모를 줄였다. 아이 둘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생활을 꾸리려면 다른 부수입원을 찾아야만 했다. 또 하나, 출판사 편집팀에 넘긴 원고를 강옥순이 맡아서 사실 오류, 문장 검토, 사진 자료를 찾았는데 늘 상의를 해야 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 토방에서 고려사 정리를 끝낸 뒤 나는 구리 아치울 집으로 오기로 결정했다. 그간 3년 넘도록 불편한 산골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고대사와 고려사 집필에는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지 않아 움직임이 단출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써야 할 조선시대 이후에는 검토해야 할 사료가 몇배나 많았다. 마침 ‘외환위기’를 맞아 한길사에서도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애초 주었던 생활비의 지원 규모를 줄였다. 아이 둘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생활을 꾸리려면 다른 부수입원을 찾아야만 했다. 또 하나, 출판사 편집팀에 넘긴 원고를 강옥순이 맡아서 사실 오류, 문장 검토, 사진 자료를 찾았는데 늘 상의를 해야 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