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김제 월명암에서 고려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리 아치울 집으로 돌아온 필자는 책과 사료로 가득 찬 지하 골방 서재에 칩거하며 또다시 ‘한국사 이야기’ 집필에 몰두했다.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95
이쯤에서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자. 독자들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한국사 이야기’는 언제 쓰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테니. 앞서도 한번 말했지만, 그런 중에도 한국사 이야기는 해마다 4권씩 차질없이 출간을 했다.
김제 월명암에서 올라온 뒤 나는 아치울 집 지하방에 들어앉아 집필에 몰두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이었지만 장마철이면 바닥이나 벽에서 물이 흥건하게 새어나와 애를 먹였다. 하지만 파리떼, 모기떼는 완벽하게 차단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다만, 딸의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대서 냄새를 물씬 풍겼다. 무엇보다 전화를 두지 않아서 모든 연락은 아내가 대신 받아 전달해 주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사료가 너무 방대해서, 당장 집필에 필요한 사료만으로도 좁은 방이 가득 찼다. 하루 10여시간씩 집필에 몰두하다 보면 때로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 1년에 두어번 정도 ‘컴퓨터 어깨병’(브이디티증후군)이 도져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럴 때면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강연이나 역사기행에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그 시절 박완서 선생이 나를 두고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이이화)선생의 집필실은 화사하게 꽃핀 정원 밑의 어두운 방이다. 나는 그 집필실 앞을 지날 때마다 면벽하고 수도하는 고승의 동굴 앞을 지나는 것처럼 마음이 숙연하고도 짠해지곤 했다. 동굴 같다는 건 내 느낌일 뿐, 그 안은 갖출 것 다 갖춘 보통의 서재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마도 가족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소외시켜야 글이 써진다는, 비록 분야는 다르다 해도 글쟁이 공통의 엄혹한 팔자에 대한 동병상련일 것이다.”(<이이화와 함께 한국사를 횡단하라> 중에서 ‘실로 보배로운 이 시대의 기인’)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다.
아무튼 조선시대사를 기술하면서 나는 정반합(正反合)의 서술체계를 시도했다. 통치세력은 인덕을 강조한 유교 이념을 내세우면서 백성을 다스렸고, 왕실은 끊임없이 근검절약을 내걸었음을 밝혔다. 조선 초기 한글 창제 등 민족문화를 이룩했으나 지역 갈등과 신분 차별을 유발했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유교의 충효사상이 지배문화의 기저를 이루었으나 엄숙주의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저항세력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전달하려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국가 사이의 전쟁이므로 각기 ‘조-일 전쟁’과 ‘조-청 전쟁’으로 불러야 국제환경 속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그 사이에 대두한 척화파와 주화파의 현실 대응을 두고 타협적인 주화파의 정당성을 부각하려 했다. 주자학으로 무장한 척화파는 중화주의에 매몰되어 민중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실체가 없는 ‘존명배청’으로 일관해서 국제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했다.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벗어나 다른 민족을 인정하면서 교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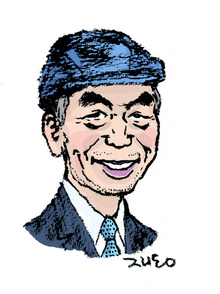 조선 후기는 역동적 사회를 이루어냈다고 보았다. 물이 고여서 썩은 게 아니라 줄기차게 흘러내렸다는 것이다. 실사구시에 바탕한 실학의 추구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논리였으며 노비 등 민중의 저항과 중인-서민문화의 대두는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내재적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시대 배경에서 영조-정조 시기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발전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개혁과 평등은 쌍두마차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민중사·생활사 기술에 열중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전개된 통과의례와 놀이문화와 고유의 풍속과 독자적인 문화 창달을 부각하려 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그리고 판소리와 가면극의 등장이 민중에 토대를 두고 유교의 엄숙주의 또는 지배문화의 근엄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중세와 근대의 끝자락에서 태생한 자기분출의 한 모습이었다. 역사학자
조선 후기는 역동적 사회를 이루어냈다고 보았다. 물이 고여서 썩은 게 아니라 줄기차게 흘러내렸다는 것이다. 실사구시에 바탕한 실학의 추구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논리였으며 노비 등 민중의 저항과 중인-서민문화의 대두는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내재적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시대 배경에서 영조-정조 시기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발전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개혁과 평등은 쌍두마차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민중사·생활사 기술에 열중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전개된 통과의례와 놀이문화와 고유의 풍속과 독자적인 문화 창달을 부각하려 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그리고 판소리와 가면극의 등장이 민중에 토대를 두고 유교의 엄숙주의 또는 지배문화의 근엄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중세와 근대의 끝자락에서 태생한 자기분출의 한 모습이었다. 역사학자
역사학자 이이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