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이자 외아들인 박정기씨의 부친 박영복(왼쪽)씨와 모친 정금순(오른쪽)씨의 영정 사진. 서른일곱 고령에 18년 터울의 여동생을 낳은 어머니는 그 후유증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나 젊은 모습만 남아 있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1944년 박정기는 정관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그러자 곧 징용 영장이 날아들었다. 태평양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일제가 마구잡이로 징용을 끌어갈 때였다. 부친 박영복은 종손이며 하나뿐인 아들을 강제노역에 내보낼 수 없었다. 그 시기 적잖은 청년들이 징용을 거부하거나 피했다. 청년들은 절에 숨거나 타지로 피신했다.
집을 나서던 날, 할아버지가 박정기의 짐보따리를 챙겨주었다. 여비와 함께 쌀자루를 둘러메고 홀로 길 떠나는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천성산을 넘으면 양산군이었고, 하북면에 둘째 고모가 살고 있었다. 평지보다 산을 타고 오르는 길이 지름길이었다. 박정기가 고모 집에 도착한 것은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다.
고모 집은 땅콩과 참외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다. 사흘 뒤 그는 다시 행장을 차려 셋째 고모네가 있는 부산 거제리까지 걸어갔다. 셋째 고모부는 난로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다. 백토를 반죽해 난로 화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는 여기서 일했다. 흙을 이겨 난로를 만들고, 마르면 가마에 넣고 불을 피웠다. 날마다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래 온천장으로 목욕을 하러 가던 박정기는 한 무리의 여학생을 발견했다. 그중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국민학교를 함께 다닌 동무였다. 여학생은 까만색의 세련된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동래여중 학생복이었다. 여학생을 보는 순간, 박정기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알은체를 하고 싶었지만 수줍었다. 흙먼지 묻은 근무복이 창피해 차마 나서지 못했다. 이날 박정기는 다짐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공장 일이 아니다. 공장이 아니라 학교에 가야 한다.’
며칠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가 패망했다. 광복을 앞두고 할아버지가 일흔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박정기는 어릴 적 언젠가 할아버지가 대성통곡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할아버지는 주막거리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상투를 강제로 잘렸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목이 쉬도록 울었던 것이다. 어린 손자의 눈에 상투 없이 산발한 할아버지 모습이 낯설었다. 박정기에게 일제시대는 할아버지의 상투 잘린 행색과 통곡소리로 기억되었다.
1946년 3월 열여덟살의 박정기는 부산공립원예전수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49년 고교 과정이 포함된 6년제 원예중학교로 승격했다. 고향을 떠나 동래의 온천장에서 하숙하며 등교했다.
그해는 박정기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해였다.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서른일곱의 나이에 여동생을 낳았다. 18년 만에 낳은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정옥이라 지었다. 온 집안이 경사였다. 이때까지 형제 없이 혼자 자란 박정기에게도 여동생이 생긴 것이다. 아기를 볼 때마다 신기했다. 주말이 되면 정옥을 보고 싶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채 1년이 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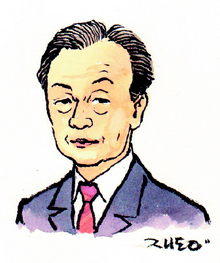 어머니가 복막염에 걸려 쓰러졌다. 박정기는 자신이 장질부사에 걸렸을 때처럼 어머니도 일어날 것이라 믿고 정성껏 간호했다. 하지만 한번 누운 어머니는 다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금순의 나이 향년 서른여덟이었다.
어머니가 복막염에 걸려 쓰러졌다. 박정기는 자신이 장질부사에 걸렸을 때처럼 어머니도 일어날 것이라 믿고 정성껏 간호했다. 하지만 한번 누운 어머니는 다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금순의 나이 향년 서른여덟이었다.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정옥도 죽고 말았다. 정옥을 산에 묻는 아버지를 보며 박정기는 망연자실했다. 연달아 할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여동생을 잃었다. 말수 적은 그의 입술은 더 굳게 닫혔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재를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박정기는 훗날 어머니를 기억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는 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열여덟 청춘은 그렇게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다. 박정기는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에겐 삶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내면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구술작가/송기역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정옥도 죽고 말았다. 정옥을 산에 묻는 아버지를 보며 박정기는 망연자실했다. 연달아 할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여동생을 잃었다. 말수 적은 그의 입술은 더 굳게 닫혔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재를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박정기는 훗날 어머니를 기억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는 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열여덟 청춘은 그렇게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다. 박정기는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에겐 삶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내면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구술작가/송기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