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중매로 결혼한 박정기·정차순 부부는 2남1녀를 뒀다. 왼쪽부터 딸 은숙(9살), 맏이 종부(13살), 막내 종철(6살). 수도국 공무원의 박봉에도 화목하고 우애 깊은 가족이었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⑧
박정기는 아내 정차순에 대한 믿음이 컸지만 평생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하지 못한 ‘경상도 남자’였다. 그래도 결혼생활은 화목했다. 한번도 싸워본 적 없는 부부였다. 더러 언성을 높일 때가 있었지만 매번 ‘황소’인 그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신혼살림은 부산시 서구의 구덕수원지 사택에서 시작했다. 부부는 1957년 맏아들 종부를 낳았고, 4년 뒤 딸 은숙, 그 3년 뒤 막내 종철을 낳았다. 아이들은 다툼이 없었고 우애가 깊었다.
박봉의 공무원 월급으로 정차순은 검소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박정기의 생활신조도 ‘검소’였다. 자신을 위한 소비엔 인색했지만 타인을 위한 일엔 아낌이 없었다. 그가 가훈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십원은 아끼고 천원은 써라.”
삼남매는 이 말을 외우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훗날 막내 종철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선사업가’란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이런 교육이 은연중 몸에 밴 까닭이었다.
현대사의 흐름은 가팔랐지만 박정기의 가족은 평안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쫓겨났고, 곧이어 박정희 군부가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36년 공무원 생활에서 딱 한번 위기가 있었다. 61년 5·16 쿠데타 직후였다.
당시 수도국은 부산시청 뒤편 별도의 건물에 있었다. 이른 아침이면 수도국 건물 앞으로 수백명의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수도관 매설작업을 하는 인부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해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임시직이었다. 박정기는 그때마다 이력서를 대필해줬다. 해가 바뀌면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많았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한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들이 박정기를 찾아와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공무원이었다.
노동조합 설립 계획은 하루 만에 탄로 났다. 이튿날 아침 시청 간부가 박정기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 계획에 연루된 관리자들을 불러 윽박질렀다.
“당장 손 떼시오! 그렇잖으면 오늘부로 모두 해고하겠소.” 관리자들은 모두 손을 뗐다. 박정기도 도리가 없었다. 애초에 노동운동을 하려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인정에 끌려 함께한 것이었다. 노동조합 설립 계획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정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 조직인지 깨달았다. 그땐 아들 종철이 가슴에 품었던 이름 전태일의 삶을 알고 난 뒤였다. 그의 공무원 생활은 평탄했다. 뇌물의 유혹 같은 것은 아예 없는 자리였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되었다. 성실하고 소박한 성격의 그에게 맞는 일이었다. 더 나은 직업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사에 신중한 탓에 쉬이 일을 벌이진 않았다. 86년 정년퇴임을 한 해 남겨둔 박정기의 꿈은 목욕탕집 주인이었다. 부산시의 물을 관리하던 그에게 목욕탕 하나 정도의 물을 관리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마침 정차순의 친구가 동래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친구네가 고용한 사람이 목욕탕을 경영했는데 관리가 소홀하자 어느날 박정기에게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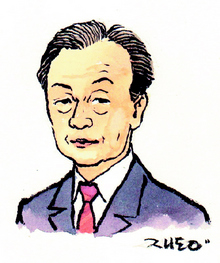 “종철 아버지, 우리 목욕탕 좀 봐 줄래요?”
퇴임하면 목욕탕을 운영해달라는 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하지만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아온 공무원 박정기의 삶은 여기까지다. 그가 목욕탕집 주인을 꿈꾸고 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구속하며 정권 연장을 꿈꾸었다. 직선제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국민 스스로 선택할 권리였다. 한국 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은 80년 봄 총칼에 의해 한차례 좌절되었지만, 86년에 이르러 직선제 개헌운동의 열기를 타고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독재정권과 민주세력의 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둘 중 하나의 꿈은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져야 했다. 한 청년의 꿈과 목숨이 짓밟히면서 두 가지 꿈의 대립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 바로 박정기의 막내아들이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종철 아버지, 우리 목욕탕 좀 봐 줄래요?”
퇴임하면 목욕탕을 운영해달라는 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하지만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아온 공무원 박정기의 삶은 여기까지다. 그가 목욕탕집 주인을 꿈꾸고 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구속하며 정권 연장을 꿈꾸었다. 직선제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국민 스스로 선택할 권리였다. 한국 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은 80년 봄 총칼에 의해 한차례 좌절되었지만, 86년에 이르러 직선제 개헌운동의 열기를 타고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독재정권과 민주세력의 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둘 중 하나의 꿈은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져야 했다. 한 청년의 꿈과 목숨이 짓밟히면서 두 가지 꿈의 대립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 바로 박정기의 막내아들이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당장 손 떼시오! 그렇잖으면 오늘부로 모두 해고하겠소.” 관리자들은 모두 손을 뗐다. 박정기도 도리가 없었다. 애초에 노동운동을 하려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인정에 끌려 함께한 것이었다. 노동조합 설립 계획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정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 조직인지 깨달았다. 그땐 아들 종철이 가슴에 품었던 이름 전태일의 삶을 알고 난 뒤였다. 그의 공무원 생활은 평탄했다. 뇌물의 유혹 같은 것은 아예 없는 자리였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되었다. 성실하고 소박한 성격의 그에게 맞는 일이었다. 더 나은 직업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사에 신중한 탓에 쉬이 일을 벌이진 않았다. 86년 정년퇴임을 한 해 남겨둔 박정기의 꿈은 목욕탕집 주인이었다. 부산시의 물을 관리하던 그에게 목욕탕 하나 정도의 물을 관리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마침 정차순의 친구가 동래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친구네가 고용한 사람이 목욕탕을 경영했는데 관리가 소홀하자 어느날 박정기에게 부탁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