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16일 오전 겨울비 속에서 박정기는 아들 박종철을 화장해 임진강의 지류인 샛강에 뿌렸다. 사진은 이듬해 1주기 때 샛강변을 다시 찾아 추모하는 모습.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15
1987년 1월16일 오전 8시25분, 박정기는 아들 박종철의 주검을 실은 채 경찰병원 장의버스를 타고 영안실을 떠났다. 버스가 출발할 무렵 기자들이 접근해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기자들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다.
화장터 가는 길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30분쯤 뒤 버스는 벽제 화장터에 도착했다. 화장터에서 관을 내리는 순간 아내 정차순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끝내 실신하고 말았다. 경찰들이 대기시킨 구급차에 정차순을 실었다. 딸 박은숙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탔다. 박정기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는 아들의 영정을 앞에 두고 멍하게 앉아 혼잣말을 했다. 그렇게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박종철은 서둘러 화장되었다.
두 시간 뒤 박종철은 한 줌 하얀 뼛가루가 되어 나왔다. 큰아들 박종부가 유골을 품에 안았다. 그들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임진강의 지류인 샛강으로 향했다. 경찰들과 기자들 네댓 명이 뒤따라왔다.
박정기는 한줌 한줌 아들을 임진강에 뿌렸다. 겨울비가 흩뿌렸다. 손을 펴자마자 바람이 아들을 낚아챘다. 아들은 하얀 가루로 흩어져 강물 위에 내려앉았다. 옆에서 박종부가 흐느꼈다. 박정기는 잃어버린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를 따라간 동생 정옥을 생각했다. 아들 종철을 생각했다. 가슴 한켠에서 내내 떠나지 않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외로움과 한이 뼛속을 낭자하게 저몄다.
그는 임진강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아들이 죄없이 죽은 게 힘없고 못난 애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용서받고 싶었다. 그는 쥐어짜듯 겨우 말했다.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전해야 했다.
“철아, 잘 가그래이…”
유골 가루가 그의 손바닥 위를 모두 떠났을 때 그는 가루를 쌌던 하얀 종이를 강물 위에 띄우며 한번 더 작별인사를 했다.
“처얼아, 자알 가아그래이이. 아부지는 아아무 하알 말이 어없대이.”
겨울비 속에서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통곡했다.
박정기가 허공에 외친 이 말은, 자식을 두고 있는, 독재정권에 무력하게 복종하고 있던 어버이들의, 어버이를 둔 자식들의 심금을 울리며 뼛가루처럼 세상 속으로 흩뿌려졌다.
열흘 뒤인 1월26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박종철군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인권회복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카인과 아벨의 비유를 통해 고문 경관 두 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떠넘긴 고문 정권을 질타했다.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엔 고문을 금지한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제헌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 성립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도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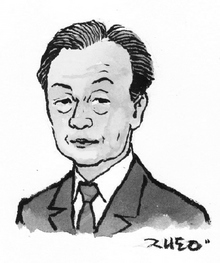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80년 5월 광주시민의 주검 위에 세운, 정통성이 결여된 5공화국 정권은 끊임없이 저항세력과 부딪혔고 그때마다 인권 탄압과 비인간적 고문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다.
박정기가 임진강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날, 언론인 김중배는 신문의 칼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 한 젊음의 삶은 지구보다도 무겁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응시 없이 삶을 말할 수 없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들은 매일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고문 정권에 항의했고, “자식 키우는 것이 두렵고 슬프다”며 울먹였다. 박종철의 ‘죽음을 끝내 지켜주는’ 일은 이제 재야와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80년 5월 광주시민의 주검 위에 세운, 정통성이 결여된 5공화국 정권은 끊임없이 저항세력과 부딪혔고 그때마다 인권 탄압과 비인간적 고문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다.
박정기가 임진강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날, 언론인 김중배는 신문의 칼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 한 젊음의 삶은 지구보다도 무겁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응시 없이 삶을 말할 수 없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들은 매일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고문 정권에 항의했고, “자식 키우는 것이 두렵고 슬프다”며 울먹였다. 박종철의 ‘죽음을 끝내 지켜주는’ 일은 이제 재야와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