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는 막내아들 종철에게 ‘땡철’이라 부르며 귀여워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1970년 여름 부산역 광장에나들이를 간 종철과 누나 은숙(오른쪽)이 즐거워하고 있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16
1987년 1월16일 어둠이 깃든 뒤 아들 박종철을 떠나보낸 박정기는 부산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경찰에서 마련한 대형 버스였다. 버스에는 가족과 친척들만이 아니라 경찰과 기관원들도 타고 있었다.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기관원들은 이날부터 참여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꼬박 15년 동안 그와 가족들 주변을 감시했다.
박정기는 버스 안에서 종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폭력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유난히 신념이 두터웠던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종철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헤아렸다. 오래된 기억들이 차창에 부딪혔고, 또 사라졌다.
내 아들 박종철은 1965년 4월1일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서 태어났다. 종부, 은숙에 이은 셋째였다. 큰아들 종부 위로 첫째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남매에 만족했지만 아내는 아들을 더 낳고 싶어했다. 막내 종철이 태어났을 때 7살 터울의 종부는 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전셋집엔 세 가구가 모여 살았다. 갓난아기 철이는 함께 사는 이웃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철이가 세 살 때. 국민학교 3학년이던 종부가 부산시교육감상을 받았다. 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아미동의 단골 사진관에 들러 사진을 찍었다.
그날 철이는 내가 사준 ‘도리우치’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일제 때 도리우치 모자를 쓰고 다니던 정보과 형사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를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철이에게 ‘흐루시초프’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모자 쓴 모습이 통통하고 귀여워 ‘예쁘다’는 말을 했더니 녀석은 밤낮 그 모자를 쓰고 지냈다.
‘흐루시초프’는 건강하게 자랐다. 네 살 무렵 내가 동요 ‘학교종’을 가르쳐주자 녀석은 금세 노래를 외워 불렀다. 그러더니 시시때때로 “학교종이 땡땡땡”을 불렀다. 철이의 별명은 ‘흐루시초프’에서 ‘땡철이’가 되었다. 나와 가족들은 녀석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땡철아~ 땡철아~’ 부르며 녀석을 놀렸다.
우리집 아이들은 유달리 책을 좋아했다. 집엔 아동용 세계문학전집·세계위인전·삼국지 등이 있었는데 철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 책들을 모조리 읽었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이 입학 연령이 되기 전 한글·산수 등을 직접 가르쳤다. 아버지가 야학에서 나를 가르쳤듯 나도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다.
철이는 다섯 살 때부터 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다. 우리집에서 5분 거리에 토성국민학교가 있었다. 아내는 점심시간이면 종부와 은숙의 도시락을 막내를 통해 배달시켰는데 그때부터 학교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다. 이미 형과 누나의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아내가 학교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날부터 녀석은 매일 누나의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연습을 했다. 아내 정차순은 교육열이 대단했다. 학교 다닐 적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다. 그런 열성으로 기어코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아냈다. 1971년 3월 토성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 철이는 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다. 막내가 2학년 때 우리는 부산 영도구의 대교양수장 사택으로 이사했고 2년 뒤 집을 장만해 서구의 서대신동으로 옮겼다. 서대신동 성당 맞은편 길가에 있는 2층집이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이 컸다. 그곳에서 5년 넘게 살았다. 1976년 종부가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치르고 가톨릭의대를 지망했는데 낙방했다. 워낙 성적이 뛰어났던 맏이여서 아내와 나는 충격이 적잖았다. 종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은데다 인근에서 모범생으로 제법 알아주는 아이였다. 지금은 딸아들 구분 없이 평등하게 자식들을 대하지만 그때만 해도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종부가 시험에서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이가 삼천리자전거를 사들고 집에 왔다. 나는 무슨 이유로 자전거를 샀는지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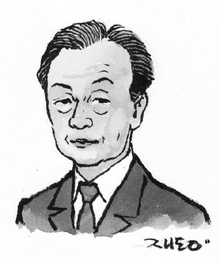 “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자전거를 샀노?”
“그동안 저금한 돈으로 샀지예.”
국민학교에서 개설한 통장에 그동안 저금한 돈을 털어 산 것이다. 그런데 제 키에 맞지 않는 커다란 자전거였다.
“니한테 맞는 걸 사지 와 큰 놈을 샀노?”
“큰 걸 사야 형이랑 같이 타지요.”
막내는 시험에 떨어진 형을 위로하기 위해 자전거를 사온 것이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자전거를 샀노?”
“그동안 저금한 돈으로 샀지예.”
국민학교에서 개설한 통장에 그동안 저금한 돈을 털어 산 것이다. 그런데 제 키에 맞지 않는 커다란 자전거였다.
“니한테 맞는 걸 사지 와 큰 놈을 샀노?”
“큰 걸 사야 형이랑 같이 타지요.”
막내는 시험에 떨어진 형을 위로하기 위해 자전거를 사온 것이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철이는 다섯 살 때부터 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다. 우리집에서 5분 거리에 토성국민학교가 있었다. 아내는 점심시간이면 종부와 은숙의 도시락을 막내를 통해 배달시켰는데 그때부터 학교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다. 이미 형과 누나의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아내가 학교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날부터 녀석은 매일 누나의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연습을 했다. 아내 정차순은 교육열이 대단했다. 학교 다닐 적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다. 그런 열성으로 기어코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아냈다. 1971년 3월 토성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 철이는 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다. 막내가 2학년 때 우리는 부산 영도구의 대교양수장 사택으로 이사했고 2년 뒤 집을 장만해 서구의 서대신동으로 옮겼다. 서대신동 성당 맞은편 길가에 있는 2층집이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이 컸다. 그곳에서 5년 넘게 살았다. 1976년 종부가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치르고 가톨릭의대를 지망했는데 낙방했다. 워낙 성적이 뛰어났던 맏이여서 아내와 나는 충격이 적잖았다. 종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은데다 인근에서 모범생으로 제법 알아주는 아이였다. 지금은 딸아들 구분 없이 평등하게 자식들을 대하지만 그때만 해도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종부가 시험에서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이가 삼천리자전거를 사들고 집에 왔다. 나는 무슨 이유로 자전거를 샀는지 궁금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