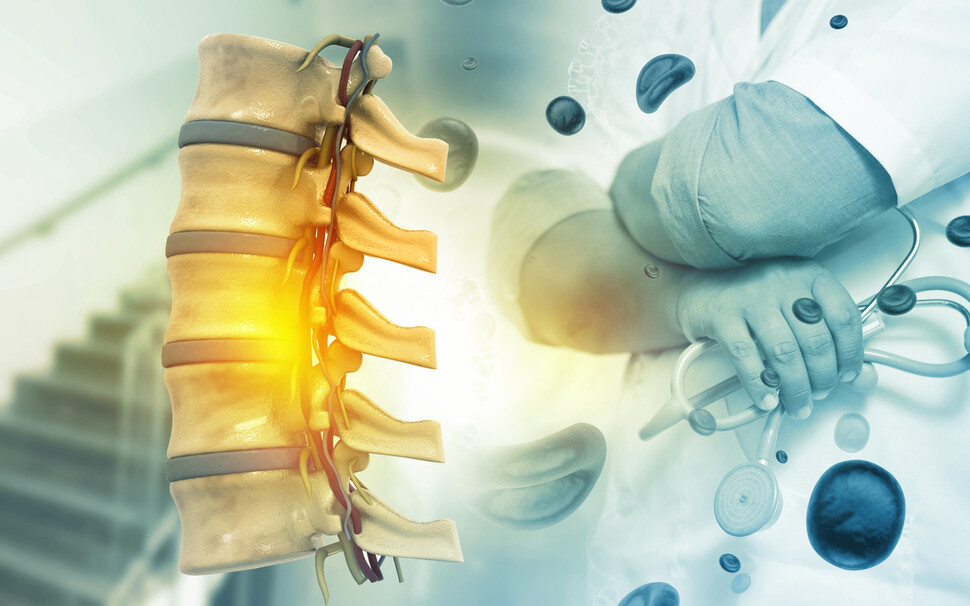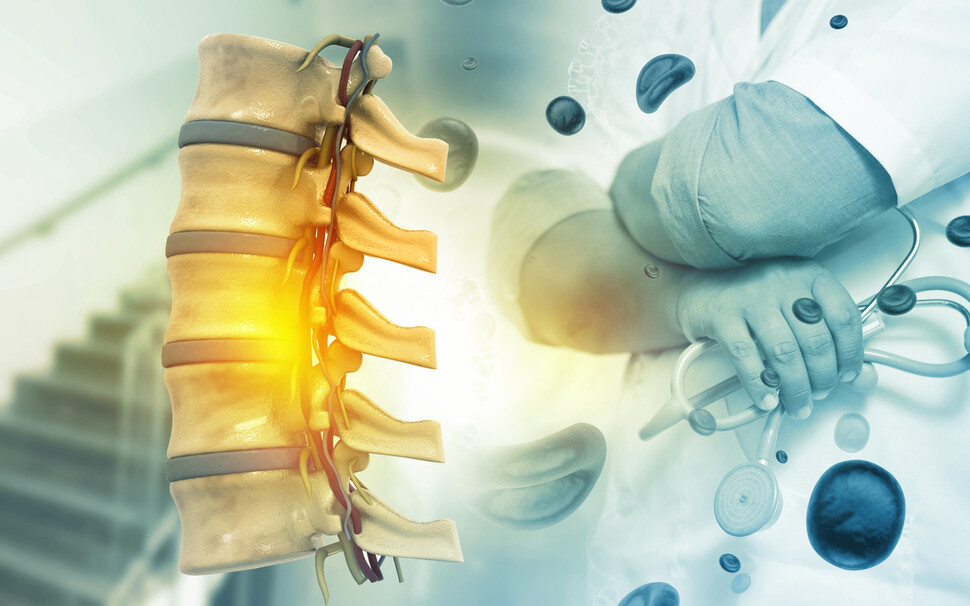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추(허리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고서 수술 없이 돌아갔다가 하지가 마비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ㄱ씨와 가족들이 ㄴ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10월2일 ㄱ씨는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전공의는 허리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한 뒤 ‘허리뼈 4~5번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10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휴일이어서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일단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했다. 전공의는 ㄱ씨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당시 허리뼈 자기공명영상(MIR) 검사 판독결과에는 ‘등뼈(가슴뼈) 12번부터 허리뼈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혈종, 척수 압박 중증도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혈종이란 출혈로 인해 혈액이 한곳으로 모여 혹과 같이 된 것을 말한다.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ㄱ씨는 10월4일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6일 대학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마미증후군’이 나타난 상태여서 등뼈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하지가 마비돼 서 있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ㄱ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학병원의 전공의 과실로 척추 경막외혈종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하지 마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처한 것은 합리적 진료방법 범위에 있으므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척추 경막외혈종이 있다는 것을 전공의가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택했다는 대학병원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기에 ㄱ씨가 신속하게 수술하지 못한 것이 전공의가 전원할 때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공의가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허리뼈 자기공명영상(MRI)을 자체적으로 확인해 ㄱ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공의가 ㄱ씨의 진료기록이나 응급환자 전원의뢰·동의서에 척추 경막외혈종과 관련한 진단을 기재하지 않았고, 출혈 방지를 위해 혈액 응고 수치를 확인하는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척추 경막외혈종이 더 커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ㄱ씨에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대학병원의 과실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공의가 △허리뼈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원할 때 척추 경막외혈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ㄱ씨의 합병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따지도록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