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는 이름이 세개요.”
러시아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북서쪽으로 차를 여섯 시간 달려 도착한 탄광마을 보시냐코보(일본 지명 니시사쿠탄)에서 만난 조영재(78)씨는 점잖은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열었다. 마을을 빼곡히 둘러싼 사할린의 자작나무 숲은 며칠 새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했고, 연해주를 마주보고 뚫린 보시냐코보의 작은 항구엔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배들이 몰려와 화력발전소에서 땔 석탄을 실어 내간다고 했다.
‘잠재적 안보위협’ 파악…보안과 형사 따라붙여
조씨는 1932년 경상북도 안동군(지금의 안동시) 풍산읍에서 태어나, 사할린에 탄부로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따라 1942년 사할린으로 들어왔다. 사할린의 일본인학교에 입학하면서 그의 이름은 ‘마쓰모토 에이사이’가 됐고, 1945년 일본이 소련에 패해 사할린 전체가 소련 영토가 되면서 이름은 다시 ‘유리 조’로 바뀌었다. 이후로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할린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발굴한 1990년 부산경찰청의 사할린 동포 동향감시 문서. 국가기록원 발굴
“1942년에 여기 들어오니까 함바집(노무자 숙소) 3채에 조선 사람이 한가득이야. 이쪽은 주로 경상도 사람이 많았고, 저 아래 샤흐툐르스크에는 주로 이북 사람, 기타오자와(텔놉스키)에는 충청도, 전라도 사람이 많았어. 여기가 탄이 좋아요. 조선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다코베야(탄광 노무자들의 감금시설)로 끌고 가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완전 바보가 돼서 나와.”
사할린의 일제 때 지명은 ‘가라후토’(화태·樺太)로, 이는 아이누어로 ‘자작나무의 섬’이란 뜻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승전의 대가로 사할린의 절반(북위 50도선 이남)을 러시아로부터 할양받았다. 이후 일본은 사할린의 풍부한 자원 개발에 나섰다. 부족한 노동력은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충당했다. 1944년 7월 말 현재 남사할린에서 가동하던 26개 탄광 가운데 조선인은 25개 탄광에서 7801명(탄광부 6120명)이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남사할린 중부의 시네고르스크에서 만난 김윤덕(87)씨의 고향은 경북 경산이다. 그는 1943년 부친을 대신해 사할린에 들어온 뒤 2년여 동안 탄부로 일했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 김씨를 포함한 남사할린의 조선인 인구는 4만3000여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절대다수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되는 남한 출신이었다.
김윤덕씨가 부인 김말순(76)씨와 함께 창을 등지고 사진을 찍었다. 왼쪽 하단은 김씨의 젊은 시절 사진. 1982년 은퇴한 김씨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매년 1만4000루블(53만4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남사할린 조선인 4만명…해방직후까지 거주 추정
김씨에게 해방은 어느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기한 휴가’였다. “어느 날 일하러 갔더니,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일본이 졌다는 거야.” 해방 이후 사할린은 남하한 소련 군대와 본토로 피난하려는 일본인·조선인이 섞여 아비규환이었다. 패전의 충격과 소련군에 대한 공포로 흥분한 일본인들은 사할린 남서부의 포자르스코예(미즈호)와 레오니도보(가미시스카) 등에서 조선인을 집단 학살했다. “해방이 됐는데 홀름스크(남사할린 서남부의 항구도시)에서 왜놈들이 조선 사람은 내버리고, 자기네들만 실어 갔다고 하더라구. 배에 탄 조선인은 죽이기도 했다고 그래. 그때 소련 군대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조선인들은 다 죽었을 거야.”
해방 직후의 혼란이 끝난 뒤에도 고국으로 갈 순 없었다. 1946년 12월부터 시작된 ‘남사할린 일본인 송환사업’으로 29만2590명의 일본인이 귀국길에 올랐지만,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닌’ 사할린 한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김씨는 소련 국적을 취득했고, 광부로 37년을 더 일하다가 82년에 은퇴했다.
사할린 북동부의 탄광도시 우글레고르스크에서 만난 안복순(76)씨는 울산 출신으로, 아버지 안차문(1902~1980)을 따라 1942년 사할린에 들어왔다. 그의 부친은 사할린 북서부의 기타오자와(텔놉스키) 탄광에서 일하던 중 1944년 8월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이중징용’이 됐다. 전쟁이 끝나고 홋카이도에서 도둑배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온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안씨는 아버지가 남쪽의 항구 코르사코프에서 400㎞ 넘는 길을 처자식을 찾아 걸어왔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나가사키 탄광이 물밑에서 탄을 캐도록 돼 있어서 고생이 심했다. 일을 하다가 가죽으로 많이 맞아서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씨의 남편은 1998년 고향 방문을 앞두고 은행에서 고액의 외화를 환전했다가 집으로 쫓아온 러시아 마피아의 손에 죽었다.
안씨 남편이 죽어서 밟지 못한 고국은 이들을 ‘잠재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파악했던 것 같다. <한겨레>가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부산경찰청 보안과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90년 고향 방문을 온 사할린 동포들의 동향 감시를 위해 보안과 형사를 24시간 따라붙게 했다. 안씨는 “이제 남편도 없는데, 혼자 아이들을 버리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인 29만명 귀국하며…징용 한인들은 내팽개쳐
지난 1월26일 보시냐코보 마을 뒷동산의 ‘제2공동묘지’는 수북이 내린 하얀 눈에 파묻혀 있었다. 그곳에서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장 최종국(58)씨의 할머니 최월주(1905~1986·일부 한인들은 서양식 관습에 따라 남편의 성으로 고치기도 했다)씨의 무덤을 찾았다. 주변에는 이곳에서 살다 간 조선인들의 묘지가 널려 있다.
조영재씨의 집은 무덤이 있는 마을 뒷동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걸린다. 그의 집에는 음력 설과 추석을 쇠기 위해 서울에서 구해온 2007년도 고국의 달력이 걸려 있다. 그는 “이제 러시아에서 60년 넘게 살다 보니 영재라는 이름보다 유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아프고 아이들이 눈에 밟혀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도 죽으면 산 중턱의 공동묘지에 묻힐까? 그는 기자의 손을 붙잡고 연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사할린/글·사진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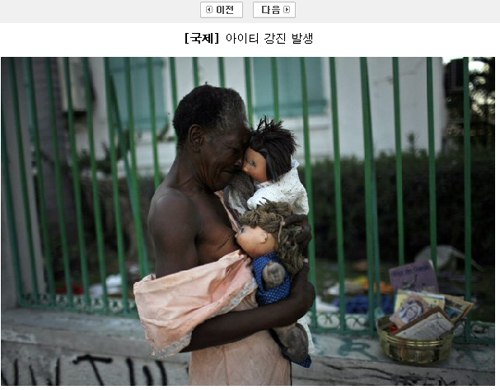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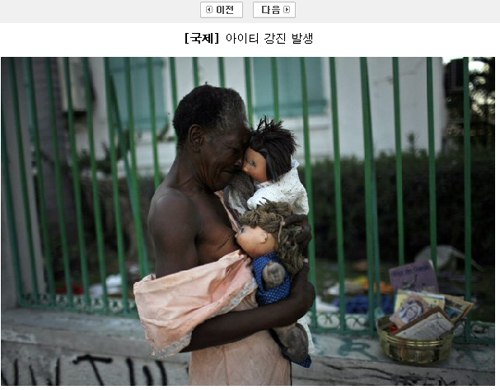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