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강화 지역 공동체 운동가 이광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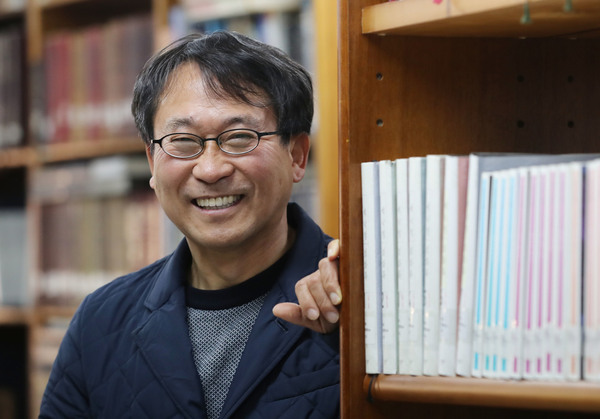 “그동안 돈벌이로 23가지 일을 했더군요.” 그가 했던 일은 이렇다. 용접공, 노동상담, 자동차 정비공장, 대리운전, 해외인터넷방송 기획사, 두부공장, 대안학교, 영농조합, 증권사 등등. 상장 증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 대표이사도 했단다. 잦은 생업 변경을 두고 아이들한테 “아빠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원망을 듣기도 했단다. 그는 최근 <돈이 결코 마르지 않는 인생 2라운드 50년>이란 책을 펴낸 이광구(55)씨다. 23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저자를 만났다.
직업만 다양한 게 아니다. 학생운동 이후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운동의 형태도 무척 다양하다. 지금은 청년공동주거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졸업은 못했다. 학생운동을 하느라 학점 미달로 제적을 당했다. 85년과 87년 두차례 구속되기도 했다. 각각 1년씩 옥에 갇혔다. “처음엔 구로 지역에서 가두시위 주동을 하다 구속됐죠. 87년엔 구로구청에서 대선 개표부정 항의 농성을 하다 잡혔는데 전과가 있다고 구속시키더군요.”
석방 뒤에도 구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92년 대선 이후로는 지역운동에 뛰어들었다. 구로 지역 활동가들과 생협 운동을 했다. 95년엔 노동자협동기업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열었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일이었다. “빨리 성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빚을 꽤 떠안았죠.” 빚을 갚기 위해 대우자동차에 들어갔다. 또 부천 전셋집을 빼서 강화도 월셋집으로 옮겼다. 김우중 당시 대우 회장의 ‘운동권 인재 특채’ 정책 덕에 들어간 대우자동차에선 딱 3년6개월간 일했다. “회사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노무부서로 발령 내려고 하더군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서울법대 운동권 제적·두차례 구속
“그동안 돈벌이로 23가지 일을 했더군요.” 그가 했던 일은 이렇다. 용접공, 노동상담, 자동차 정비공장, 대리운전, 해외인터넷방송 기획사, 두부공장, 대안학교, 영농조합, 증권사 등등. 상장 증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 대표이사도 했단다. 잦은 생업 변경을 두고 아이들한테 “아빠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원망을 듣기도 했단다. 그는 최근 <돈이 결코 마르지 않는 인생 2라운드 50년>이란 책을 펴낸 이광구(55)씨다. 23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저자를 만났다.
직업만 다양한 게 아니다. 학생운동 이후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운동의 형태도 무척 다양하다. 지금은 청년공동주거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졸업은 못했다. 학생운동을 하느라 학점 미달로 제적을 당했다. 85년과 87년 두차례 구속되기도 했다. 각각 1년씩 옥에 갇혔다. “처음엔 구로 지역에서 가두시위 주동을 하다 구속됐죠. 87년엔 구로구청에서 대선 개표부정 항의 농성을 하다 잡혔는데 전과가 있다고 구속시키더군요.”
석방 뒤에도 구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92년 대선 이후로는 지역운동에 뛰어들었다. 구로 지역 활동가들과 생협 운동을 했다. 95년엔 노동자협동기업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열었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일이었다. “빨리 성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빚을 꽤 떠안았죠.” 빚을 갚기 위해 대우자동차에 들어갔다. 또 부천 전셋집을 빼서 강화도 월셋집으로 옮겼다. 김우중 당시 대우 회장의 ‘운동권 인재 특채’ 정책 덕에 들어간 대우자동차에선 딱 3년6개월간 일했다. “회사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노무부서로 발령 내려고 하더군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서울법대 운동권 제적·두차례 구속
노동운동 거쳐 생협 등 지역운동 나서
재무설계사 6년 경험 ‘돈의 가치 자각’ 공동주거·로컬푸드…건강한 돈벌이
‘돈이 마르지 않는 인생 2라운드 50년’
“지역공동체 통한 건전한 관계가 답” 2004년에 또 다른 인생의 분수령을 만났다.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라의형씨가 세운 포도재무설계에 입사한 것이다. 이곳에서 한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거쳐 2013년까지 6년을 재무설계사로 일했다. “(재무설계사 일을 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죠. 돈 문제에 대한 개인의 자각 없이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3년 전부터는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을 설립해 청년공동주거운동을 하고 있다. “대학 선후배 10명이 뜻을 모았어요. 월 100만원을 받는 상근 직원도 둘 있습니다.” 저리의 공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대학생들에게 싸게 임대해준다. 지난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안산과 부천 지역 주택 33채도 확보해 모두 90명의 청년에게 집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그가 20년 동안 살아온 강화 지역 공동체 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화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로컬푸드협동조합 일을 시작했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쌀도정공장에서 영업도 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리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세 자녀(나리·온달·보리)를 두고 있다. 2010년엔 사교육 대신 강화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보듬어주며 키워낸 이야기를 담은 책 <희망교육 분투기>를 펴냈다. 큰딸 나리는 고교를 나온 뒤 생태운동을 하다 뒤늦게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고 아들 온달은 인천 과학고를 나와 지금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막내딸 보리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대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은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그가 인생 2라운드를 맞는 이들에게 강조한 열쇳말은 ‘낙관과 목표’이다. 지나치게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면 나라가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어요. 금융사 공포 마케팅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비용 사회’라는 점이다. “변호사와 공무원 부부조차도 사교육과 주거비 때문에 헉헉거리더군요. 재무상담을 할 때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말을 이었다.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아는 것, 꼭 하고 싶은 재무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목표 설정이 문제입니다. 사회 시류에 편승하거든요.” 자기 목표를 정하고 소비를 줄인다면 노후 불안은 기우라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국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쉬워도 실천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 자녀의 사교육에 돈을 쓰지 않았다. 아이들은 고교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지금 사는 강화도 북쪽 끝단의 집도 4천만원에 구입했다. 경조사도 아주 가까운 경우만 챙긴다. “불안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관계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눈빛 마주치고 서로 어울리면, 혹 무시당할까봐 눈치 보면서 고비용으로 달려가는 풍조가 완화되지 않을까요.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소비도 줄고 잔잔한 즐거움을 느끼죠.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자극적 즐거움을 찾아 고비용으로 달려가죠.”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이광구씨는 서울법대 82학번이지만 졸업장은 없다. 대학 동기 모임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서울법대 전체 동기 모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서울법대 82학번 운동권 동기 모임에는 나갑니다. 최소 2학년까지 학생운동을 한 친구들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모두 25명 정도 됩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동운동 거쳐 생협 등 지역운동 나서
재무설계사 6년 경험 ‘돈의 가치 자각’ 공동주거·로컬푸드…건강한 돈벌이
‘돈이 마르지 않는 인생 2라운드 50년’
“지역공동체 통한 건전한 관계가 답” 2004년에 또 다른 인생의 분수령을 만났다.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라의형씨가 세운 포도재무설계에 입사한 것이다. 이곳에서 한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거쳐 2013년까지 6년을 재무설계사로 일했다. “(재무설계사 일을 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죠. 돈 문제에 대한 개인의 자각 없이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3년 전부터는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을 설립해 청년공동주거운동을 하고 있다. “대학 선후배 10명이 뜻을 모았어요. 월 100만원을 받는 상근 직원도 둘 있습니다.” 저리의 공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대학생들에게 싸게 임대해준다. 지난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안산과 부천 지역 주택 33채도 확보해 모두 90명의 청년에게 집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그가 20년 동안 살아온 강화 지역 공동체 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화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로컬푸드협동조합 일을 시작했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쌀도정공장에서 영업도 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리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세 자녀(나리·온달·보리)를 두고 있다. 2010년엔 사교육 대신 강화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보듬어주며 키워낸 이야기를 담은 책 <희망교육 분투기>를 펴냈다. 큰딸 나리는 고교를 나온 뒤 생태운동을 하다 뒤늦게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고 아들 온달은 인천 과학고를 나와 지금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막내딸 보리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대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은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그가 인생 2라운드를 맞는 이들에게 강조한 열쇳말은 ‘낙관과 목표’이다. 지나치게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면 나라가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어요. 금융사 공포 마케팅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비용 사회’라는 점이다. “변호사와 공무원 부부조차도 사교육과 주거비 때문에 헉헉거리더군요. 재무상담을 할 때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말을 이었다.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아는 것, 꼭 하고 싶은 재무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목표 설정이 문제입니다. 사회 시류에 편승하거든요.” 자기 목표를 정하고 소비를 줄인다면 노후 불안은 기우라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국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쉬워도 실천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 자녀의 사교육에 돈을 쓰지 않았다. 아이들은 고교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지금 사는 강화도 북쪽 끝단의 집도 4천만원에 구입했다. 경조사도 아주 가까운 경우만 챙긴다. “불안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관계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눈빛 마주치고 서로 어울리면, 혹 무시당할까봐 눈치 보면서 고비용으로 달려가는 풍조가 완화되지 않을까요.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소비도 줄고 잔잔한 즐거움을 느끼죠.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자극적 즐거움을 찾아 고비용으로 달려가죠.”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연재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