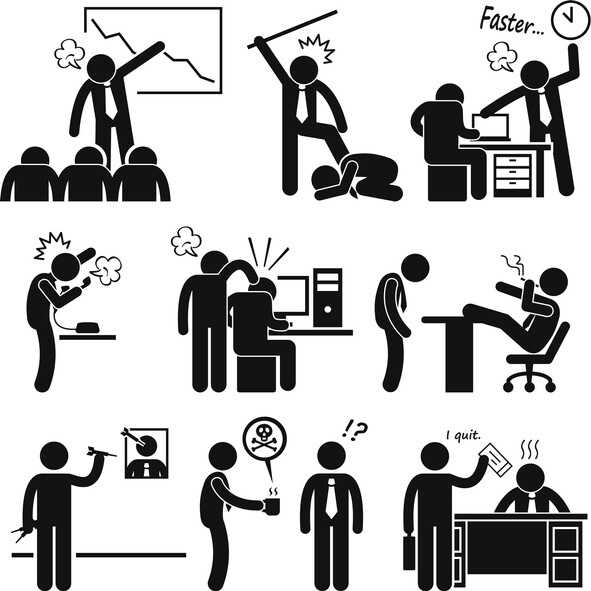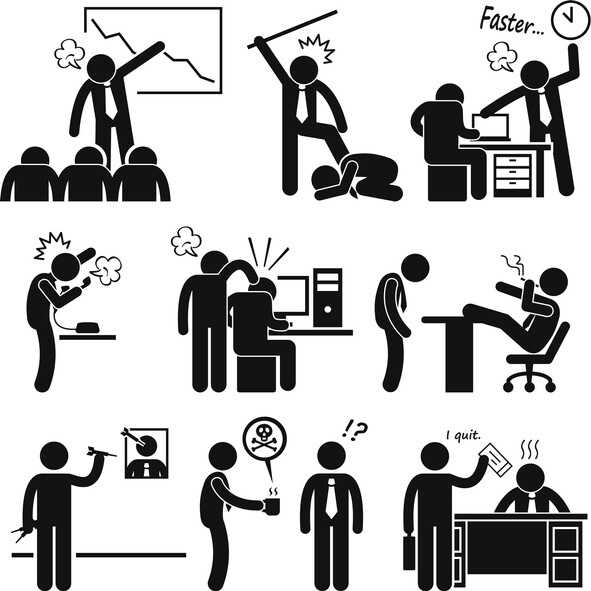#1.
ㄱ씨는 회사 대표와 대표의 부인, 대표의 아들과 사촌동생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 회사에선 직원들이 함께 밥을 먹어도 설거지나 분리수거 등 허드렛일 분담에서 대표의 가족들은 쏙 빠진다. 팀장을 맡은 대표의 사촌동생은 직원들에게 “개기지 말라”,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고 윽박지르는 등 폭언을 일삼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2.
1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근무한 ㄴ씨는 지병으로 인해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상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의 출근하지 않은 대표의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ㄴ씨의 퇴직 사유를 지병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변경했다. 결국 ㄴ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이직 사유 변경 신청을 준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회사 대표 등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신고하기가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내 갑질 사례를 보면, 병원 원장의 부인이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직원으로 있는 사장의 가족과 다툼이 생겨 회사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인사위원이 가해자의 가족인 경우 등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대표에게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노조 가입률이 0.1%인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의 친인척 역시 실질적인 사용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힌 경우에도 사업주처럼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직장갑질 익명 신고센터 운영 제안도 나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고용노동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갑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괴롭힘 가해자도 가족, 책임자도 가족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