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누리집 갈무리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여가부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다.”(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3월말 <한겨레> 인터뷰)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규모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할 필요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여성가족부 개편의 한 방법으로 ‘독일 모델’이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으로 소환되고 있다. 독일의 여가부 격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700여명(2019년 6월 기준)이 근무하고, 2020년 기준 예산이 160억달러(한화 약 19조4900억원)에 이르는 중상위 규모 부처다. 예산은 한국 여가부 예산(2022년 기준 1조4650억원)의 13배에 이른다. 한국의 여가부가 정책 대상으로 삼는 성평등·가족·청소년 업무에 더해 노인·인구변동 문제까지 포괄해 담당한다.
정책 대상은 넓지만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도 강력하다. 연방정부의 평등 관련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한 독립적인 관할권과 책임을 갖고 있고, 법안의 발의권·발언권을 갖는다. 특히 장관은 성평등 정책 관련 의안 준비과정에 충분히 관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의안을 의사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연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성평등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부처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모델’의 장점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부처 규모·예산이 큰 만큼 정책 체감성이 높아져 적은 예산과 제한된 수혜자만 갖는 한국의 여가부처럼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여성·노인·청소년·가족 간의 교차적 정책수립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여가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여서 일반 국민의 정책 체감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처럼 아동·청소년·노인 등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지고, ‘여성·노인’ ‘여성·청소년’ 등을 묶어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연방 청소년·가족·보건부’의 이름에 처음으로 ‘여성’이 추가된 것은 보수정당 소속 헬무트 콜 총리 시절인 1986년이다. 헬무트 콜 행정부는 이듬해 여성정책만 전담하는 ‘여성정책국’도 창설했다. 1950년 연방 내무부에 설치된 ‘여성과’의 기능이 30여년에 걸쳐 조금씩 확정된 결과였다. 이후 여성정책국이 평등국으로, 평등국이 기회평등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변하지 않았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부처를 정권의 변동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뒤집는 방식이 아닌, 정책 요구에 따라 차곡차곡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 ‘독일 모델’에서 배울 점”이라고 짚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가족·노인·청소년 등 대상을 확장한 형태의 ‘여성부’가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다만 김복태 연구위원은 “저출생·청소년·가족·노인 문제 등은 모두 여성의 시각을 빼놓거나, 여성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여성정책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일상의 성주류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독일 모델’의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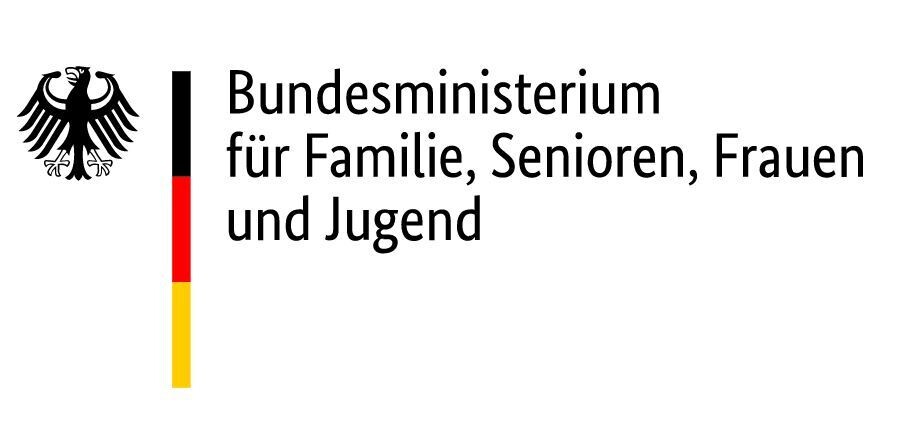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사설] 끝없는 ‘감세’, 재정준칙 깨고 재정운용 ‘날림’ 치달아 [사설] 끝없는 ‘감세’, 재정준칙 깨고 재정운용 ‘날림’ 치달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21/53_17058302716549_2024012150190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