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에는 각 나라 언어의 문법체계를 빌려오고 관용어구를 마구 섞은 변종영어가 많다. 타이 방콕의 한 서점 풍경. 고경태 기자
[매거진 Esc] 리처드 파월의 아시안 잉글리시 ③
영어 다양화가 낳은 변종들, 언어의 다리와 함께 세대간 장벽을 놓고…
영어 다양화가 낳은 변종들, 언어의 다리와 함께 세대간 장벽을 놓고…
아시아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앞의 질문은 불가피하게 또다른 질문을 하게 한다. ‘영어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영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는 수천 명의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언어이고, 수백만 명에게는 제2언어이거나 제2언어로 습득된다. 수십억 명은 간단한 대화라도 영어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쓴다’는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네이티브 스피커’
아시아 대륙에는 가지각색의 영어가 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 싱가포르, 필리핀의 마닐라 거주자들이 파키스탄식·싱가포르식·필리핀식 영어의 약간의 ‘문어체적 변형’을 참작하고 들으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 반면 우디시(파키스탄식 영어), 싱글리시(싱가포르식 영어), 태글리시(필리핀 타갈로그어식 영어)로 말하면서 현지 언어의 문법체계를 빌려오고 관용 어구를 마구 섞어 사용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힘들어진다. 이 또한 영어일까? 여하튼 인터넷 블로거들이나 텍스트 전달자들은 여전히 영어의 변종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각 나라 사이에 언어의 다리를 놓기도 하지만, 세대 사이에는 장벽을 세우기도 한다.
세계화는 경제·문화·언어적 표준을 진척시킨다. 동시에 다양성 또한 생성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쓴다.(아마 다른 언어의 쇠퇴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새로 진입한 영어 구사자들은 기존과 다른 ‘영어 쓰는 방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영어의 다양화는 반대로 어떤 ‘변종’이 가장 뛰어난지 논란을 일으킨다.
아시아에서 영어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한다. 영국식 영어는 영국의 옛 식민지에서 인기이고, 미국식 영어는 필리핀·일본·한국에서 인기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영국과 미국 안에도 존재하는 영어의 다양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를테면 ‘표준 발음’은 영국 내의 마이너리티 집단에서 결코 구사된 적이 없다. 아시아에서 가장 적합한 ‘영어 모델’을 찾다 보면, 각 지방색이 반영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시아인들을 만나면서 이런 작업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워진다.
심지어 지금도 어떤 아시아인들은 ‘네이티브 (영어)스피커’를 북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옛 영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아시아인들 또한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사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어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어렸을 적부터 배우는 것이 완전에 가깝게 습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그가 처음 배웠던 언어라고는 할 수 없다. 어렸을 적 영어만 배운 사람이 여러 언어와 그 변종을 함께 배워 온 사람보다 월등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영어의 가장 이상적인 표준은 우리가 영어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언어는 항상 변한다. 반면 하나의 표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언어를 고정시키는 행위다. ‘아 유 언더스탠드’가 나올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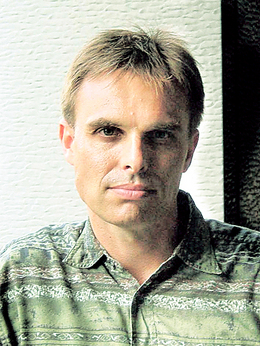 아시아에서 팔리는 영어신문에 매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영어적 표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키니>의 ‘독자편지’ 난에는 한 법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아 유 언더스탠드(Are you understand)?”라고 묻는 것처럼 ‘잘못 쓰인 영어’의 예가 지적되기 일쑤다. 예전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실린 기사는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11살짜리 학생이 9살짜리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 신문은 곧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홍콩 반환 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어찌하여 영어가 학교 수업 시간을 두고 말레이어나 필리핀어, 신할라어(스리랑카어)와 같은 언어와 경쟁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가 소수 엘리트들에게 제한돼 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쓴다는 사실도 이들은 기억해야 한다.
번역 남종영 기자
아시아에서 팔리는 영어신문에 매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영어적 표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키니>의 ‘독자편지’ 난에는 한 법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아 유 언더스탠드(Are you understand)?”라고 묻는 것처럼 ‘잘못 쓰인 영어’의 예가 지적되기 일쑤다. 예전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실린 기사는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11살짜리 학생이 9살짜리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 신문은 곧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홍콩 반환 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어찌하여 영어가 학교 수업 시간을 두고 말레이어나 필리핀어, 신할라어(스리랑카어)와 같은 언어와 경쟁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가 소수 엘리트들에게 제한돼 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쓴다는 사실도 이들은 기억해야 한다.
번역 남종영 기자
심지어 지금도 어떤 아시아인들은 ‘네이티브 (영어)스피커’를 북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옛 영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아시아인들 또한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사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어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어렸을 적부터 배우는 것이 완전에 가깝게 습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그가 처음 배웠던 언어라고는 할 수 없다. 어렸을 적 영어만 배운 사람이 여러 언어와 그 변종을 함께 배워 온 사람보다 월등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영어의 가장 이상적인 표준은 우리가 영어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언어는 항상 변한다. 반면 하나의 표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언어를 고정시키는 행위다. ‘아 유 언더스탠드’가 나올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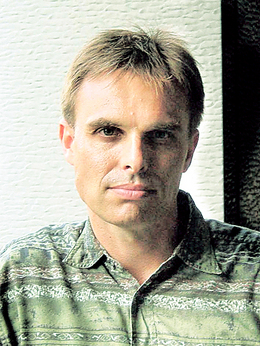
리처드 파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