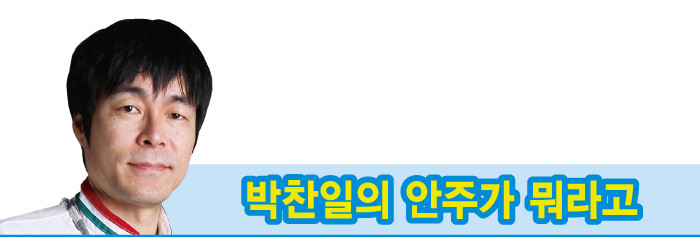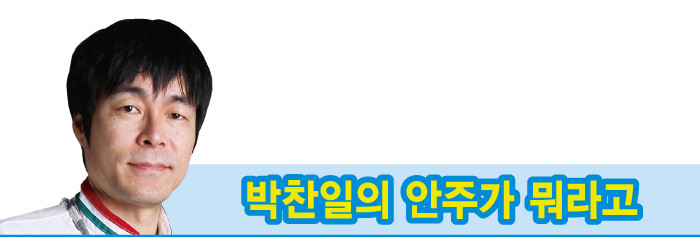장사란 건 계산이고 과학이다. 먹고살려는 냉정하고 엄혹한 말들을 술집 주인들은 잘 안다. 이 바닥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객단가’다. ‘손님=단가’가 된다. 물론 주인들은 이 말에 목숨 건다. 그다음으로는 회전율이다. 객단가 비싸고 회전 잘되는 가게, 그게 주인들의 영원한 로망이다. 일 인당 10만원쯤 쓰고 1시간 정도 되면 나가는 가게. 당연히 손님은 객단가 높고 빨리 일어나게 되는 가게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싸고, 오래 눌러앉아도 되는 집이 좋을 수밖에. 결국 주인(업종)과 손님은 끝없는 투쟁과 눈치싸움 관계다. 여담이지만, 내가 다시는 안 가는 가게가 있다. 아직 영업시간 남았는데 음악을 끈다. 의자 올리고 바닥 팍팍 쓰는 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얼마나 많겠나. 또 있다. 영업시간 한참 남았는데, “포스(금전 등록기) 마감 때문에 계산 좀 미리 해줄래?” 이러면서 계산서 내미는 집. 속 보인다. 그놈의 포스는 왜 영업시간 중에 마감해야 하는 걸까.
한때 ‘어떻게 하면 술을 싸게 먹을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들처럼) 속칭 ‘진상’짓도 많이 했다. 해물탕집이나 부대찌개 집에서 육수 추가 세 번쯤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친구 말로는, 횟수가 잦아지면 나중에는 육수가 점점 옅어진다고 했다. 최후에는 맹물만 준다고도 했다. 진짜일까. 고깃집에서 김치 추가 세 번쯤 해본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삼겹살 추가는 어려우니, 김치만 내리 추가해서 계속 구웠다. 주인 이마가 찌푸려졌다. 보톡스 좀 맞으셔야 했을 거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미안해서 판 갈이 또 해달라고는 안 했다. 김치를 구우면 판이 훨씬 지저분해지고, 가게 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찼다. 고춧가루와 설탕(고깃집 김치에는 흔히 설탕이 들어갔다)은 불에 지지면, 연기가 엄청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인심 사납게 김치 못 굽게 하는 고깃집도 있다. 하여튼 구운 김치가 넉넉하면 소주 각 1병은 더 마실 수 있다. 김치 구운 게 얼마나 맛있나. 적당히 신 김치를 줄기째 얹어서, 가위로 뿌리를 냉큼 자른 후 흐르는 돼지기름에 굽는다. 노르스름하게 변하다가 약간 투명해질 때가 있다. 이때가 제일 맛있다. 흰 줄기 부분은 약간 갈색을 띠면서 지져지고, 고춧가루 양념을 많이 품고 있는 이파리 쪽은 입에 넣으면 그을린 고춧가루 향이 아주 기막히다. 당최 이런 음식은 누가 개발했을까. OO동에 김치구이 삼겹살집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장사가 잘됐다. 어느 날 김치 추가를 제한해서 다들 ‘쎄했던’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부터 손님이 확 줄었다. 주인의 머릿속에는 앞에 쓴 ‘객단가와 회전율’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장사란 참 어렵다.
김치구이에 미치면 온갖 꼼수를 쓰게 된다. 삼겹살을 구울 때 김치구이용으로 기름을 모아두기도 했다. 옛날엔 까만 주물판에 알루미늄 포일 깔아서 냉삼을 굽고, 식빵으로 기름을 제거하곤 했는데, 우리는 식빵은 따로 된장 찍어서 먹고 흐르는 기름을 받아서 썼다. 이 정도면 주인 처지에서는 진상 중의 진상이었다. 연기는 많이 피우지, 김치도 엄청 먹어댔으니까.
“이봐 주인장, 우린 돼지기름을 아주 많이 확보했다고. 김치를 더 가져오라고.”
물론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불판으로 얻어맞을 일이었다.
비장의 무기가 또 있었는데, 밥이었다. 밥을 말면 안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 명이 고깃집에 가서 3인분을 시키고, 소주 6병을 먹자면 아무래도 어렵다. 김치구이도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된장찌개를 넉넉히 시킨다. 거기에 밥을 말아서 불판에 올린다. 눈치껏 남은 반찬도 넣어서 풍성하게 만든다. 밥은 식히지 말고 뜨거울 때 바로 넣는 게 좋다. 그래야 국물에 전분질이 확 풀려서 된장국물이 노곤노곤하고 질퍽한 소스처럼 변한다. 자글자글 끓으면서 밥과 된장국물이 소용돌이치고 맛이 깊어진다. 이쪽으로 선수가 다 있는 법이라. 옆자리 친구가 계속 마늘을 굽더니 안 먹고 모아두는 거라. 그걸 ‘된장밥’이라고 명명한 그 뚝배기에 넣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녀석이 달려드는 숟가락을 제지하면서 말했다.
“어허! 스돕. 쌈장을 넣어야지.”
녀석은, 친히 쌈장을 크게 두 숟가락 퍼서 이미 걸쭉해진 불판 위 뚝배기 된장밥에 넣고 비비듯 섞었다. 감칠맛이 폭발해 입천장이 데어 홀랑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술안주로 퍼먹었다. 생각해보니, 거기 요리과학이 다 있었다. 미원 넉넉히 들어 있지, 고기랑 멸치로 만든 육수 쓰지, 된장 자체도 그렇지, 감칠맛이 제대로 들어 있는 거다.
요새 한식에 치즈 넣는 게 아주 인기다. 된장밥에도 치즈 넣으면 내 생각에는 백퍼 인기 있을 거다. 틀림없다. 찐득한 된장밥 한 술. 소주보다는 왠지 맥주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치즈된장밥. 어? 맛있을 거 같지 않나?
박찬일(요리사 겸 음식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