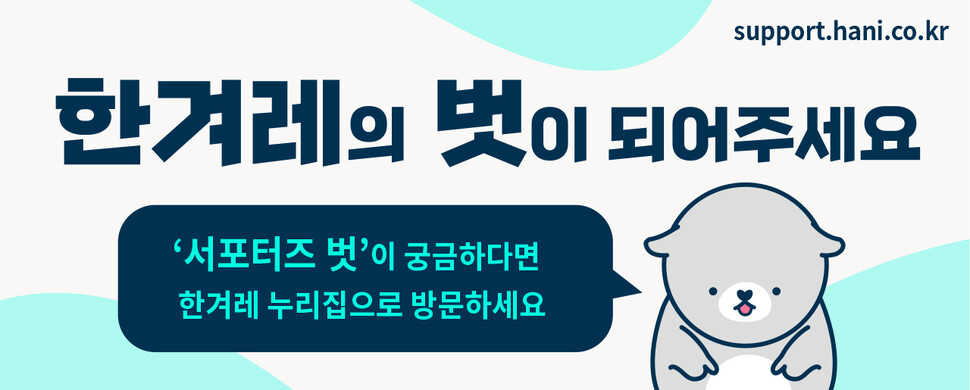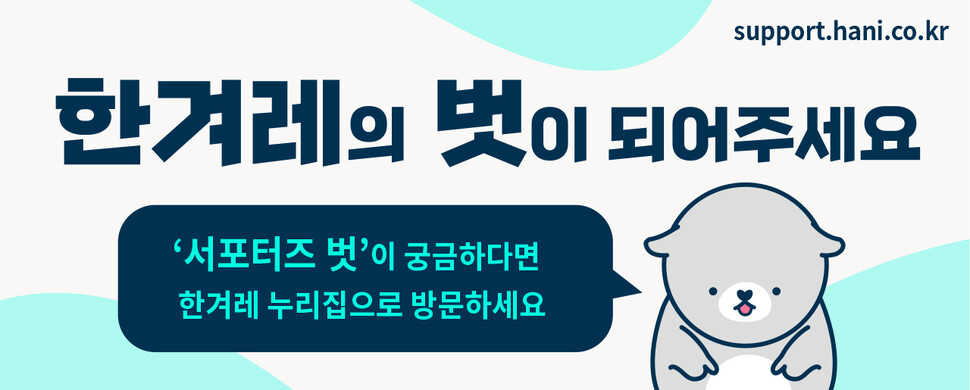술 취해서 혼자 짜장면을 먹다가 그릇에 코 박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스무 살 남짓 시절이었다. 필름 끊어지면 조심해야 한다. 접싯물이 아니라 짜장소스라니. 주인이 흔들어 깨우지 않았으면…. 걸쭉한 짜장이 아니라 짬뽕이나 우동이었다면. 그날 밤에 씻으며 코를 푸는데, 양파가 나왔다. 고기가 아니어서 실망했다.
그 나이 무렵에 ‘마른 논에 물 대기’를 잊을 수 없다. 내가 생맥주 ‘조끼’(저그를 뜻하는 일본식 발음. 당시에 통용되던 용어)를 연신 들이키자 누군가 뱉은 말이었다. “햐, 마른 논에 물 대는 것처럼 쭉쭉 들어가는구나.”
절대 칭찬은 아니었으리라. 그 당시 생맥주가 얼마나 비쌌는데. 그 후로 내 별명이 마른 논이 되었다. 생맥주를 좋아했다. 비싸서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 탁주연합제조창에서 만들던 맛없는 막걸리가 한 되에 500원이나 했을까. 소주도 이홉들이 한 병에 그 정도 했을 것 같다. 생맥주는 380원에서 500원 정도 하던 때였다. 값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생맥주는 소주보다 훨씬 많이 마셔야 취한다. 그러니 어지간한 돈으로는 생맥주에 도전하지 못했다. 요즘 청년들도 비슷할 거다. 내 소원은 생맥주 호스에 입대고 양껏 마셔보는 것이었다. 누가 생맥주 공장 방문 행사에 참가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다. 시내 맥주 회사 앞에서 아침 일찍 버스가 출발했다. 맥주 공정 설명을 듣고(대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시음장에서 마시는 순서가 되었다. 불행히 호스는 아니었고, 디스펜서가 있었다. 디스펜서라는 말을 알 리 없던 때였으니까 호스도 어울린다.
“에, 이 ‘디스펜사’는 공장의 생맥주 라인에서 바로 연결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싱한 생맥주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첫 잔을 들이켜는데 오묘한 향이 엄청나게 피어올라서 이게 양주야 맥주야 하고 놀랐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런 공장 방문 시음 기회가 생기면 절대 가지 마시라. 시중에서 파는 생맥주는 맛이 없어서 한동안 못 마신다. ‘시중에 파는 생맥주는 물 탄 거’라는 소문이 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시중의 생맥줏집에서 물을 탈 수는 없다. 디스펜서를 당기면 탄산가스가 케그에서 나오는 생맥주를 밀어내며 같이 섞이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물 타는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맥주 원액이 따로 있고, 여기에 적절히 물을 타야 생맥주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다.
오해를 받는 또 한 가지 상황은, 흔히 주전자를 받쳐놓고 거품을 따라버리는데, 어떤 주인들은 그 거품이 아까워서 생맥주 잔에 첨잔하곤 한다. 주전자에 든 것이니 물이라고 오해하기 딱 알맞다. 물론 주전자에 따라낸 거품은 생맥주 잔에 섞으면 맛이 없어서 버리는 게 원칙이다.
요새는 무슨 법이 바뀌어서인지 생맥주가 공장에서 술집으로 바로 갈 수 없다. 도매상을 거친다. 옛날엔 직납이 있었다. 그만큼 싱싱했다. 단, 물량이 아주 많아야 가져다주었을 거다. 서울 시내에 공장에서 직접 받는 전설적인 술집 리스트가 생맥주 애호가들에게서 회자되곤 했다. 광화문 쌍쌍호프, 종각 연호프와 오비광장, 대학로의 어느 호프집(레벤브로이?)과 을지로 맥주 회사 지하에 있던 오비호프가 있었다. 이런 술집은 확실히 맛이 달랐다. 그때 유행하던 안주 중의 하나가 부추김치가 같이 나오는 훈제족발이었다. 요즘도 대학로 호프집에 가니까 팔고 있었다.
다시 공장으로. 그렇게 알싸한 첫물 생맥주에는 몇 가지 안주가 나오는데, 작은 비닐로 포장된 각종 어포과 김 같은 것이었다. 이 안주에는 사연이 있다. 아무개 맥주 회사에서 ‘오비광장’이라는 체인점을 출시했다. 프랜차이즈 형태였다. 아마도 유럽과 일본에서 모델을 가져왔을 것이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다란 나무 탁자에 서서 생맥주를 마시는 것이었다. 문제는 주방이 따로 없었다. 들은 얘기로는, 이 업종이 허가받을 때 불을 쓰는 주방을 갖추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는 말도 있다. 안주라고는 비닐에 들어 있는 ‘백원 안주’였다. 딱 백 원어치 만큼, 몇 점 들어 있지 않았다. 모자라면 카운터에 가서 다시 사오는 시스템. 요즘엔 어울릴 수 있을지 몰라도 병맥주를 짝으로 시켜서 마시면서 생율(생밤이 아니라 꼭 생율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다)에 은행구이에 나막스를 때려먹던 호기를 부리던 당시에 가당치도 않은 업태였다. 나막스가 뭐냐면 스낵바 같은 맥줏집에서 나오던 안주로, 홍메기 말린 것이다. 나중에는 이 고기가 귀해져서 파는 집이 거의 없어졌다. 있더라도 아무 고기나 나막스라고 우기는 경향도 있다.
여하튼, 그 쪼잔한 백원 안주에 손님들의 원성이 높았다. 생맥주에도 동태찌개며 김치찌개 같은 거한 안주를 먹는 한국인에게 봉지쪼가리에 든 코딱지만 한 안주가 맘에 들 리가. 결국 법이 바뀐 건지, 그 맥주 회사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바뀐 건지 보통 가게처럼 변했다. 서서 마시는 자리가 철거되거나, 의자가 놓였다. 봉지 안주가 사라지고 치킨과 계란말이가 등장했다. 동네 아저씨들은 이제야 생맥주가 먹을 만해졌다고 좋아했다. 그때 돈이 없는 우리는 치킨 반 마리에 생맥주를 몇 잔 마시곤 했다. ‘반반 무 많이’는 없었다. 양념치킨이 나오기 전이거나 유행 전이었다. 그냥 무만 자꾸 더 시켜서 주인아주머니를 피곤하게 했다. 그럴 때는 맘씨 좋은 옆자리 아저씨들이 인원수에 맞춰 ‘천씨씨’짜리 생맥주를 돌리고, 안주도 시켜주곤 했다. 그때 아저씨들은 많이 돌아가셨을 거다. 나중에 나랑 만나면 천씨씨로 한 잔 세게 뽑아드릴게요. 고마웠어요.
박찬일(요리사 겸 음식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