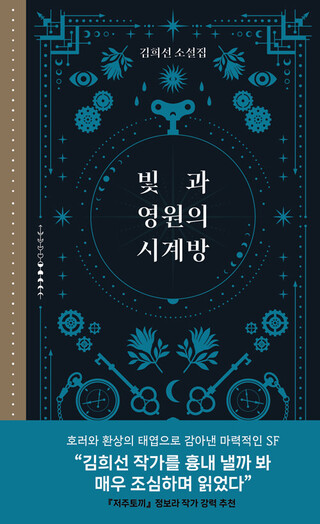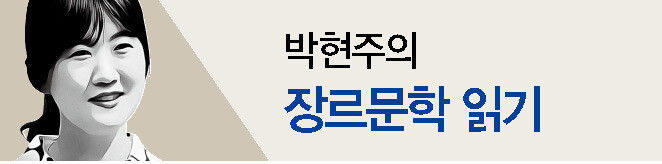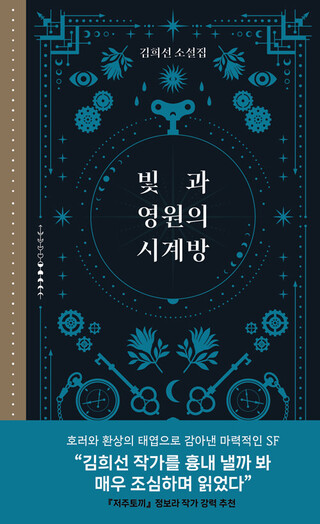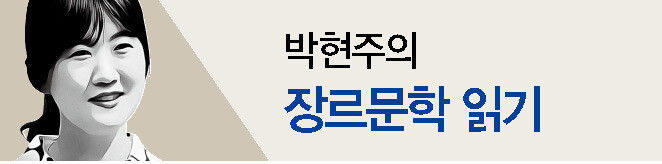빛과 영원의 시계방
김희선 지음 l 허블(2023)
어릴 적 빈집에서 까무룩 낮잠이 들었다 깨어본 사람은 경험한 적 있는 기분이리라. 정신이 들면, 낮인지 밤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다. 아직 꿈속인지 현실인지도 모른다. 다들 어디 있지? 나는 누구지?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 지점에서 쓸쓸함이 차오른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쓸쓸함, 그러므로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다.
김희선의 <빛과 영원의 시계방>을 읽는 기분은 이와 비슷하다. 미래의 책들이 가득 꽂힌 고서점 같은 이 에스에프(SF) 판타지는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과연 나이긴 한지 확신할 수 없기에 생겨나는 쓸쓸함을 품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총 8편의 단편은 우로보로스처럼 영원히 반복되는 연결이라는 공통적 주제 의식으로 묶을 수 있다. ‘공간서점’은 시계방 주인이던 아버지가 5월 항쟁에 참여한 대학생을 돕다가 기이한 책을 얻게 되면서 시작되는 시간여행 에스에프다. ‘오리진’에서는 세계의 비밀이 담긴 비기를 얻게 된 교황청 문서담당관과 이 비밀을 폭로한 베스트셀러의 이야기를 액자소설 형태로 접합했다. ‘달을 멈추다’에서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통해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한 인류와 신라 시대의 향가 ‘도솔가’가 연결된다. ‘꿈의 귀환’은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저 가가린’을 연상하게 하는 단편으로, 두 작품 다 지구를 벗어난 최초의 인간이 본 지구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푼다. ‘악몽’은 월둔이라는 마을로 귀농한 남자가 무한 반복하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이며, ‘가깝게 우리는’은 너무 솜씨가 좋았기에 이국의 공방으로 끌려가 오토마톤을 만들게 된 시계공의 비극적 운명을 다뤘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1960년대 국가대표 축구 선수 케이(K)와 파독 광부 엔(N)의 운명이 엇갈린 지점을 더듬고, ‘끝없는 우편배달부’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수없는 우편배달부에 대한 영화, 혹은 현실을 그린다.
이 작품들 속에서는 무엇도 선형적으로 가지런히 놓이거나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시간은 순환하는 고리이며, 세계는 타인의 꿈이거나 기억, 혹은 영화나 소설 같은 허구이다. 한 개인은 다른 이로 오인되거나 중첩된다. 작가는 영원과 우주,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인 주제를 한국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세계의 고전을 불러와서 재구성했다. 시계 장인의 섬세한 손길 같은 서사적 기술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문학적 사고 실험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 작품집은 삶을 향한 성실한 열망을 보여주며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 과거가 미래와 다르지 않고 내가 너이고 세계가 꿈과 같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 종료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우주라면. 이처럼 생의 허무에 빠지기 직전,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존재하기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꿈이든, 생시든, 무언가가 존재할 확률은 언제나 제로에 가깝고, 우린 그 엄청나게 작은 확률을 딛고 여기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쓸쓸하지만은 않다. 너와 내가 여기 존재한 건 확률적 기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동료 인간이 되어 지구에서 만났기에. <빛과 영원의 시계방>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었기에 삶은 의미를 얻는다.
박현주/작가·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