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ChatGPT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SF 앤솔러지’
김달영·나플갱어·ChatGPT-3.5 등 지음 l 네오북스(2023)
번역가이자 작가로 일하면서 인공지능에 일을 빼앗길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을 몇 번 받았다. 아니, 그동안은 느끼지 않았다. 인간 창작력의 우월성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발전했을 때쯤엔 독서 인구가 줄어들어 빼앗길 일자리가 이미 없으리라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유행인 챗지피티(ChatGPT)나 번역 툴 딥엘(DeepL)은 다르다. 위협감이 생생히 다가왔다.
챗지피티가 출판계를 점령한 건 순식간이다. 툴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책들은 물론, 이를 이용한 소설들이 쏟아졌다. <에스콰이어> 잡지에는 정지돈의 단편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복도가 있는 회사’가 실렸고, 에스에프(SF) 작가들과 챗지피티가 협업한 과정과 결과를 담은 소설집 <매니페스토>(김달영 외, 네오북스)가 출간됐다.
기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설이 아주 새롭지는 않다. 2016년 일본에서는 호시신이치 문학상 공모전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팀이 출품한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 1차 심사를 통과하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에서도 2021년 인공지능 작가 비람풍과 ‘소설감독’ 김태연이 함께 저작한 <지금부터의 세계>(파람북)가 나왔다.
현재 챗지피티에 대한 열광은 더 대중적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연언어로 쉽게 원하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번역도 약간은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된다.
나도 이 칼럼을 쓰면서 챗지피티에 의존했다. 챗지피티에 그를 이용해서 쓴 소설의 장단점을 물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소재, 기존 작품과는 다른 독창성, 노력 절약 효율성, 경계를 확장하는 상상력을 들었다. 단점으로는 일관성 결여, 감정적 효과 부족, 편파적 언어, 작가 의도성 부족을 꼽았다. 챗지피티의 자기 평가는 소심하리만큼 겸손하고 솔직했다.
앤솔로지 <매니페스토>의 결과물은 이런 평가에 들어맞는다. 분량도 짧고, 작가마다 툴 사용 경험이 다르다는 걸 감안해도 문학으로서 감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어떤 작가는 묘사와 대사를 대신 채워주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 어떤 경우엔 맥락을 이어 플롯을 구성했고, 소재 선정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상적인 작품은 나플갱어 작가의 ‘희망 위에 지어진 것들’이었는데, 이 작가의 협업 방식은 챗지피티를 전통적 검색 엔진처럼 써서 정보를 얻은 데 가까웠다. 예상하지 않은 서정성이 발견되었다고 작가는 썼지만, 이는 작가가 그런 감정 도출을 의도했기 때문이었다.
문학에서 중요한 건 ‘무엇으로’ 썼는가가 아니다. 도구가 펜이든 타자기든 인공지능이든 현재의 질문은 ‘무엇을’ 쓰는가이다. 독자의 감정을 흔드는 이야기, 작가의 의도를 통해 세계를 발견하고 확장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아직 챗지피티에 대한 논의는 거기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앞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창작이 인간을 넘어서면 다른 존재가 온다. 나는 켄 리우의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정성주 옮김, 황금가지)에 수록된 포스트 휴먼 3부작을 읽으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상상하며 심란해졌다. 그렇지만 이 심란함이 ‘인간적’이라고도 생각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심란해지는, 그리하여 인간임을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박현주/작가·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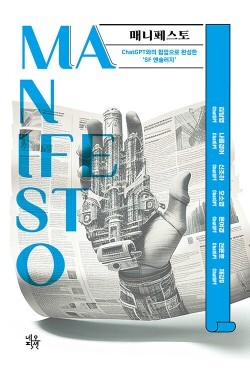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세계 문화 시장의 중심으로 옮겨진 사도세자 이야기 [책&생각] 세계 문화 시장의 중심으로 옮겨진 사도세자 이야기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15/53_17026008054783_20231214504184.jpg)





